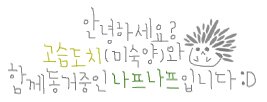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나이들면 생기는 습관
[46]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33]
-
계층
전세사기 당하면 자살하는 이유
[42]
-
감동
외국인 관광객의 800만원 찾아준 버스기사.
[16]
-
연예
블라인드에서 추정한 민희진 쿠데타 계획
[55]
-
계층
영국남자 컨텐츠 근황
[53]
-
연예
블라인드에서 핫한 어느 증권맨의 민희진 분석 글
[58]
-
유머
소리 On) 국힙 원탑 미니 진 신곡 개저씨 발표
[40]
-
계층
소리On) 일본에 수출된 일본 밈
[34]
-
계층
폐지 줍줍
[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14-09-19 13:04
조회: 10,013
추천: 25
나대야 세상이 바뀐다! ▲ "누군가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한 배우 김부선.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요즘 ‘나대지 마라’가 화젯거리다. 시작은 아파트의 난방비 문제로 동네사람들과 마찰을 빚은 영화배우 김부선이었다. 이에 가수 방미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은근한 비난을 가하면서 문제는 좀 커진 것 같다. “억울함, 흥분되는 일, 알리고 싶은 일, 설치면서 드러내고 싶은 일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방미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김부선의 돌출행동을 은근히 ‘까면서’ 자산가로 성공한 연예인답게 훈수까지 두었다. 방미는 시치미를 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기실 이 비난은 시속(時俗) 말로 ‘나대지 마라’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다. 김부선의 ‘나댐’ -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애마부인’으로 먼저 기억되지만, 대중에게서 멀어진 배우 김부선은 타고난 성격 덕분에 이런저런 화제에 오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당연히 동료 연예인들이나 대중들로부터의 호오도 엇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일으키는 화제가 그 본질적 성격과는 무관하게 ‘나댐의 결과’로 치부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나대는’ 퇴물 배우에게 성공한 동료 연예인이 따끔하게 훈수를 두는 걸로 이 사건은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부선이 일으킨 마찰이 ‘아파트 난방비 관련 비리 폭로’와 이에 따른 이해 당사자 사이의 충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영화평론가 허지웅이 김부선을 옹호하며 방미에게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이다. 허지웅이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김부선은 부조리를 바로잡으려 한 용감한 연예인이 된 반면, 방미는 졸지에 쓸데없는 훈수를 두면서 헛폼만 잡는 이로 격하되어 버렸다. “부조리를 바로 잡겠다는 자에게 ‘정확하게 하라’도 아니고 그냥 ‘나대지 말라’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대개 바로 그 드센 사람들이 꼴사납게 자기 면 깎아가며 지켜준 권리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면서, 정작 그들을 꾸짖어 자신의 선비됨을 강조하기 마련이다.”‘나대다’는 은어처럼 유통되는 유행어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동사다. ‘깝신거리고 나다니다’, ‘나부대다’로 풀이되듯 이 낱말은 애당초 점잖은 선비와 지사(志士)의 행동거지와는 꽤 떨어져 있는 말이다. ‘나대지 마라’, 지배와 강자의 논리 그것은 ‘경솔·경망’ 따위의 단어와 훨씬 잘 어울리는 가볍고, 얄팍하면서 속이 들여다뵈는 행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거기엔 섣부르게 무슨 일에든지 나서는 행동에 대한 경멸과 질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아울러 ‘나도’ 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못마땅한 감정도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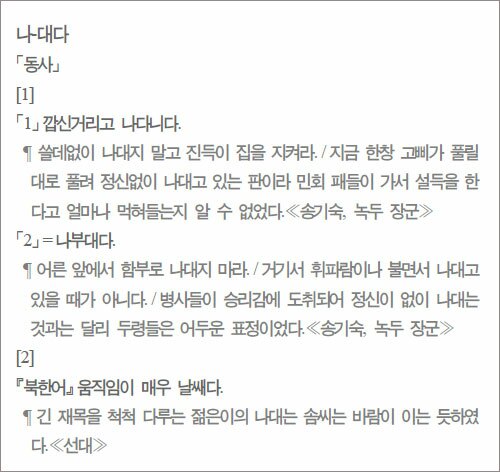 허지웅의 단칼은 그 점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고 보면, 오늘날 ‘나대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뜻으로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미 1990년대에 유행한 우스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류관순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는 난센스 퀴즈였는데 그 답이 ‘나대서’였던 것이다. 류관순 열사의 순국을 ‘나대다’로 비하하는 우스개는 우스개를 떠나서 우리 시대의 세태를 일정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우스개는 일제의 폭압에 신음하던 식민지 백성들이 만세운동으로 억눌린 민족의식을 떨친 것을 ‘나대다’로 비유했다. 그것은 물론 익살이고 풍자이긴 하다. 그러나 만분의 일이라도 거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나서서 한 것’이라는 뒤틀린 생각이 담겨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당한 저항을 ‘나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지배자와 강자의 논리다. 거기엔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공연히 분란을 일으킨다는 눈 흘김이 들어 있는 것이다. 허지웅이 갈파했듯 ‘나대지 말라’는 훈수를 둔 이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그들은 모순과 부조리에 덤벼들던 ‘드센 사람들이 꼴사납게 자기 면 깎아가며 지켜준 권리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 챙기면서, 정작 그들을 꾸짖는’ 사람이다. 그들은 일찍이 어떤 부당함 아래서도 자신의 ‘체신’을 지켜내는 놀라운 인내력을 보여준 바 있었다. 그들 덕분에 역사는 진보했다 1980년대에 싹트기 시작한 학교 민주화 시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일제 강점기와 수십 년에 걸친 독재정권기를 거치면서 학교는 완고하고 뒤틀린 권력의 아성이 되어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부-교육청-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료체제의 말단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명하복으로 점철된 시간을 쟁이고만 있었다. 그 굴종의 시간, 교단의 구각을 벗기고 올린 교육민주화의 깃발을 지켜냈던 일군의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 ‘벌떡 교사들’ 역시 학교 관리자들로부터 ‘나대지 말라’는 주문을 받았던 이들이었다. 모순과 불합리에는 반대했지만, 그에 대한 저항으로 말미암은 분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료들도 적잖았다. 이들의 논리도 관리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싸움의 과실을 고스란히 향유하는 데는 빠지지 않았다. 이들이 외쳤던 숱한 민주화 요구 가운데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했지만 학교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요구했던 개혁이 제도로 수렴되면서 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정하게 바뀌어 갔다. 현 정부 들면서 강행한 ‘노조 아님’ 덕분에 교원노조는 합법화 20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되돌아갔지만 말이다. 이처럼 ‘나대지 마라’의 역사는 만만찮다. 돌이켜보라. 역사 시대 이래, 인류가 이루어진 변화와 진보의 단초는 늘 ‘나댐’이었다. 천부인권설도, 인간의 평등권도,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저항권도 그 실마리를 풀어낸 최초의 사람은 그 시대의 ‘나댄’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다. 그런 뜻에서 오늘날 인류가 이루어낸 진보의 역사는 곧 ‘나대지 마라’는 금지의 언어를 넘어 이룬 것이다. 그 간단치 않은 금제(禁制)를 뚫어낸 이들의 희생이 마중물이 되어 이룩한 역사의 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진보의 역사를 열어나간 이들을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건 아닐까.  나대지 마라 ≒ 가만히 있으라 역사의 진전과는 별개로 어느 시대에나 ‘나대지 마라’는 금지의 언어는 존재한다. 세상이 기득권과 주류에 의해 재단되고 그들이 구축한 질서에 따라 굴러가야 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나대는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구동성을 주문하는 것이다. ‘나대지 마라.’ 머지않은 기억들 가운데 ‘나대지 마라’가 환기해 주는 기시감이 있다. 그렇다. 불과 다섯 달 전, 진도 앞바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를 향하고 있었던 열여덟 풋풋한 아이들을 그 심해로 가라앉힌 금제의 언어 ‘가만히 있으라’다. 그것은 ‘나대지 마라’보다 다소 점잖은 표현일 뿐, 그 속뜻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지금 세월호 유족을 비롯하여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믿는 이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도 그들을 외면하는 정권과 기득권 계층에겐 필시 ‘나댐’으로 여겨질 터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속절없이 잃은 이 어버이들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싸운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그들이 감당해 온 싸움은 그러나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식 잃은 어버이들이 슬픔과 아픔을 묻어두고 거리에서 한뎃잠을 자고, 끼니를 끊은 것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원이 희망을 그려갈 수 있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싸움은, 역사의 진보는 그들 것이 되리라. (원문 출처 링크·글쓴이 낮달) |
 나프나프
나프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