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14-10-30 07:31
조회: 20,048
추천: 3
1968, NY할렘, 리로이 존스 - 노예들의 사슬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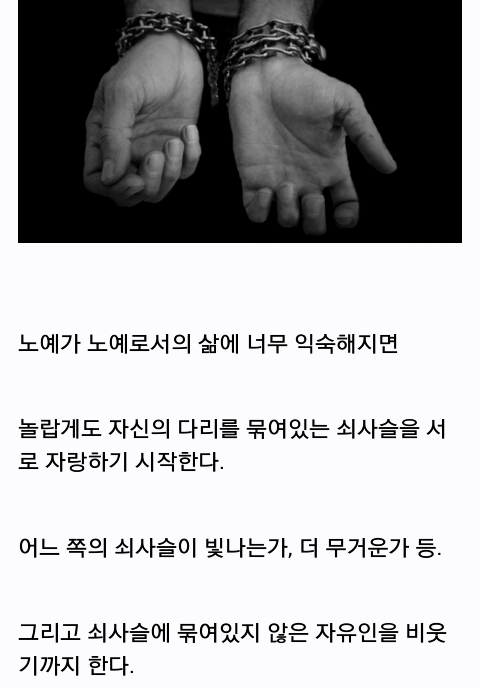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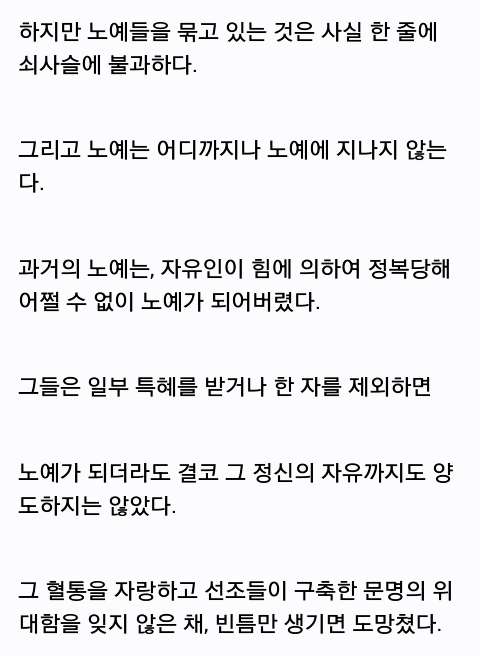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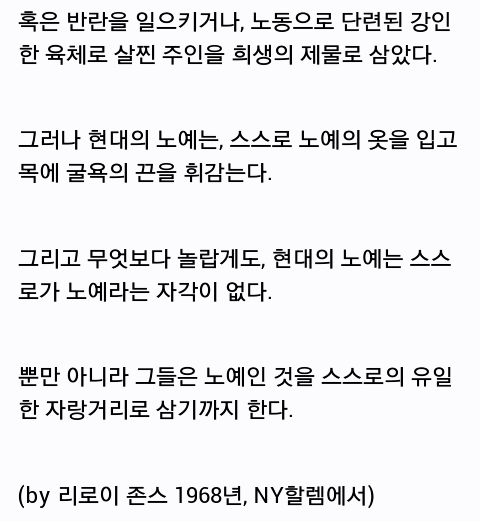 "기자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애들 학원 끝나고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국내 제약회사 영업직원으로 일하는 김승규(가명ㆍ34)씨를 만난 건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 즈음이었다. 김씨는 약속시간보다 4분 늦은 기자를 심하게 타박했다. 운전을 하는 중에도 "애들이 배가 많이 고플 텐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가 말하는 '애들'은 김씨의 자녀들이 아니다. 거래처 병원의 원장 자녀들이다. 김씨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9시 50분 서울 목동의 한 학원 앞에서 의사의 중학생 자녀들을 만나 자동차로 20여분 떨어진 집까지 그들을 데려다 준다. 그는 "아이들 픽업(pick-up)은 원장님께서 (수많은 영업사원 중에서) 저한테만 특별히 하는 부탁"이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을 데려다 준 후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시계바늘이 어느덧 오후 10시20분을 가리켰다. "피곤하지 않냐"는 질문에 "힘들지만 내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학술세미나 준비로 피곤해하는 의사를 지방 세미나장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다"며 "밤낮 없이 뛴 덕분에 실적은 꽤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래관행이 '갑과 을'의 틀에서 작동되는 건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제약업계는 그런 문화가 가장 강한 분야다. 비슷비슷한 약을 만드는 제약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약품선택권을 쥔 의사는 그야말로 '슈퍼 갑'이다. '리베이트'가 공공연하게 오갔던 것도 불과 얼마 전이다. 당국의 리베이트 쌍벌죄적용방침에 따라 금품수수는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갑을 관계는 달라질 수 없는 법. 그러다 보니 김씨처럼 '몸으로 떼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자 김씨는 "내일 아침 일찍 (병원)원장님 모시고 골프장에 가야 한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골프를 배웠다는 사실에 놀라자 "그냥 모셔다 드리러 가는 것"이라며 또 한 번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속내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는 큰 불만이 없어 보였다. "주말까지 기사 노릇을 시키는 의사에게 부당함을 느끼지는 않냐"고 묻자 김씨는 "혹시 외국에서 살다 오셨냐"며 오히려 기자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봤다. 올해로 입사 6년 차인 김씨는 임금과 실적수당(인센티브)을 합해 연 평균 4,900만원 정도를 번다고 했다. 여기에 하루 3만원 안팎으로 받는 일비(일일 활동비)까지 감안하면 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정도 수입을 위해서라면 '원장님 기사 노릇'정도의 부당함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태도였다. 그는 "영업의 꽃이라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말부터 "요즘 신입들은 참을성이 없다"는 후배타박까지 자신의 철학을 쏟아냈다. (중략) 올 초 한 유명 국제기구의 한국지부에서 '무보수'인턴으로 일한 김학영(가명ㆍ22)씨는 당시의 경험을 "고맙다"고 표현했다. 김씨는 "최고의 기회를 잡았고, 최고의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보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구 측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구 측이 식비ㆍ교통비를 주지 않았음에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사인을 요구했다는 것. 김씨는 실제로 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사인을 했고, 이에 대해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국제기구가 자신에게 준 경험과 무엇보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스펙'이 못 받은 식비나 교통비 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턴 기회를 준 것과 받지도 않은 식비를 받았다고 하라는 것은 별개 문제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렇다 해도 이런 인턴 기회가 또 생기면 반드시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에서 3년간 승무원으로 일했던 최승희(가명ㆍ29)씨는 ▦유니폼 착용시 근무 종료 이후라도 이동 중 전화사용 금지 ▦커피 등 음료수 들고 다니며 마시는 행위 금지 등 회사의 부당한 지시사항(본보 10월 15일자 20면)에 회의를 느껴 퇴사했다. 최씨는 "실제로 승무원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요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 "(회사는) 대외적으로 지시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강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더 속상했던 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다. 이 사안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보니 '유니폼을 입으면 회사를 대표하는 건데 당연한 것 아니냐', '돈 받고 일하는 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는 것.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 그 정도 부당함은 감수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최씨는 "어떤 경우든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라며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 부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스스로 의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누가 더 군생활 빡셌는지 누가 더 회사생활 빡센지 상처뿐인 영광이 뭐라고  |










 esurain
es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