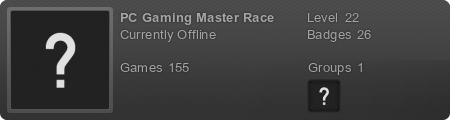мҳӨн”Ҳ мқҙмҠҲ к°Өлҹ¬лҰ¬ к°ҷмқҙ ліҙкі мӢ¶мқҖ мң лЁё кёҖмқҙлӮҳ мқҙлҜём§ҖлҘј мҳ¬л Өліҙм„ёмҡ”!
URL мһ…л Ҙ
-
кі„мёө
нҸҗм§Җ мӨҚмӨҚ
[12]
-
кі„мёө
мӮҙлӢӨк°Җ кІҒлӮҳкұ°лӮҳ л¬ҙм„ңмҡ°л©ҙ мқјм°Қ мқјм–ҙлӮҳліҙм„ёмҡ”.
[32]
-
м§ҖмӢқ
мҳҒнҷ” м•”мӮҙ м—јм„қ진мқҳ мӢӨм ңлӘЁлҚё
[29]
-
мң лЁё
лӮҳмқҙл“Өл©ҙ мғқкё°лҠ” мҠөкҙҖ
[32]
-
м—°мҳҲ
лё”лқјмқёл“ңм—җм„ң м¶”м •н•ң лҜјнқ¬м§„ мҝ лҚ°нғҖ кі„нҡҚ
[48]
-
кі„мёө
м „м„ёмӮ¬кё° лӢ№н•ҳл©ҙ мһҗмӮҙн•ҳлҠ” мқҙмң
[40]
-
м—°мҳҲ
лё”лқјмқёл“ңм—җм„ң н•«н•ң м–ҙлҠҗ мҰқк¶Ңл§Ёмқҳ лҜјнқ¬м§„ 분м„қ кёҖ
[58]
-
кі„мёө
мҳҒкөӯлӮЁмһҗ м»Ён…җмё к·јнҷ©
[50]
-
кі„мёө
мҶҢлҰ¬On) мқјліём—җ мҲҳм¶ңлҗң мқјліё л°Ҳ
[28]
-
к°җлҸҷ
мҷёкөӯмқё кҙҖкҙ‘к°қмқҳ 800л§Ңмӣҗ м°ҫм•„мӨҖ лІ„мҠӨкё°мӮ¬.
[8]
URL мһ…л Ҙ
- м—°мҳҲ лҜјнқ¬м§„ мҡёкі лӮң л’Ө мң нҠңлёҢ мұ„нҢ… [25]
- мқҙмҠҲ лҜјнқ¬м§„ кё°мһҗнҡҢкІ¬ лӢӨ ліҙкі л“Ө к№ҢлҠ”кұ°мһ„? [119]
- мң лЁё лҜјнқ¬м§„ кё°мһҗнҡҢкІ¬ л°©мӢңнҳҒ мӮ¬лӢЁ нҳём№ӯ ліҖнҷ” [18]
- кё°нғҖ лҜјнқ¬м§„ л°‘м—җм„ң мқјн•ҙліё лӮҳ... [8]
- мң лЁё мҳӨн”јм…ң) кІҪмҳҒмқҳ мӢ [12]
- мқҙмҠҲ лҜјнқ¬м§„ кё°мһҗнҡҢкІ¬ мҡ”м•Ҫ집 к°Җм ёмҷ”лӢӨ [28]
|
2015-08-23 03:12
мЎ°нҡҢ: 29,468
추мІң: 33
м„ёкі„мқҳ лӘ…л¬ёк°Җл“Ө - 1нҺё м„ұ(姓)кіј к°Җл¬ё0. м„ңлЎ  м„ёкі„лҠ” л„“кі мӮ¬лһҢмқҖ л§ҺмҠөлӢҲлӢӨ. кёём–ҙлҙҗм•ј 100л…„мқ„ л„ҳкёёк№Ң л§җк№Ңн•ҳлҠ” мқёк°„мқҙ мқҙ л•…м—җм„ң мІҳмқҢ л¬ёлӘ…мқҙлқјлҠ” кІғмқ„ м„ёмҡ°кі мӮ¬нҡҢлҘј л§Ңл“Өл©° мҶҢнҶөн•ҳкі к°Ҳл“ұн•ҳкі м„һмқҙкі л¶„лҰ¬лҗңм§Җк°Җ л°ҳл§Ңл…„мқҙ л„ҳмқҖ м§ҖкёҲк№Ңм§Җ мӮҙм•„мҳЁ мӮ¬лһҢмқҳ мҲҳлҠ” к·ём•јл§җлЎң мІңл¬ён•ҷм Ғмқё лӢЁмң„кІ мЈ . к·ё мҲҳл§ҺмқҖ мӮ¬лһҢл“Ө мӨ‘м—җм„ң мқјл¶Җмқҳ м–ҳкё°л§Ңмқ„ лҒҢм–ҙмҷҖ м—ӯмӮ¬лҘј л…јн•ҳлҠ”кұҙ мқјмў…мқҳ мҳҒмӣ…мЈјмқҳлЎң л№ м§Ҳ мҡ°л Өк°Җ мһҲмңјлӢҲ, мқҙм—җ мқҙл¬ём—ҙ нҸүм—ӯ мӮјкөӯм§Җмқҳ м„ңмһҘмқ„ мЎ°кёҲ мқёмҡ©н•ҳл©ҙм„ң кёҖмқ„ мӢңмһ‘н•ҙліјк№Ң н•©лӢҲлӢӨ. нӢ°лҒҢ мһҗмңҪн•ң мқҙ л•… мқјмқ„ н•ңл°”нғ• кёҙ лҙ„кҝҲмқҙлқј мқҙлҘј мҲҳ мһҲлӢӨл©ҙ, к·ё н•ңл°”нғ• кҝҲмқ„ кҫёлҜёкі ліҙнғң м–ҳкё°н•Ё лҳҗн•ң л¶Җм§Ҳм—ҶлҠ” мқјмқҙ м•„лӢҲкІ лҠ”к°Җ.В мӮ¬лһҢмқҖ к°ҷмқҖ лғҮл¬јм—җ л‘җ лІҲ л°ңмқ„ лӢҙкёҖ мҲҳ м—Ҷкі , л•Ңмқҳ нқҗлҰ„мқҖ лӢӨл§Ң лӮҳм•„к°Ҳ лҝҗ лҗҳлҸҢм•„мҳӨм§Җ м•ҠлҠ” кІғмқ„, мғҲмӮј м§ҖлӮҳк°„ лӮ мҠӨлҹ¬м§„ мӮ¶мқ„ лҸҢмқҙмјң кёёкІҢ м Ғм–ҙ лӮҳк°җлҸ„В л§Ҳм°¬к°Җм§ҖлЎң н—ӣлҗҳмқҙ 값진 мў…мқҙлҘј лІ„л Ө лӮЁмқҳ лҲҲл§Ң м–ҙм§ҖлҹҪнһҲлҠ” мқјмқҙ лҗҳм§Җ м•ҠкІ лҠ”к°Җ. к·ёлҹ¬н•ҳлҗҳ кҝҲмҶҚм—җ мһҲмңјл©ҙм„ң к·ёкІҢ кҝҲмқё мӨ„ м–ҙл–»кІҢ м•Ңл©°, нқҗлҰ„ мҶҚм—җ н•Ёк»ҳ нқҗлҘҙл©° м–ҙл–»кІҢ к·ё нқҗлҰ„мқ„ лҠҗлҒјкІ лҠ”к°Җ.В кҝҲмқҙ кҝҲмқё мӨ„ м•Ңл Өл©ҙ к·ё кҝҲм—җм„ң к№Ём–ҙлӮҳм•ј н•ҳкі , нқҗлҰ„мқҙ нқҗлҰ„мқё мӨ„ м•Ңл Өл©ҙ к·ё нқҗлҰ„м—җм„ң лІ—м–ҙлӮҳм•ј н•ңлӢӨ.В л•ҢлЎң л•…лҒқм—җ лҜём№ҳлҠ” нҒ° м•Һкіј н•ҳлҠҳк°Җм—җ мқҙлҘҙлҠ” лҶ’мқҖ к№ЁлӢ¬мқҢмқҙ мһҲм–ҙ лҚ”лҹ¬ к№Ём–ҙлӮҳкі лҳҗ лІ—м–ҙлӮҳлҗҳ, к·ё к°ҷмқҖ мқјмқҙ м–ҙм°Ң м—¬лҠҗ мҡ°лҰ¬м—җкІҢк№Ңм§ҖлҸ„ н•ңкІ°к°ҷмқ„ мҲҳк°Җ мһҲмңјлһҙ.В лҶҖмқҙм—җ л№ м ё н•ҙк°Җ м ём•ј лҸҢм•„к°Ҳ 집мқ„ мғқк°Ғн•ҳлҠ” м–ҙлҰ°м•„мқҙ мІҳлҹј, нӢ°лҒҢкіј лЁјм§Җ мҶҚмқ„ м–ҙм§Җлҹ¬мқҙ н—Өл§ӨлӢӨк°Җ л•Ңк°Җ мҷҖм„ңм•ј лҶҖлһҢкіј мҠ¬н”” мҶҚм—җ лӢӨмӢң н•ң мӨҢ нқҷмңјлЎң лҸҢм•„к°ҖлҠ” мҡ°лҰ¬мқё кІғмқ„.В 1. лӢ№мӢ мқҖ лҲ„кө¬мһ…лӢҲк№Ң? лӘЁлҘҙлҠ” мӮ¬лһҢмқ„ л§ҢлӮ¬мқ„л•Ң м—¬лҹ¬л¶„мқҖ мһҗмӢ м—җ м–ҙл–Ө кІғмқ„ лЁјм Җ мҶҢк°ңн•ҳкІ мҠөлӢҲк№Ң? мӢӯмӨ‘нҢ”кө¬лҠ” мқҙлҰ„мқҙкІ мЈ . "м ҖлҠ” н…Ңл¬ҙ진мһ…лӢҲлӢӨ." "м ҖлҠ” мқҙлҸ„мһ…лӢҲлӢӨ." мҷҖ к°ҷмқҙ л§җмқҙмЈ . мқҙлҰ„мқҖ лӮЁкіј мһҗмӢ мқ„ кө¬л¶„н•ҳлҠ” к°ҖмһҘ ліҙнҺём Ғмқё л°©лІ•мһ…лӢҲлӢӨ. лҸҷлӘ…мқҙмқёмқ„ л§ҢлӮҳл©ҙ мӢ кё°н•ҙн•ҳлҠ” мқҙмң лҸ„ мқҙлҰ„мқҙ мӮ¬лһҢмқ„ кө¬л¶„н•ҳкё° мң„н•ҙ мһҲлҠ” кІғмқҙкё° л•Ңл¬ёмқҙмЈ .В н•ҳм§Җл§Ң мқёлҘҳмқҳ м—ӯмӮ¬м—җм„ң мӮ¬лһҢмқҙ мқҙлҰ„мқ„ к°Җм§ҖкІҢ лҗңкұҙ к·ёлӢӨм§Җ мҳӨлһҳлҗң кІғмқҙ м•„лӢҷлӢҲлӢӨ. мқҙлҰ„мқҖ мӢӨм§Ҳм ҒмңјлЎңлҠ” к·ёкІғмқҙ м§Җм№ӯн•ҳлҠ” мӮ¬лһҢкіј лі„ м—°кҙҖм„ұмқҙ м—Ҷкё° л•Ңл¬ёмқҙмЈ . мҳҲлҘј л“Өм–ҙ лІ„лқҪ мҳӨл°”л§ҲмҷҖлҠ” мқҙлҰ„кіј м§ҖкёҲ лҜёкөӯ лҢҖнҶөл № мӮ¬мқҙм—җлҠ” мһҗм—°м Ғмқё м—°кҙҖм„ұмқҙ м „нҳҖ м—ҶмҠөлӢҲлӢӨ. к·ё мӮ¬лһҢмқҳ м–јкөҙм—җ лІ„лқҪмқҙлқјкі мҚЁмһҲлӮҳмҡ”? м•„лӢҲл©ҙ лІ„лқҪмқҙлқјлҠ” мқҙлҰ„мқҙ к·ёмқҳ мҷёлӘЁлҘј лӮҳнғҖлӮҙлҠ” нҳ•мҡ©мӮ¬мқёк°Җмҡ”? л‘ҳ лӢӨ м•„лӢҲмЈ . м—¬кё°м„ң м•Ң мҲҳ мһҲл“Ҝмқҙ мқҙлҰ„мқҖ мӮ¬нҡҢм Ғ н•„мҡ”м—җ мқҳн•ҙ мғқкІЁлӮң, мҷ„м „нһҲ мқёкіөм Ғмқё мӮ°л¬јмһ…лӢҲлӢӨ. н•ҷмһҗл“ӨмқҖ ліҙнҶө 80лӘ…м—җм„ң 100лӘ…мқҙ мқҙлҰ„ м—Ҷмқҙ мӮ¬нҡҢк°Җ мң м§Җлҗ мҲҳ мһҲлҠ” к°ҖмһҘ нҒ° к·ңлӘЁлЎң лҙ…лӢҲлӢӨ. мқҙ к·ңлӘЁк°Җ ліҙнҶө мӮ¬лһҢмқҳ мҷёлӘЁлӮҳ мӮ¬нҡҢ лӮҙмқҳ м—ӯн• л“ұмңјлЎң лӘЁл‘җк°Җ м„ңлЎңлҘј м•Ңм•„ліј мҲҳ мһҲлҠ” мөңлҢҖ к·ңлӘЁлқјлҠ” кІғмқҙмЈ . мқҙкІғліҙлӢӨ лҚ” нҒ¬кұ°лӮҳ мһ‘лӢӨкі мғқк°Ғн•ҳмӢңлҠ” 분мқҖ н•ҷмғқмқҙмӢңлқјл©ҙ мҙҲмӨ‘кі лҘј к°ҷмқҙ лӮҳмҳЁ м№ңкө¬лҘј, м§ҒмһҘмқёмқҙмӢңлқјл©ҙ 3л…„ мқҙмғҒ к°ҷмқҙ к·јл¬ҙн•ң лҸҷлЈҢлҘј лҚ°лҰ¬кі н•ңлІҲ мӢӨн—ҳн•ҙлҙ…мӢңлӢӨ. мҠӨн”јл“ң нҖҙмҰҲмІҳлҹј к·ё мӮ¬лһҢм—җ лҢҖн•ҙ м„ӨлӘ…н•ҙліҙкі лӘҮлӘ…к№Ңм§ҖлӮҳ кіөк°җн• мҲҳ мһҲлӮҳ ліҙл©ҙ лҗ©лӢҲлӢӨ. лӢЁ, нҳ„лҢҖмқёмқҖ кі лҢҖмқёл“ӨліҙлӢӨ нӣЁм”¬ л§ҺмқҖ мӮ¬лһҢмқ„ л§ҢлӮҳлҜҖлЎң кё°м–өн•ҳлҠ” мҲҳк°Җ мӨ„м–ҙл“Ө мҲҳ мһҲлӢӨлҠ”кұё к°җм•Ҳн•ҙм•ј н•©лӢҲлӢӨ. к°Ғм„Өн•ҳкі , мқҙ к·ңлӘЁк°Җ л„ҳм–ҙк°Җкё° мӢңмһ‘н•ҳл©ҙ мқҙм ң лӘЁл“ кө¬м„ұмӣҗмқҙ м„ңлЎңлҘј мҷёлӘЁлӮҳ лӘ©мҶҢлҰ¬к°ҷмқҖ мһҗм—°м Ғ мҡ”мҶҢлЎң лӢӨлҘё мӮ¬лһҢкіј кө¬л¶„н• мҲҳ м—ҶкІҢ лҗ©лӢҲлӢӨ. мқҙлҹ¬л©ҙ мқҙм ң м„ңлЎңм—җкІҢ мқҙлҰ„мқ„ л¶ҷм—¬ мЈјкё° мӢңмһ‘н•ҳмЈ . мІҳмқҢм—” н–үлҸҷмқҙлӮҳ мҷёлӘЁ, м•„лӢҲл©ҙ мқҙлӨ„лӮё м—…м Ғм—җм„ң мқҙлҰ„мқ„ л”° мӨҚлӢҲлӢӨ. мҡ°лҰ¬к°Җ нқ”нһҲ м•„лҠ” м•„л©”лҰ¬м№ҙ мӣҗмЈјлҜјл“Өмқҳ мқҙлҰ„мқҙ мқҙлҹ° мӢқмқҙмЈ .
в–І м•„л©”лҰ¬м№ҙ мӣҗмЈјлҜј "мӣ…нҒ¬лҰ° нҷҜмҶҢ". мқҙ "мӣ…нҒ¬лҰ° нҷ©мҶҢ"лқјлҠ” мқҙлҰ„мқҖ мқҙ мӮ¬лһҢмқҙ м•”мҶҢмқҳ к·ҖлҘј л‘җ мҶҗмңјлЎң мһЎкі м“°лҹ¬лңЁл Өм„ң м–»мқҖ мқҙлҰ„мқҙлқјкі н•ҳл„Өмҡ”. мң„мҷҖ к°ҷмқҖ мқҙлҰ„мқҖ м•„м§Ғ мӮ¬нҡҢк°Җ мһ‘кұ°лӮҳ, к·ё мқёл¬јмқҙ лӢӨлҘё мӮ¬лһҢл“Өкіј 비көҗн•ҙ нҠ№м¶ңлӮң м җмқҙ мһҲлӢӨл©ҙ мғҒлӢ№нһҲ мң нҡЁн•ң мһ‘лӘ…лІ•мһ…лӢҲлӢӨ. н•ҳм§Җл§Ң лҢҖл¶Җ분мқҳ мӮ¬лһҢл“ӨмқҖ к·ёл ҮкІҢ лӢӨлҘё мӮ¬лһҢкіј 비көҗн•ҙ нҠ№м¶ңлӮң м җмқҙ л“ңлҹ¬лӮҳм§Җ м•ҠмңјлҜҖлЎң мӮ¬нҡҢк°Җ м»Өм§Җл©ҙ 비мҠ·н•ң мқҙлҰ„мқҙ м–‘мӮ°лҗҳмЈ . мң„мҷҖ к°ҷмқҖ мӮ¬лЎҖк°Җ л§Һм•ҳлӢӨл©ҙ "мӣ…нҒ¬лҰ° нҷ©мҶҢ" "л“ңлҹ¬лҲ„мҡҙ нҷ©мҶҢ" "мЈјм Җм•үмқҖ нҷ©мҶҢ" к°ҷмқҖ мқҙлҰ„мқҙлқјкі н• к№Ңмҡ”. к·ёл Үкё°м—җ лҢҖм•ҲмңјлЎң м җм җ мӮ¬нҡҢк°Җ ліөмһЎн•ҙм ё м„ңлЎң н•ҳлҠ” мқјмқҙ лӢ¬лқјм§Җл©ҙ м§Ғм—…мңјлЎң мқҙлҰ„мқ„ л¶ҷм—¬ мЈјкё° мӢңмһ‘н•©лӢҲлӢӨ. лҸ…мқјмқёмқҳ мқҙлҰ„м—җ мқҙкІҢ к°ҖмһҘ мһҳ лӮЁм•„мһҲлҠ”лҚ°, мҠҲл§Ҳн—Ҳ(мӢ л°ңкіө), л°”мҡ°м–ҙ(лҶҚл¶Җ), л®җлҹ¬(н’Қм°ЁмһҘмқё) л“ұл“ұмқҙ мһҲкІ л„Өмҡ”.
в–І л Ҳмқҙм„ң мҠҲл§Ҳн—ҲлҠ” мҳӣлӮ мқҙм—Ҳмңјл©ҙ мӢ л°ң л§Ңл“ңлҠ” мӮ¬лһҢ мқҙлҰ„мқҙм—ҲмЈ л¬ём ңлҠ” мқҙ мқҙлҰ„лҸ„ мӮ¬нҡҢк°Җ л„Ҳл¬ҙ м»Өм ё лҸҷмў…м—…кі„к°Җ л°ңмғқн•ҳл©ҙ кө¬л¶„мқҙ м•ҲлҗңлӢӨлҠ”кұ°мЈ . лҸҷл„Өм—җ мӢ л°ңкіөмқҙ мқјкіұ мһҲлҠ”лҚ° мқјкіұ лӘ… лӢӨ мқҙлҰ„мқҙ мҠҲл§Ҳн—Ҳм—җмҡ”. мқҙлҹ¬л©ҙ кө¬л¶„мқҙ лҗҳкІ мҠөлӢҲк№Ң? мқҙлһҳм„ң лӮҳмҳЁкІҢ м–ҙл–Ө лң»мқҙ мһҲлҠ” лӢЁм–ҙлҘј мқҙлҰ„мңјлЎң м“°лҠ” кІғмһ…лӢҲлӢӨ. мқҙ л°©лІ•мқҖ м§ҖкёҲк№Ңм§ҖлҸ„ м“°мқҙлҠ” кұҙлҚ°, л©ҖлҰ¬ к°Ҳ кІғлҸ„ м—Ҷмқҙ н‘ңмқҳл¬ёмһҗмқё н•ңмһҗ л¬ёнҷ”к¶ҢмқҖ мқҙлҰ„мқҙ лҢҖл¶Җ분 лң»мқ„ л”°лқј м§Җм–ҙ진 кІғмқҙмЈ . мқҙ кёҖмқ„ ліҙмӢңлҠ” м—¬л Ө분мқҳ мқҙлҰ„лҸ„ л¶ҖлӘЁлӢҳмқҙ мўӢмқҖ лң»мқ„ лӢҙмқҖ мқҙлҰ„мқ„ м§Җм–ҙмЈјм…Ёмқ„ кІҒлӢҲлӢӨ. 2. лӢ№мӢ мқҳ мЈјліҖ мқёл¬јмқҖ м–ҙл–Ө мӮ¬лһҢмһ…лӢҲк№Ң? мһҗ мқҙм ң к°Ғмў… лң» мһҲлҠ” мқҙлҰ„ - к·ёлҹ¬лӢҲк№Ң м„ңм–‘мңјлЎң м№ҳмһҗл©ҙ н—ӨмҲҳмҠӨ, мҡ”н•ң, л§ҲлҰ¬м•„, мһӯ, л§ҲмқҙнҒҙ л“ұл“ұл“ұ - мқ„ м“°лҠ”кұёлЎң 분мң„кё°к°Җ м •м°©лҗҗмҠөлӢҲлӢӨ. л¬ём ңлҠ” мқҙлҹ¬л©ҙ лҳҗ м Җ мӮ¬лһҢмқҙ лӯҗн•ҳлҠ” мӮ¬лһҢмқём§Җ, м–ҙл”” мӮ¬лһҢмқём§Җ, лҲ„кө¬мҷҖ к°Җк№Ңмҡҙ мӮ¬лһҢмқём§Җ мқҙлҰ„мңјлЎң м „нҳҖ кө¬л¶„мқҙ м•ҲлҗңлӢӨлҠ”кұ°мЈ . к·ёлһҳм„ң л“ұмһҘн•ңкІҢ м„ұ(姓)мһ…лӢҲлӢӨ. мһҗ к·ёлҹј мқҙм ң м„ұмқҖ лӯҗлЎң л¶ҷмқјк№Ңмҡ”? н•ҳлӮҳлҠ” лӮҙк°Җ кіјкұ°мқҳ мң лӘ…н•ң мқёл¬јмқҳ мһҗмҶҗмһ„мқ„ лӮҙм„ёмҡ°лҠ” кІғмһ…лӢҲлӢӨ. лӮҙ мЎ°мғҒмқҖ мқҙл ҮкІҢ мң„лҢҖн•ҳлӢҲ лӮҳлҸ„ к·ё нҳҲнҶөмқ„ мһҮлҠ” мһҗлЎңмҚЁ 충분нһҲ мЎҙмӨ‘л°ӣмқ„ мһҗкІ©мқҙ мһҲлӢӨ! лқјлҠ” мЈјмһҘмқҙмЈ . мқҙ мһ‘лӘ…, к·ёлҹ¬лӢҲк№Ң мһ‘м„ұлІ•мқҳ нқ”м ҒмқҖ лҹ¬мӢңм•„м—җ нқ”н•ҳкІҢ лӮЁм•„мһҲмҠөлӢҲлӢӨ. лҹ¬мӢңм•„мқёл“Ө мқҙлҰ„мқ„ ліҙл©ҙ мқҙл°ҳ мқҙ바노비м№ҳ, н‘ңнҠёлҘҙ мқҙмӮ¬мҪ”비м№ҳмІҳлҹј ~비м№ҳлқјлҠ” м„ұмқҙ л§ҺмқҖлҚ°, мқҙлҠ” ~мқҳ мһҗмҶҗмқҙлқјлҠ” лң»мһ…лӢҲлӢӨ. л¬јлЎ мқҙл°ҳк°ҷмқҖ мқҙлҰ„мқҖ м—„мІӯ нқ”н•ҳлӢҲ мқҙ바노비м№ҳлқјкі лӢӨ к°ҷмқҖ 집м•ҲмқҖ м•„лӢҲкІ мЈ ?
в–І мҳҒнҷ” <л°ҳм§Җмқҳ м ңмҷ•> мӨ‘м—җм„ң к°Ҳлқјл“ңлҰ¬м—ҳмқҙ "мҠӨлһҖл‘җмқјмқҳ м•„л“Ө" л ҲкіЁлқјмҠӨлқјкі л¶ҖлҘҙмЈ н•ҳм§Җл§Ң мқҙ л°©мӢқмқҖ лӮҙк°Җ Aмқҳ мһҗмҶҗмқҙлӢӨлқјкі мЈјмһҘн•ҳлҠ”кұё мғҒлҢҖк°Җ мқём •н•ҙм•јн•ң лӢӨлҠ” кұҙ л‘ҳм§ём№ҳлҚ”лқјлҸ„, AлқјлҠ” мӮ¬лһҢмқ„ мғҒлҢҖл°©мқҙ лӘЁлҘҙл©ҙ м•„л¬ҙ мқҳлҜёк°Җ м—ҶмҠөлӢҲлӢӨ. мң„мқҳ л ҲкіЁлқјмҠӨк°ҷмқҖ мҳҲл§Ң н•ҳлҚ”лқјлҸ„ л ҲкіЁлқјмҠӨмқҳ м•„лІ„м§ҖлҠ” м–ҙл‘ мҲІмқҳ мҷ•мқҙкё°м—җ к·ёмқҳ м•„л“ӨмқҙлқјлҠ”кұҙ 충분нһҲ мЎҙмӨ‘л°ӣм•„м•ј н• мқҙмң мқҙкі , мқҙл Үкё° л•Ңл¬ём—җ к°Ҳлқјл“ңлҰ¬м—ҳмқҙ "мҠӨлһҖл‘җмқјмқҳ м•„л“Ө"мһ„мқ„ көімқҙ м–ёкёүн•ҳл©ҙм„ң л ҲкіЁлқјмҠӨлҘј л§һмқҙн•ҳлҠ” кұ°мЈ . нҳ„мӢӨмқҳ мҳҲлҘј л“Өмһҗл©ҙ м•Ңн”„ м•„лҘҙмҠ¬лһҖ м…ҖмЈјнҒ¬ к°ҷмқҖ 11м„ёкё°мқҳ мқёл¬јмқ„ нҳ„лҢҖ лҢҖн•ңлҜјкөӯм—җ лҒҢм–ҙмҷ”мқ„ л•Ң, к·ё мӮ¬лһҢмқҙ мһҗмӢ мқҙ м…ҖмЈјнҒ¬мқҳ нӣ„мҶҗмқҙлӢҲ лӮҳлҘј мЎҙмӨ‘н•ҙлқј! лқјкі л§җн•ҳл©ҙ лӢ№мӢ мқҖ м–ҙл–Ө л°ҳмқ‘мқ„ ліҙмқҙмӢңкІ мҠөлӢҲк№Ң? м…ҖмЈјнҒ¬к°Җ лҲ„кө°лҚ°? н•ҳлҠ” л§җмқҙ лЁјм Җ лӮҳмҳӨкІ мЈ . лҶҚм—… кё°л°ҳмқҳ кі лҢҖ~к·јлҢҖ мӮ¬нҡҢм—җм„ңлҠ” нҸүлҜјл“Өмқҙ мһҗмӢ мқҳ м¶ңмӢ м§Җм—ӯмқ„ л– лӮ мқјмқҙ л“ңл¬јм—Ҳкё° л–„л¬ём—җ м• мҙҲм—җ м„ұмқҙ н•„мҡ” м—Ҷм—Ҳкі , мҷёл¶ҖмҷҖ м ‘мҙүмқҙ л§ҺмқҖ м§Җл°°мёөл“Өмқҙ м„ұмқ„ к°Җм§ҖкІҢ лҗ©лӢҲлӢӨ. мң„мҷҖ к°ҷмқҖ мқҙмң лЎң лӮҳлҠ” лҲ„кө¬мқҳ нӣ„мҶҗ лҲ„кө¬мһ…лӢҲлӢӨлқјкі мҶҢк°ңлҘј н•ҳкё°м—җлҠ” лӢӨлҘё лҜјмЎұлҒјлҰ¬ м„ңлЎң кіөмң н•ҳлҠ” м§ҖмӢқмқҙ м ҒмңјлӢҲ лӮҳмҳЁ л°©лІ•мқҙ м§Җм—ӯмқҳ мқҙлҰ„мқ„ л¶ҷмқҙлҠ” кІғмһ…лӢҲлӢӨ.
в–І л“ңлқјл§Ҳ <мҷ•мўҢмқҳ кІҢмһ„>мқҳ лёҢлҰ¬м—”лҠҗ. мҠӨмҠӨлЎңлҘј Brienne of Tarth, к·ёлҹ¬лӢҲк№Ң "нғҖмҠӨ мӮ¬лһҢ лёҢлҰ¬м—”лҠҗ"лқјкі мҶҢк°ңн•ҳмЈ . мқҙлҹ° м„ұмқҖ лҙүкұҙм ңк°Җ мһҘкё°к°„ мң м§Җлҗҳм–ҙ нҠ№м • м§Җм—ӯкіј к°Җл¬ё к°„мқҳ м—°кҙҖм„ұмқҙ лҶ’м•ҳлҚҳ м„ңмң лҹҪк¶Ңм—җм„ң нқ”н•ҳкі , мғҒлҢҖм ҒмңјлЎң мӨ‘м•ҷ집к¶Ңнҷ”к°Җ мқјм°Қ 진н–үлҗң мқёлҸ„лӮҳ лҸҷм•„мӢңм•„ м§Җм—ӯм—җм„ңлҠ” м§Җм—ӯмқҳ м„ёл Ҙк°ҖлқјлҠ” к°ңл…җмқҖ мһҲм–ҙлҸ„ к·ё л•…мқҳ мЈјмқёмқҙлқјлҠ” к°ңл…җмқҖ мҷ• нҳ№мқҖ мІңмһҗм—җкІҢл§Ң мһҲм—ҲмңјлҜҖлЎң л§Өмҡ° л“ңл¬јкІҢ лӮҳнғҖлӮ©лӢҲлӢӨ. мҷём§Җм—җм„ң мҳЁ мӮ¬лһҢмқ„ "л¶ҖмӮ°лҢҒ" "лҢҖкө¬лҢҒ" л“ұмңјлЎң м№ӯн•ҳлҠ” кІғлҸ„ мқҙлҹ° кҙҖмҠөмқҳ нқ”м Ғмқҙлқјкі лҸ„ ліј мҲҳ мһҲкІ л„Өмҡ”. к·ё лӢӨмқҢмқҙ мқҙлҰ„мқ„ л§Ңл“Өл–„мҷҖлҸ„ л§Ҳм°¬к°Җм§ҖлЎң нҠ№м •н•ң лң»мқ„ к°Җ진 лӢЁм–ҙлҘј лҒҢм–ҙлӢӨ мқҙлҰ„мңјлЎң м“°лҠ”кІҒлӢҲлӢӨ. н•ңкөӯмқёмқҳ м„ұмқё н•ңмһҗ мқҙлҰ„мқҖ н‘ңмқҳ л¬ёмһҗлӢҲ л§җн• кІғлҸ„ м—Ҷкі , мң лҹҪмқҳ лӘ…л¬ёк°Җмқё н•©мҠӨл¶ҖлҘҙнҒ¬лҸ„ н•©мҠӨ(кұ°мЈјмқё) + л¶ҖлҘҙнҒ¬(м„ұ) = м„ұм—җ мӮ¬лҠ” мӮ¬лһҢ = к·ҖмЎұ мқҙлқјлҠ” лң»мқҙмЈ . мқҙл ҮкІҢ м„ұкіј мқҙлҰ„ лӘЁл‘җлҠ” к·ёмӮ¬лһҢмқ„ м§Ғм ‘м ҒмңјлЎң лӮҳнғҖлӮҙлҠ” кІғм—җм„ң мһҗм—°м Ғмқё м—°кҙҖмқҖ м „нҳҖ м—ҶлҠ” мӮ¬нҡҢм Ғмқё кІғмңјлЎң ліҖн•ҙ мҷ”мҠөлӢҲлӢӨ. 3. нҳ„лҢҖмҷҖ к·јлҢҖ мқҙм „мқҳ к°Җл¬ё нҳ„лҢҖм—җлҠ” к°Җл¬ёмқҙлқјлҠ” к°ңл…җмқҖ кұ°мқҳ мӮ¬лқјмЎҢмҠөлӢҲлӢӨ. м• мҙҲм—җ к·ҖмЎұмқҙлһҖкІҢ м—ҶлҠ” лӮҳлқјк°Җ лҢҖлӢӨмҲҳлӢҲк№Ң л”ұнһҲ к°Җл¬ёмқ„ л”°м§Ҳ мқҙмң к°Җ м—Ҷкі , мһҲлӢӨкі н•ҳлҚ”лқјлҸ„ к·ҖмЎұл“Өмқҙ к·№нһҲ мҶҢмҲҳмқёлҚ°лӢӨк°Җ нҳ„мӢӨм ҒмңјлЎңлҠ” нҸүлҜјл“Ө мң„м—җ кө°лҰјн•ҳлҠ” мһ…мһҘмқҙ м•„лӢҲлӢӨліҙлӢҲ лӢӨлҘё мӮ¬лһҢл“Өмқҙ лі„лЎң мӢ кІҪм“°м§Җ м•ҠмЈ . мЎұліҙлқјлҠ”кІҢ м•„м§ҒлҸ„ лӮЁм•„мһҲлҠ” н•ңкөӯм—җм„ң мӮ¬лҠ” мҡ°лҰ¬л“ӨлҸ„ л”ұнһҲ мҡ°лҰ¬ 8лҢҖ мЎ°мғҒмқҙ м–ҙл””м—җм„ң лӯҗн•ҳлҚҳ мӮ¬лһҢмқём§Җ, к°ҷмқҖ ліёкҙҖмқҳ 6мҙҢ м№ңмІҷ лҲ„к°Җ м–ҙл–Ө мқјмқҙ мһҲм—ҲлҠ”м§Җ мӢ кІҪм“°м§Җ м•Ҡмһ–м•„мҡ”?
в–І мқҙм ңлҠ” кө¬мӢңлҢҖмқҳ мң л¬јлЎң лӮЁмқҖ мЎұліҙ н•ҳм§Җл§Ң нҳҲнҶөмқҙ кі§ м„ёмҠөмқҳ мқҙмң лҘј лң»н–ҲлҚҳ к·јлҢҖк№Ңм§ҖлҠ” к°Җл¬ёмқҖ лӘ©мҲЁмқ„ кұёкі м§Җмјңм•ј н• кІғмқҙм—ҲмҠөлӢҲлӢӨ. лӮҙк°Җ мҷ•мқҳ м•„л“ӨмқҙлӢҲк№Ң лӢӨмқҢ мҷ•мқҙлӢӨ! лқјлҠ”кұҙ л„Ҳл¬ҙ нқ”н•ҳлӢҲк№Ң л„ҳм–ҙк°ҖлҚ”лқјлҸ„ лӮҳлҠ” м „м „мҷ•мқҳ мӮ¬мҙҢмқҳ м•„л“ӨмқҙлҜҖлЎң мҷ•мқҙ лҗ мһҗкІ©мқҙ мһҲлӢӨ к°ҷмқҖ мҲҳмӨҖмқҳ мЈјмһҘмқҙ мӢӨм ң м„ңм–‘мӮ¬м—җм„ң м ҒлӢ№н•ң нҒҙл Ҳмһ„мңјлЎң л°ӣм•„л“Өм—¬м§Җкё°к№Ңм§Җ н•ң кұҙ нҳ„лҢҖ мӮ¬нҡҢм—җм„ м „нҳҖ мқҙн•ҙн• мҲҳ м—Ҷмқ„м§Җ лӘЁлҘҙм§Җл§Ң нҳҲнҶөмқҙ кі§ м •нҶөм„ұмқё к·јлҢҖм—җлҠ” лӢ№м—°н•ң мқјмқҙм—ҲмЈ . к·ёлҹ¬лҜҖлЎң к·јлҢҖк№Ңм§Җмқҳ мӨ‘м•ҷ집к¶Ңкөӯк°Җл“Өмқҳ м—ӯмӮ¬лҠ” нҶөм№ҳмһҗмҳҖлҚҳ к°Җл¬ёмқҳ м—ӯмӮ¬мқј мҲҳ л°–м—җ м—Ҷкі , к·ёл Үкё°м—җ лӘ…л¬ёк°Җл“Өмқҳ м—ӯмӮ¬лҠ” м„ёкі„мӮ¬лҘј мқҙн•ҙн•ҳлҠ” кІғм—җ мһҲм–ҙ м•„мЈј мӨ‘мҡ”н•ң м—ӯн• мқ„ н• мҲҳ мһҲмҠөлӢҲлӢӨ. лӢӨмқҢ кёҖ л¶Җн„°лҠ” м—ӯмӮ¬ мҶҚмқҳ лӘ…л¬ёк°ҖлҘј лҸҷм„ңкі кёҲ к°ҖлҰ¬м§Җ м•Ҡкі мҶҢк°ңн•ҳлҸ„лЎқ н•ҳкІ мҠөлӢҲлӢӨ. мІҳмқҢмқҖ мҳЁлқјмқё кІҢмһ„ <л§Ҳ비노기>лЎң м№ңмҲҷн•ң 분л“Өмқҙ л§ҺмқҖ м•„мқјлһңл“ңл¶Җн„° мӢңмһ‘н•ҳлҸ„лЎқ н•ҳкІ м”ҒлӢҲлӢӨ.
EXP
118,864
(35%)
/ 135,001
|
|
|














 Shamlock
Sham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