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강형욱: 동물보호법을 개, 고양이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31]
-
유머
Mbc출신장인수기자김건희 디올백은잊어라 특종예고 ㅋㅋ
[47]
-
유머
동네 잼민이 혼쭐내준 어느 대학생
[44]
-
계층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보세요.
[18]
-
연예
김흥국 유튜브 근황..
[47]
-
계층
폐지 줍줍
[9]
-
계층
폐지 줍줍 추가 (1원)
[8]
-
계층
(ㅎㅂ) 페이커 볼려고 한국 놀러왔던 G컵 코스프레 눈나
[41]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16]
-
연예
나오라는 런닝맨은 안나오고!
[22]
URL 입력
|
2019-02-16 10:45
조회: 2,775
추천: 0
노동자 권리는 없고 ‘백의의 천사’ 헌신만…이젠 병원을 떠납니다 [커버스토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 보건성은 중환자실 간호사 1인이 맡는 환자 수가 2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한국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병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8 보건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6.8명이다. 통계가 작성된 25개국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입원진료 병원 병상 수로는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0개로 일본(13.1개)에 이은 2위였다.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는 부족한 것이다. 결국 간호사는 떠난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7만4990명이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6만4000여명에 그치고, 의원급 및 조산원을 합쳐도 18만여명 수준이다. 자격증 소지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환경은 신입 간호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신규 간호사의 수습기간은 길어야 2개월, 짧으면 2주 만에 끝난다. 교육 여력이 없는 병원은 선배 간호사들에게 교육 부담을 전가한다. 가뜩이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선배 간호사들은 신입 교육이라는 추가 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태움이 시작된다.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선 신입 간호사도 수습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전에 투입돼 한 명의 간호사 몫을 해내길 요구받는다. ‘신규’ 딱지를 벗어나기 전까지 실수에 대한 선배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이는 쉽게 태움으로 변질된다.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다녔던 4년차 간호사 강모씨(26)는 병동의 만년 막내였다. 강씨와 함께 입사한 3명 중 1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선배 간호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실수를 공유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였지만 ‘실수담’ 공유는 밤 12시건, 새벽 4시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신입 간호사는 더 빨리 병원을 떠난다. 병원간호사회의 2016년 자료를 보면 신입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3.9%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이직률에 비해 8배가량 높은 수치다. 병원은 떠난 신입 간호사만큼 새로운 신입을 충원한다. 그리고 태움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태움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력 간호사들 역시 피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다. 5년차 간호사 최모씨(30)는 “나도 간신히 일하고 있는데 신입을 가르치라고 하면 너무 공포스럽다”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고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간호행정학회지에 실린 ‘직장 내 괴롭힘이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총 임상경력 3~5년인 간호사가 가장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에서는 “경력 간호사들에게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간호업무 외에도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는 교육업무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EXP
522,181
(50%)
/ 540,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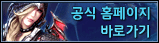
 Laplicdemon
Laplicde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