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막의 장벽,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후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영화가 아닌 게임을 업으로 삼은 사람임에도 그의 수상 소감에 꽤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가 한국 최초로 골든글로브 수상의 쾌거를 이룬 이라는 경외감 때문만은 아니다. 봉 감독의 표현은 당장 게임에 덧붙여도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 없음이 그 이유다.
영화는 글이나 장면,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합장르다. 극의 기저에는 창작자의 삶이 묻어난다. 극을 바라보는 이는 여기에 공감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을 쉬이 따를 수 있다.
물론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은 전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이해가 없다면 극이 가진 깊은 풍미는 그저 어떤 냄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막의 장벽'은 단순히 언어적 한계를 넘는 일련의 이해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임도 때론 장벽을 가진다. '디스코 엘리시움'도 그 중 하나다. 에스토니아 개발사 ZA/UM이 개발한 게임은 지난해 인디의 한계를 넘는 만듦새로 평단의 호평을 이끌었다. 타임지는 2010년대 최고의 게임 10선에 이 게임을 올렸다. 16년이라는 세월을 다듬고 가꿔온 게임은 하루아침에 한국어로 치환할 수 없는 방대한 분량과 깊이를 가졌다.
그렇기에 '디스코 엘리시움'은 누군가에겐 이른바 '갓겜'이다. 하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아니, 현란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내 게이머에게 이 게임은 그저 남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외국의 것 중 하나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게임이라는 매체는 단순히 이야기를 체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유저는 때때로 세상의 한 부분이 된다. 자신을 캐릭터 일부에 이입하고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그렇기에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게임에서 영화가 가진 1인치 장벽은 10인치, 혹은 100인치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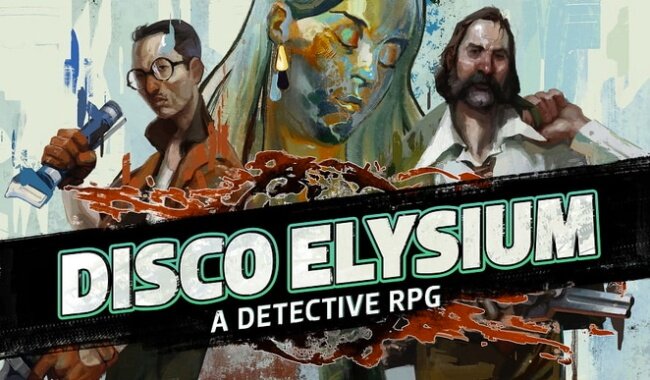
'기생충'은 그런 장벽을 골든글로브 수상과 함께 깼다. 혹자는 극의 핵심 주제인 빈부격차를 말한다. 이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의 함의가 서구권이 오래도록 가졌던 문제의식과 같았기에 수상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기생충'의 독특한 풍자와 해학을 꼽는다. 자막이 달린 영화를 예술 영화로만 치부하는 서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는 거다.
해석은 분분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기생충'에는 장벽을 깨부순 영화만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게임에도 이런 장벽을 깬 사례, 그리고 그 모두에게 통하는 가치가 있다. 멋진 스토리, 화려한 그래픽, 짜임새 있는 구성, 꼼꼼한 디테일, 손을 뗄 수 없는 몰입감. 어쩌면 이 모든 게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가 특출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게임판 '자막의 장벽'을 넘는 힘에는 재미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갓 오브 워'와 '레드 데드 리뎀션2'는 극에 다다른 스토리텔링으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2018년 올해의 게임 수상을 크게 양분했다. 하지만 또렷한 이야기 줄기가 없는 '포트나이트'나 '테트리스 이펙트'도 올해의 게임을 받았다. '언차티드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이 시리즈를 종결짓는 훌륭한 이야기와 디테일로 비평가와 팬들의 호평을 자아낸 해에는 때리고 부수고 터트리는 호쾌함의 대명사, '둠'도 최고의 게임으로 꼽혔다.
2017년에는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자본이 들어간 '길드워2' 이후 2번째로 해외 언론으로부터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됐다. 배틀 로얄 장르의 대중화를 선도한 배틀그라운드의 수상은 판에 찍어내는 판형물 대신 잘 짜인 게임의 재미로 얻어낸 성과다. 더불어 국산 게임에도 언어와 문화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장벽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 3년이 지났다. 다양한 장르가 분포한 전 세계 매출 순위에서는 그 존재를 찾기 어려운 모바일 MMORPG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듯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배틀그라운드가 마치 별종이었다는 양 게임 업계를 때리기도 한다. 장르 독식, 안전 지향, 무작위성에 기대한 매출 모델까지.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표적도 가지가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살짝 얼굴을 내민다. 소규모 개발사와 인디 게임 등 풀뿌리 개발자들의 작품이 모바일, PC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세계에 선뵈고 있다. '펭귄의 섬'은 국내외 모바일 마켓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 '던그리드'나 '리틀 데빌 인사이드' 등 출시, 그린라이트 단계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예도 있다. 펄어비스나 라인게임즈 등 중견-중소 개발사는 PC, 콘솔 게임으로 시장 문을 두드리고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인디 게임을 주목하는 퍼블리셔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사업적인 전략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산(工産) 게임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더 어울릴 수 있는 게임들 말이다.
실은, 봉 감독의 수상 소감은 뒤가 더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라고. 이는 흔히 골든글로브의 작품 규정을 꼬집은 내용으로 본다. 극의 대사가 50% 이상 영어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없다는 차별적 규정에 대한 지적 쯤.
하지만 해석이야 듣는 이의 마음이니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 보자.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만큼 잘하면 '자막의 장벽'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라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직접 말했다고. 게임도 비슷하다. 배틀그라운드가 가능성을 입증했든 게임 본연의 재미만 통한다면 얼마든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착화된 시장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터. 하지만 실망감에 눈을 돌려선 안 된다. 작지만, 큰 잠재력과 희망을 담아 만들어지는 게임들을 응원하고 바라봐준다면 어떨까? 언젠가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게임어워드 올해의 게임 수상작으로 국산 게임의 이름이 불리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