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유머
나이들면 생기는 습관
[37]
-
계층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보세요.
[32]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32]
-
계층
전세사기 당하면 자살하는 이유
[41]
-
연예
블라인드에서 추정한 민희진 쿠데타 계획
[51]
-
연예
블라인드에서 핫한 어느 증권맨의 민희진 분석 글
[58]
-
계층
영국남자 컨텐츠 근황
[52]
-
감동
외국인 관광객의 800만원 찾아준 버스기사.
[13]
-
유머
소리 On) 국힙 원탑 미니 진 신곡 개저씨 발표
[35]
URL 입력
- 유머 민희진 기자회견 일본 반응 [20]
- 이슈 민희진 사장 글쓴거 사죄의 뜻으로 글올림 [29]
- 기타 신입공무원 발령후 모습 [24]
- 연예 하이브 사태 누가 승리자 일거 같나요? [54]
- 이슈 민희진 기자회견에서 알게 된 점 [41]
- 계층 늦어도 20대에 '꼭' 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26]
|
2021-09-27 00:28
조회: 18,784
추천: 0
ㅎㅂ)너와 헤어진지 수개월이 지났어 .. 보고 싶다. 엄청 많이 보고 싶어. 벌써 너와 헤어진지 수개월이 지났어. 네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현재의 너에 대해 알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딱 하나, 지금의 넌 나를 만나던 그때의 시간보다 더 행복할 거 같아. 우리 참 어려웠잖아. 많이 힘들었잖아.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모르는 척 연기했잖아.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라서 이별이 너무 아플 거라는 생각에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손 놓치 못하고 있었잖아. 사실 나는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너보다 훨씬 빨리 알아챘어. 우리의 관계가 변한 시점부터 틈틈히 시간만 나면 하던 우리의 통화가, 잠 못 드는 새벽엔 밤새 끊이지 않던 우리의 통화가 어느 순간 30분을 넘기지 못 하고, 언젠가부턴 아예 하지 않게 되었지, 서로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던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있는지를 궁금해 하지 않기 시작했지. 그렇게 우린 연애같지 않은 연애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어. 담담하게 헤어지자는 너의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힘들고 속상한 마음보단 후련한 마음이 컸어.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네가 예뻐 보이지 않는데 너에게 예쁘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많이 후련하더라.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한 달이 흘러도 너와의 이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나 요즘 네가 많이 보고 싶어. 연애 초기의 우리처럼 돌아가고 싶어. 길에서 횡단보도를 보면 키가 작아서 손을 들어야 한다며 손을 들고 작은 보폭으로 귀엽게 건너던 네가 생각나고, 떡볶이 집을 지나가면 매운 것도 못 먹으면서 떡볶이를 먹겠다고 떼 쓰곤 결국 물 배를 채우던 네가 생각나. 우연히 건대 앞을 지나갈 때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 날이 떠오르고, 베라를 지날 때면 초코가 좋다며 항상 엄마는 외계인만 시키던 네가 생각나. 어떡하지. 오늘 밤도 너를 떠올리다 잠들지 못 할 거 같아. 지금 네게 내가 돌아간다면 네가 힘들 거 같아서 조금 걱정 돼.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떠올라서, 네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게 될 거 같아서 글 남기는 거야. 오늘 밤은 네 생각하지 않고 자고 싶다. 내가 많이 미안하고 사랑해. 꿈에서도 만나지 말자. 안녕. 페이스북 - 색과채/익명 제보
EXP
72,268
(5%)
/ 77,001
인벤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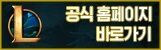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새까만닭
새까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