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아파트 사전점검 서비스에 건설업체들 불만
[35]
-
계층
치트키 다 때려박았던 드래곤볼 에피소드
[30]
-
계층
백종원이 세팅하고 간 이번 춘향제 야시장
[25]
-
유머
아빠의 직업을 몰랐던 아들
[22]
-
연예
아이브 레이, 르세라핌 은채
[16]
-
연예
브브걸 근황
[8]
-
계층
17살 여고딩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원장 선생.
[27]
-
연예
오늘자 끈 원피스 아이유
[12]
-
유머
일 못하는데 3년을 안 짤린 알바생
[28]
-
연예
백지헌 레전드 (프로미스_9)
[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16-06-27 16:31
조회: 11,533
추천: 0
혹한기 군대 이야기. 2011년 1월의 막바지에 이루어진 혹한기 훈련은 내 군생활 첫 혹한기 훈련이었다. 10년 10월 5일에 입대한 따끈따끈 하다못해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않은 기간이라 간부들은 물론, 병사들 마저도 다들 긴장해 있는 모습이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될지 가늠케 해준다. 당시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사실 혹한기 훈련이 취소 될 번 했으나, 요망한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기대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즐거운 마냥, 부대 앞의 그리 작지도, 크지도 않은 산속에서 훈련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 야간 숙영을 하는동안 나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바로 옆자리의 선임병의 건빵주머니에서 터져버린 포도쥬스가 본인의 침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텐트 깔게부터 시작해 점점 스며들어가 이윽고 나의 침낭에 까지 침투해 혹한기 숙영 첫 날 부터, 훈련이 종료되는 그 날 까지 나를 절망케 했다. 가뜩이나 아는 것 없는 이등병의 노련함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방한 대책으로는 그 해 가장 추운 날씨의 혹한을 견뎌내기란 힘들었을 것이나, 마치 그것을 비웃는 것 마냥 달달한 포도쥬스의 향은 텐트 안에 만개하여 마치 자신의 나와바리 마냥 포도 본연의 구수한 내음을 자랑하였고, 시원하디 못해 차가운 액체는 1월의 마무리를 짓는 혹한과 함께 어우러져 바스락 거리는 얼음이 되어 우리들의 침낭을 침식하고 있엇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체 훈련을 하게되고 그럼에도 인간취급을 받는 것인지 밥이라고 먹여주려는 것이 , 맛대가리라고는 찾아 볼 수 조차 없는 짬밥 뿐이더라. 맛이라도 있었다면, 먹고 난 후에 후각이 마비 될 성싶은 똥내음을 참아가며 이 혹한에 20대 초반의 탱탱하고도 부드러운 엉덩이를 드러내며 직접 샆질로 만들어낸 화장실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똥숫간에, 뱃속의 설움을 토해내느냐를 고민케 하겠더라만. 길거리 거지들조차 줘도 안먹을 듯한 이런 찌끄레기로는 그런 고민따위 한 순간조차 머릿속에 자리매김 할 수 없었다. 먹지도 않은 짬밥을 처리하고, 손에 묻은 짬 찌그러기들을 닦을 흔하디 흔한 휴지 쪼가리조차 없던 당시의 내가 얼마나 어리바리한 신병 나부랭이인지 이제와서 새삼 생각 해보니 참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 눈물겨움이 눈깔에서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게 해버린 것은, 그 추운 혹한의 이름모를 그 산중턱에서 (이름 안다) 뜨거운 물이라고는 바라지도 않았건만, 설마하니 사람새끼한테 그 날씨에 얼어붙은 물을 퍼다와서 설겆이를 시킬 줄이야 지금의 내가 당시의 상황을 접한다면 아마 행정 보급관은 훈련이 끝나는 날의 태양을 보지 못했으리.. 하지만 , 훈련 마지막날에 이르러서, 나를 잠시나마 함박 웃음을 짓게 만든 것이 있는데. 생전 처음먹어보는 다들 알고 있는 '전투 식량' 이라는 녀석이다. 당시에는 전투식량이라는 녀석의 종류가 꽤나 다양하다는 것을 몰랐지만. 운이 좋게도 당시에 처음 먹었던 전투식량은 나름 준수한 맛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 더욱이 그당시의 나에게는 너무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발열 팩으로 조리하는 신형 식단이었던 것이다. 얼어 붙은 텐트 안에서조차 발열 팩의 뜨거운 온기와 텐트 안을 가득 메운 수증기 조차도 내 얼굴의 함박 웃음을 가리진 못했을 것이다. 그때 만큼 온기라는 녀석이 그렇게나 절실했던 적이 있었을까. 똥숫간에서의 똥내음이건, 궁둥이가 얼어붙건 그 무엇이 올지언정 전투식량을 허겁지겁 처먹던 나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 날의 전투식량은 아직도 기억속에서 최고의 진미로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이 종료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의 떠오르는 태양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며 따스했으며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 괴로웠던 순간이 지나가고 몇 일 뒤에선가, 부대 내에 나름 잘생겻다 쳐줄 수 있을 법한 개새끼 한마리가 살게 되었다. 온 몸이 흰색 털로 되어있고. 나름 이쁨 받던 녀석인지 정리 잘 된 털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보이기 까지 한 녀석은. 어느 날 부터 "맛스타" 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참 히한한 이름이로고, 군대에서 키우는 개새끼니까 이름도 군대 내의 음료수 이름이나 갔다 붙이는 겐가. 고양이라면 모를까, 개인적으로 개는 마음에 들지 않기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목표였던 당시의 나에게는 맛스타라는 이름은 그저 한 순간 얼굴을 주름지게 만드는 웃음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그랬었다. 어쩌다 이녀석이 우리부대 식구가 되었을까. 곱상하게 생긴녀석이 주인이 버릴 만한 잘못을 한 것일까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 대대장이 부대 앞 마을에서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오는길에 맛스타 몇박스를 쥐어주고 받아온 개새끼라더라. 그래서 이름이 맛스타 인게지. 부대 내에 맛스타가 함께 살게 된지 어느덧 보름쯤 지났을까. 취사장을 지날 때 마다 이따금씩 보이는 맛스타녀석이 저기 저 멀리 PX 에서부터 '2와 2분의 1톤' 흔히들 두돈반이라고 불리우는, 덩치만 큰 쇠덩어리 똥차를 타고 오는것이 아닌가. 트럭 뒷자리에 있었다면 '실려' 있다가 맞다. 하지만 실려있는건 왠 중위 나부랭이였고. '타고' 있는건 맛스타가 맞다. 선탑자석에 맛스타가 마치 지자리인듯 도도하게 앉아 있었고 뒤에 짐칸에는 중위 한명이 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 선탑이라고 하더라. 나중에 내가 부사관이 되고서 대위가 된 그 시절의 중위와의 술자리에서 듣기로는 개를 짐칸에 태우니 대대장이 뭐하는 짓이냐고 꾸짖길래 , 운전병과 선탑자석 사이에 중탑을 시켰더니만 그걸 가지고도 지랄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짐칸에 타고 개를 선탑자석에 태웠더니 그제서야 지나가더라는 별 미친놈을 다 봤다나.. 애초에 군수품으로 개를 사온 것을 보아 제정신은 아니었던게지. 내가 일병 나부랭이가 되어 늦게 신병 위로휴가를 나가게 되었는데. 돌아오고나니 감찰이라는 족속들이 부대 내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더라. 그리고는 전병력들을 취사장에 집어넣고 무언가 쪼가리를 나눠주었는데. 거기 적인 글귀가 "대대장이 기르는 개의 이름이 왜 맛스타인지 적으시오" 더라. 웃기는 세상이고 , 누굴향해 비친 웃음인진 이제와서도 모르겠으나 당시의 나는 그 글귀를 보고선 미친듯이 웃었다. 선임병이건 소대장이건 누가 보든 상관있으랴. 내가 웃겠다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우리 대대장은 별 타격없이 대대장 보직을 마무리하고 육본으로 날라갔더라. 군수품 횡령인데 별거 아닌가부다. 우리나라라는 것이 뭐 이런 것이지 이맛헬 이라 하던가. 그리고 5년간의 군생활을 끝내고 전역을 한 지금의 내가 예비군 훈련이란 것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왠 늙은 할아버지가 마빡에 왠 약과 3개를 붙여놓고 나를 부르더라.. 다시만나게 되었다고 뭐 감회가 새롭다거나 세상 좁다거나 이런 풋내나는 느낌은 없고, 훈련 끝나고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나쁜 아저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밥한끼 술 한잔 사주는 아저씨가 뭔 짓을 했건 웃어 넘기는 나도 참 속물인가 보더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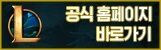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음험
음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