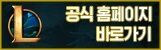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2022-02-03 21:27
мЎ°нҡҢ: 173
추мІң: 6
лӮҳмқҳ к°ҖмҠөкё° мқҙм•јкё° (5) л–ЁлҰ¬лҠ” мҶҗмңјлЎң к°ҖмҠөкё°м—җ л¬јмқ„ лӢҙм•ҳлӢӨ. кјҙкјҙкјҙкјҙ нҺҳнҠёлі‘м—җм„ң к°ҖмҠөкё°лЎң л„ҳм–ҙк°ҖлҠ” л¬јмқ„ ліҙл©° лӮҙмӢ¬ л¬јмқҙ лҳҗ лӢӨмӢң мғҲкё°лҘј л°”лқјлҠ” лӮҳ мһҗмӢ мқҙ ліҙмҳҖлӢӨ. лӮҳм—җкІҗ м•„л¬ҙ мһҳлӘ»мқҙ м—ҶлӢӨ. 분лӘ… кө¬лҸҷ мӢңнӮӨкё° м „ мӮ¬мҡ© м„ӨлӘ…м„ңлҸ„ м°¬м°¬нһҲ мқҪм—Ҳкі , н•ҳм§Җ л§җлқјлҠ”кұҙ м•Ҳн–Ҳмңјл©°, н•ҳлқјлҠ” кІғл§Ң м°©мӢӨнһҲ мӢӨн–үн–ҲлӢӨ. лӮҳлҠ” м•„л¬ҙ мһҳлӘ» м—ҶлӢӨ. л¬јмқ„ лӢӨ л„ЈмқҖмұ„ лӢӨмӢң н”Ңлҹ¬к·ёлҘј кҪӮкі мқҙм мқөмҲҷн•ҙ진 лқ л§Ғ мҶҢлҰ¬лҘј л“Өмңјл©° м „мӣҗ лІ„нҠјмқ„ лҲҢл ҖлӢӨ. лқө~ мҶҢлҰ¬к°Җ лӮҳл©° н•ҳм–Җ м—°кё°к°Җ лҝңм–ҙм ё лӮҳмҳЁлӢӨ. кіјм—° л¬јмқҖ мғҲлҠ”к°Җ. м•ҲмғҢлӢӨ. 5분간 мјңліҙл©° м—°кё°к°Җ нһҳм°ЁкІҢ лҝңм–ҙм ё лӮҳмҳӨлҠ” л°ҳл©ҙ кі„мҶҚн•ҙм„ң л¬јмқҙ мЈјлҘөмЈјлҘө лӮҙ лҲҲл¬јл§ҲлғҘ лӮҳмҳӨлҚҳ л¶Җ분м—җм„ л¬ј н•ң л°©мҡёлҸ„ лӮҳмҳӨм§Җ м•Ҡм•ҳлӢӨ. к·ёлғҘ мң„м—җ л¬јнғұнҒ¬лҘј м–№кё°л§Ң н•ҳл©ҙ мҷ„м „ кІ°н•©лҸј л¬јмқҙ м „нҳҖ нқҗлҘҙм§Җ м•ҠлҠ” кё°мҲ л Ҙмқ„ ліј мҲҳ мһҲм—ҲлӢӨ. мһҳл§Ң лҗҳлҠ” к°ҖмҠөкё°лҘј мҶҗм—җ л¬ём ңмқҳ мҠӨнҺҖм§ҖлҘј л“ мұ„ л©Қн•ҳлӢҲ л°”лқјліҙлҚҳ лӮҳлҠ” м“ём“ёнһҲ мӮ¬мҳЁ лҢҖкұёл ҲлҘј л“Өкі л°©л°”лӢҘм—җ кі мҡ”н•ң нҳёмҲҳмІҳлҹј кі м—¬мһҲлҠ” 4лҰ¬н„°мқҳ л¬јмқ„ м№ҳмҡ°лҹ¬ к°”лӢ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