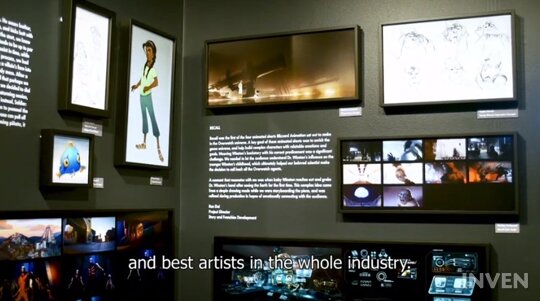블리즈컨 2일차, '드넓은 블리자드 커리어의 세계 탐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현재 블리자드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패널들의 진솔한 회사 생활 이야기가 펼쳐졌다.
세션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무대에 자리한 다섯 명의 패널들이 각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게임 개발자들의 '꿈의 직장', 블리자드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직접 들어본 회사 이야기. 과연 이들은 블리자드의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세션은 먼저, 어바인(Irvine)에 위치한 블리자드 본사에서 패널들이 겪었던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MLG(Major League Gaming) 소속 마샬 슬라즈닉(Marshall Zelaznik)은 블리자드 본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몇 달 동안이나 길을 헤매야 했다고 밝히며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길을 잃어 근처를 지나던 여성분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는데, 결국은 함께 15분 동안이나 더 헤매야 했다"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여성분에게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는지 물어봤는데, 4년 차라고 대답해 길 잃는 게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커뮤니티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테파니 존슨(stephanie johnson)은 블리자드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오버워치 샴페인 축하 파티만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당시 제프 카플란 디렉터가 무대에 올라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를 외치며 황금 물총으로 샴페인을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마찬가지로 오버워치팀의 아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세스 스폴딩(Seth Spaulding) 또한 샴페인 행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블리자드 애니메이션에서 시네마틱 단편 영상 등의 제작을 맡고 있는 스티븐 첸(Steven Chen)은 본사에서 매주 하루 진행되는 '푸드 트럭 러시'를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가 자라온 곳에서는 푸드 트럭이 아주 생소하다. 그래서 항상 푸드 트럭이 회사에 올 때마다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다. 아직도 매주 기다려지는 행사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인사이트 팀의 웨인 피콕(Wayne Peacock)은 블리자드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실물 사이즈의 검과 방패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전했다. 이제 블리자드에 입사한지 10개월이 된 그는 아직도 메인 빌딩에 걸려있는 검을 볼 때면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다녔지만, 블리자드 같은 곳은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자는 블리자드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세스 스폴딩 선임 아트 매니저는 '능동적인 듣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듣기의 반대는 말하기가 아니라 '기다리기'라고 전하며, 블리자드의 개발자들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바로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팀 구성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첸 시네마틱 선임은 같은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강점이라고 꼽았다. 비록 아티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예술적인 능력에 있더라도, 70에서 120명이 함께 작업을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불필요한 파이프라인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블리자드의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세스 스폴딩 선임 아트 매니저는 "어바인에는 크게 다섯 개의 팀이 존재하며, 이들 모두가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큰 문화는 없는 셈"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일반적인 블리자드의 기업 문화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게임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게임업계에 있던 22년 동안 다른 개발사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블리자드 입사 10개월 차를 맞는 웨인 피콕의 경우는 블리자드의 문화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매우 협력적이라고 놀라웠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친근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가장 감명 깊었다고 말한 그는 약 2주 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산불이 났을 때, 뉴스에 보도된 지 30분 만에 6명의 직장 동료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전했다.

어떻게 하다가 블리자드에 입사하게 되었느냐는 질문 또한 이어졌다. 스티븐 첸 시네마틱 선임은 과거 전통 일러스트를 공부하다가, 영화 회사에서 디지털 아트의 전망을 확인하고 몇 년간 더 공부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틈틈이 작업한 작품들을 온라인에 공유하고는 했는데, 블리자드에서 그의 작품을 접하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인터뷰에 응했고, 시네마틱 부서의 모델러로서 그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스티븐 첸 선임은 이어 "블리자드는 주기적으로 아트 공모전을 진행한다.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업물은 다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가 찾아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스테파니 존슨 글로벌 매니저는 2006년 봄 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블리자드에서 GM을 대거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지원을 통해 블리자드에 입사하게 되었다. 블리자드에 입사하기까지 석사과정을 밟는 동안 늘어난 빚 등 경제적인 문제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는 블리자드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회자는 블리자드의 해외 지사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했다.
입사 10개월 차지만 상당히 많은 해외 지사를 방문했다는 웨인 피콕의 경우, "해외 지사라고 해도, 방문하자마자 블리자드라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각 국가별 독특한 특징이 느껴지긴 하지만, 모두가 친근한 것이 딱 '블리자드 친구들'이라는 느낌이라고.
스테파니 존슨 커뮤니티 매니저는 베르사유와 서울에 위치한 해외 지사를 방문한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그는 먼저 베르사유 지사에 대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때때로 언어의 장벽에 부딪치는 모습도 보였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또 멋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에 위치한 블리자드 코리아에 방문한 소감으로 그는 "이런 친절함은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전하며, "그저 블리자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방문한 것인데도 마치 가족처럼 대해줬던 것 같다. 아시아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 언어나, 음식점을 찾는 등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모두들 내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해주길 바라듯 열정적이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