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ҳӨн”Ҳ мқҙмҠҲ к°Өлҹ¬лҰ¬ к°ҷмқҙ ліҙкі мӢ¶мқҖ мң лЁё кёҖмқҙлӮҳ мқҙлҜём§ҖлҘј мҳ¬л Өліҙм„ёмҡ”!
URL мһ…л Ҙ
-
мң лЁё
лӢӨмқҙм•„лӘ¬л“ң м—…кі„ мҙҲ비мғҒ
[81]
-
кі„мёө
нҸҗм§Җ мӨҚмӨҚ
[3]
-
кі„мёө
мһ”мқён•ң м§Ҳлі‘
[29]
-
к°җлҸҷ
м•„мқҙл“Ө нҢ”м—җ л¬ёмӢ мқ„ мғҲкёҙ м•„лІ„м§Җ
[30]
-
м—°мҳҲ
нҺҢ) мҷҖмқҙн”„н•ңн…Ң м „лӮЁм№ң м–ҳкё° л“Јкі л№Ўм№ң нҳ•м•„.
[58]
-
м—°мҳҲ
л°°мҡ° лҘҳмҲҳмҳҒ к·јнҷ©
[15]
-
м—°мҳҲ
лӘ№мӢң мҳҲмҒң мҳӨлҠҳмһҗ м•„мқҙмң мқёмҠӨнғҖ
[12]
-
кі„мёө
к№Җм–ҙмӨҖ лҜјнқ¬м§„ м–өмҡён• мҲҳмһҲлӢӨ н•ҳм§Җл§Ң...
[114]
-
м—°мҳҲ
лҜёлӮҳ
[5]
-
мң лЁё
мӮјлҘҳ м„ұмқё мӮ¬мқҙнҠё к°ҷл„Ө
[12]
URL мһ…л Ҙ
- кё°нғҖ 씬лҸ„мҡ° н”јмһҗк°Җ мқјл°ҳ н”јмһҗліҙлӢӨ лҚ” 비мӢј мқҙмң [10]
- кё°нғҖ м»Өн”ј нҺён•ҳкІҢ л“Өкі лӢӨлӢҲлҠ” л°©лІ• [4]
- кІҢмһ„ дёӯлҸ„ л°©м№ҳлЎң лғҘнһҗл§Ғ, 'кі м–‘мқҙмҷҖ мҠӨн”„' мӨ‘көӯ м •мӢқ м¶ңмӢң [3]
- мқҙмҠҲ "лҸ…лҸ„лҠ” 분мҹҒм§Җм—ӯмқҙ м•„лӢҲлӢӨ" лӮҙл¶Җ л¬ём ңм ңкё° мһҲм—ҲлҠ”лҚ° 'л¬өмӮҙ' [6]
- м—°мҳҲ н•ҳлЈЁ н•ңлІҲ к°•мҠ¬кё°м”Ё [3]
- кё°нғҖ мғҲлҒјкі м–‘мқҙ кө¬м¶ң кҙҖл Ё [4]
|
2020-10-31 13:16
мЎ°нҡҢ: 3,326
추мІң: 0
лӮҳлқјмқҳ мҡҙлӘ…мқҖ лҢҖнҶөл №м—җкІҢ лӢ¬л ӨмһҲм§Җл§Ң лҢҖнҶөл №мқ„ лҪ‘лҠ” кІғмқҖ мҡ°лҰ¬мқҳ лӘ«мқҙ лҗ кІғмһ…лӢҲлӢӨк№Җл‘җн•ң к°ҷмқҖ к№ЎнҢЁл“Өмқҙ м„Өм№ҳкі , лЁ№кі мӮҙкё° мң„н•ҙ мһҗм „кұ°лҘј нӣ”міҗм•ј н• л§ҢнҒј к·ёлҹ° кІғм—җ лҢҖн•ҙ мҳікі к·ёлҰ„мЎ°м°Ё нҢҗлӢЁн•ҳм§Җ лӘ»н• м •лҸ„лЎң көҗмңЎмқҙлһ„ кІҢ м—Ҷм—ҲлҚҳ мқјм ңк°•м җкё°м—җ нғңм–ҙлӮң 분л“Өмқҙ кіјм—° л¬ҙм—Үмқ„ л°°мҡё мҲҳ мһҲм—Ҳмқ„к№Ңмҡ”? кІҢлӢӨк°Җ кҙ‘ліөмқҙ лҗңм§Җ м–јл§Ҳ лҗҳм§Җ м•Ҡм•„ н•ңкөӯм „мҹҒк№Ңм§Җ н„°м ёлІ„л ёмңјлӢҲ к·ёмӢңлҢҖм—җ нғңм–ҙлӮң 분л“Ө мӨ‘м—җ н•ңкёҖмқҙлқјлҸ„ л°°мҡҙ 분л“Өмқҙ мһҲлӢӨл©ҙ м •л§җ мҡҙмқҙ мўӢмқҖ 분л“Өмқҙ м•„лӢҲм—ҲлӮҳ к·ёлҹ° мғқк°Ғмқҙ л“ӯлӢҲлӢӨ. н•ҳл¬јл©° мҡ”мҰҳ м„ёмғҒм—җлҸ„ мһҗмӢқмқ„ лІ„лҰ¬лҠ” л¶ҖлӘЁк°Җ мһҲлҠ”лҚ° к·ёкІҢ лЁ№кі мӮҙкё° нһҳл“ В м „мҹҒм§Ғнӣ„лқјл©ҙ мһҗмӢқмқ„ лІ„лҰ¬лҠ” кІҢВ м–ҙл Өмҡҙ мқјлҸ„ м•„лӢҲм—Ҳмқ„ кІҒлӢҲлӢӨ. мҡ”мҰҳ м„ёмғҒм—җ лҶҖмқҙл°©м—җм„ң ліҙмңЎкөҗмӮ¬м—җкІҢ н•ҷлҢҖлҘј л°ӣм•„ к·ёлҹ° лҶҖмқҙл°©м—җ 맡겨진 м•„мқҙл“Өмқҙ л©Қмқҙ л“ лӢӨкұ°лӮҳ н•ҳлҠ” мқјмқҙ лІҢм–ҙм§Җкі мһҲл“Ҝмқҙ м ң лӘём—җлҠ” м ңк°Җ кё°м–өн•ҳм§Җ лӘ»н•ҳлҠ” м–ҙлҰ°мӢңм Ҳм—җ мғқкёҙ нқүн„°к°Җ лӘҮ к°ң мһҲмҠөлӢҲлӢӨ. к·ёкІғмқҙ м–ҙлЁёлӢҲлЎңл¶Җн„° л°ӣмқҖ н•ҷлҢҖмқём§Җ м•„лӢҲл©ҙ н• лЁёлӢҲк°Җ мһ¬нҳјмқ„ н•ҙм„ң лӮҳмқҖ л”ёмқҙ м–ҙлҰ°В м ҖлҘј лҸҢліҙл©ҙм„ң к·ёл”ёмқҙлқјлҠ” мӮ¬лһҢлҸ„ л°°мҡҙ кІҢ м—Ҷм–ҙ к·ёлғҘ лҜёмӣҢм„ң м ҖлҘјВ кҙҙлЎӯнһҢ кІғмқём§Җ м–ҙлЁёлӢҲлҸ„ лҸҢм•„к°ҖмӢ л§ҲлӢ№м—җ м ңк°Җ л¬јм–ҙліј мӮ¬лһҢмқҖ м—ҶмҠөлӢҲлӢӨ. к·ём Җ м ңк°Җ кө¶м–ҙмЈҪм§Җ м•Ҡкі лҳҗ лҲ„кө°к°Җмқҳ кі мқҳл“ м•„лӢҲл“ мӮ¬кі лЎң мЈҪм§Җ м•ҠмқҖ кІғмқ„ лӢӨн–үмңјлЎң м—¬кёёлҝҗмһ…лӢҲлӢӨ. мҢҚл‘Ҙмқҙмқё м ңк°Җ нғңм–ҙлӮҳмһҗ лЁ№кі мӮҙкё°лҸ„ нһҳл“ лҚ° мҢҚл‘ҘмқҙлҘј лӮім•ҳлӢӨл©° м–ҙлЁёлӢҲк°Җ н• лЁёлӢҲм—җкІҢ кө¬л°•мқ„ л°ӣм•ҳлӢӨлҚ”кө°мҡ”. л¬ҙм—ҮліҙлӢӨ, лЁ№кі мӮҙкё° нһҳл“Өм–ҙ мқҙлҜё, к°“лӮңм•„мқҙмҳҖлҚҳВ м Җмқҳ мҢҚл‘ҘмқҙлҸҷмғқмқҖ м–‘мһҗлЎңВ м№ңмІҷ집м—җ ліҙлӮҙ진 нӣ„мҳҖкі лӘҮ л…„ л’ӨВ м Җ м—ӯмӢңлҸ„ мҷёк°ҖлҢҒм—җ м–‘мһҗлЎң ліҙлғҲлӢӨк°Җ м ңк°Җ 그분л“Өмқ„ м—„л§ҲлӮҳ м•„л№ к°Җ м•„лӢҢ мҷёмҲҷлӘЁмҷҖ мҷёмӮјмҙҢмңјлЎңВ л¶ҖлҘёлӢӨл©° лӮЁл“ӨВ ліҙкё°к°Җ м°Ҫн”јн•ҙ лӢӨмӢң 집мңјлЎңВ лҸҢл ӨліҙлӮҙ진 мғҒнҷ©м—җм„ң лҮҢм„ұл§Ҳ비мһҘм• лҘј к°Җм§Җкі мһҲлҚҳ нҳ•кіј м ҖлҘј мҙҲк°Җ집м—җ мһ¬мӣҢлҶ“кі к·ёлҹ° мҙҲк°Җ집м—җ м „кё°лҸ„ л“Өм–ҙмҳӨм§Җ м•Ҡм•„ мҙӣл¶Ҳмқ„ мјңлҶ“кі л¶ҖлӘЁлӢҳмқҙ 집мқ„ 비мҡҙВ мӮ¬мқҙ мҙӣл¶Ҳмқҙ м“°лҹ¬м ё 집м—җ л¶Ҳмқҙ лӮ¬лҠ”лҚ°В лӢӨн–үнһҲ мһ м—җм„ңВ к№Ём–ҙВ м ңк°Җ нҳ•мқҳ нҢ”мқ„ мһЎм•„лҒҢл©°В нҳ•мқ„ кө¬н•ҳл ӨлӢӨк°Җ л¬ён„ұмқҙ лҶ’м•„м„ң нһҳм—җ л¶Җміҗ нҳ•мқ„ кө¬н•ҳм§Җ лӘ»н•ҳкі м Җл§Ң л¶Ҳкёё мҶҚм—җм„ң к°„мӢ нһҲ л№ м ёлӮҳмҷ”лӢӨлҠ” мқҙм•јкё°лҘј лӮҳмӨ‘м—җм•ј м–ҙлЁёлӢҲм—җкІҢ л“ЈкІҢ лҗҳм—Ҳмңјл©° м Җ м—ӯмӢңлҸ„ м–ҙл ҙн’Ӣмқҙ кё°м–өмқҙ лӮ©лӢҲлӢӨ. м ңк°Җ м—¬кё°м„ң л“ңлҠ” мқҳл¬ёмқҙ мһҲлҠ”лҚ°В мһҘм• к°Җ мһҲлҠ” мһҗмӢқкіј м–ҙлҰ° м ҖлҘј 집м—җ лӮЁкІЁВ л‘җкі м–ҙл–»кІҢ л¶ҖлӘЁлӢҳмқҙ лӘЁл‘җ 집мқ„ 비мҡё мҲҳк°Җ мһҲлҠ” кІғмқём§Җ кІҢлӢӨк°Җ мҙӣл¶Ҳмқ„ мҷң мјңлҶ“кі лӮҳк°”мқ„к№Ңмҡ”? мқҙкІғмқҙ кі мқҳлЎң нҷ”мһ¬лҘј мқҳлҸ„н•ң кІғмқҖ м•„лӢҗк№Ңмҡ”? мһҘм• к°Җ мһҲлҠ” мһҗмӢқмқ„ лҸҢліёлӢӨлҠ” кІғмқҙ м–јл§ҲлӮҳ нһҳл“ мқјмқҙкІ мҠөлӢҲк№Ң? к·ёлҰ¬кі м ҖлҠ” лҳҗ н•ң лІҲ м–‘мһҗлЎң нҢ”л Өк°”лӢӨк°Җ м•ҪмҶҚмқ„ к№Ёкі к№ҪнҢҗмқ„ м№ҳл“Ҝ л¶ҖлӘЁлӢҳмқҙ м–өм§ҖлЎң лҗҳм°ҫм•„мҳЁ мғҒнҷ©мқҙм—ҲмҠөлӢҲлӢӨ. лӘ» л°°мҡҙ мӮ¬лһҢл“Өмқҙлқјл©ҙ мҡ°лҰ¬к°Җ мғҒмӢқм ҒмңјлЎң мғқк°Ғн• мҲҳ м—ҶлҠ” к·ёлҹ° лІ”мЈ„лҘј 충분нһҲ м Җм§ҖлҘј мҲҳ мһҲлӢӨкі лҙ…лӢҲлӢӨ. мқҙмғҒн•ң мқјмқҖ мқҙлҝҗл§Ңмқҙ м•„лӢҷлӢҲлӢӨ. м•„лІ„м§Җмқҳ к°Җм •нҸӯл Ҙмқҙ мӢ¬н•ҙм„ң м–ҙлЁёлӢҲк°Җ 집мқ„ лӮҳк°„ л’Ө м ҖлҠ” м•„лІ„м§ҖмҷҖ м—¬кё°м Җкё° л– лҸҢл©° мғқнҷңмқ„ н–ҲлҠ”лҚ° м•„лІ„м§Җк°ҖВ мҲ м—җ м·Ён•ҙВ кІҪмҡҙкё°лҘј лӘ°лӢӨк°Җ м „ліөмӮ¬кі к°Җ мқјм–ҙлӮ¬кі кІҪмҡҙкё°м—җ к№”лҰ° м•„лІ„м§ҖлҠ” мқјмқ„ лӘ»н• м •лҸ„лЎң м•„л§Ҳ мӢ¬н•ҳкІҢ лӢӨміӨлҚҳ кІғ к°ҷмҠөлӢҲлӢӨ. нҸүмҶҢм—җлҸ„ мҲ мқ„ мһҗмЈј л“ңмӢңлҚҳ мғҒнҷ©м—җм„ң мқјмқ„ лӘ»н•ҳкІҢ лҗҳм—ҲмңјлӢҲ н•ҳлҠ” мқјмқҙлқјкі лҠ” мҲ мқ„ л§ҲмӢңлҠ” кІғ л°–м—җ м—Ҷм—Ҳмқ„н…Ңкі к·ёл ҮкІҢ м–ҙлЁёлӢҲлҘј м°ҫм•„к°Җлқјл©° м ҖлҘјВ м«“м•„лӮј л§ҢнҒј м ңк°Җ м•„лІ„м§Җм—җкІҢлҠ” м§җмқҙ лҗ мҲҳ л°–м—җ м—Ҷм§Җ м•Ҡм•ҳлӮҳ мӢ¶мҠөлӢҲлӢӨ. н•ң лІҲмқҖ мӮ°кіЁм—җм„ң мӮҙкІҢ лҗҳм—ҲлҠ”лҚ° м•„лІ„м§Җк°Җ лҸ„мӢңм—җ мӮ¬лҠ” н• лЁёлӢҲлҢҒм—җ лӢӨл…ҖмҳЁлӢӨл©° кІЁмҡём—җ лӮңл°©лҸ„ м•ҲлҗҳлҠ” мҷёл”ҙ 집м—җ м ҖлҘј нҷҖлЎңВ лӮЁкІЁл‘” мұ„ 집мқ„ лӮҳк°Җм…ЁмҠөлӢҲлӢӨ. л¬ҙм„ңмҡ°лҰ¬ л§ҢнҒј кі мҡ”н•ң кіім—җм„ңВ мҠӨмӮ°н•ҳкІҢ л¶ҖлҠ” л°”лһҢмҶҢлҰ¬мҷҖ н•ңл°ӨмӨ‘м—җ мӮ°м§җмҠ№мқҙ лҲҲ мҢ“мқёВ 집주ліҖмқ„ мҳӨк°ҖлҠ” л“Ҝн•ң л°ңмһҗмҡұмҶҢлҰ¬лҘј л“Өмңјл©° л°ӨмғҲлҸ„лЎқ 추мң„лҠ” л¬јлЎ В л°°кі н’Ҳкіј л‘җл ӨмӣҖмқ„ кІ¬л””лӢӨ к№ңк№ңн•ңВ м–ҙл‘ мҶҚм—җм„ң м–ҙл–»кІҢ мһ мқҙ л“ кІғ к°ҷмқҖлҚ° м•„м№Ём—җ мһ м—җм„ң к№ЁлӢҲ л©°м№ мқ„ кө¶м—ҲлҠ”м§Җ л°°к°Җ кі нҢҢ кё°мҡҙмқҙ м—Ҷм–ҙ мқјм–ҙлӮҳлҠ” кІғмЎ°м°Ё нһҳл“Өм—ҲмҠөлӢҲлӢӨ. л©°м№ мқ„ кө¶лӢӨк°Җ л°ҳм°¬лҸ„ м—Ҷмқҙ л§Ёл°Ҙм—җ л¬јмқ„ л§җм•„лЁ№лӢӨк°Җ нҶ н•ҳкё°лҸ„ н•ҳкі м•„лІ„м§ҖлҠ” лӮЁмқҳ лӢӯмқ„ нӣ”міҗлӢӨк°Җ м•„к¶Ғмқҙм—җ 집м–ҙл„Јкі кө¬мӣҢлЁ№кё°лҸ„ н• л§ҢнҒј мҳӨмЈҪн•ҳл©ҙ лӮЁмқҳ лӢӯмқ„ нӣ”міҗлӢӨк°Җ м•„к¶Ғмқҙ м•Ҳм—җ, н„ёлҸ„ лҪ‘м§Җ м•Ҡкі мӮҙм•„мһҲлҠ” лӢӯмқ„ 집м–ҙл„Јм–ҙ кө¬мӣҢлЁ№м—ҲкІ мҠөлӢҲк№Ңл§ҲлҠ” к·ёл ҮкІҢ кө¶лҠ” мқјмқҙ л“ңл¬ё мқјмқҖ м•„лӢҲм—ҲкІ м§Җл§Ң ліёлҠҘм ҒмңјлЎң мӮҙм•„м•јкІ лӢӨлҠ” мғқк°Ғм—җ кө¶м–ҙмЈҪмқ„ мҲҳлҸ„ мһҲкІ лӢӨлҠ” м Ҳл°•н•ң мӢ¬м •мңјлЎң 집 м•һм—җ мһҲлҠ” к°ңмҡём—җ к°Җм„ң м–јмқҢмқ„ к№Ёкі мҢҖмқ„ м”»м–ҙ мІҳмқҢмңјлЎң лӮЎмқҖ м „кё°л°ҘмҶҘм—җ л°Ҙмқ„ м§Җм–ҙ лЁ№м—ҲмҠөлӢҲлӢӨ. н•ңкёҖмқҙ мқөмҲҷн•ҳм§Җ м•Ҡмқ„ л§ҢнҒјВ м–ҙлҰ° лӮҳмқҙмҳҖкі л°Ҙмқ„ м§Җмқ„ л•Ң л¬јлҶ’мқҙлҘј мҶҗл“ұм—җ л§һ추л©ҙ лҗңлӢӨлҠ” кІғмқ„ м•„лІ„м§Җк°Җ л°Ҙмқ„ м§Җмқ„ л•Ң м ңк°Җ м–ҙк№Ёл„ҲлЁёлЎң ліҙм•ҳлҚҳ кІғмқём§Җ м ңк°Җ кұ°кё°м„ң кө¶м–ҙмЈҪмқ„ нҢ”мһҗлҠ” м•„лӢҲм—ҲлҚҳ лӘЁм–‘мһ…лӢҲлӢӨ. к·ёлһҳлҸ„ мһҗмӢқмқҙлқјкі лІ„лҰҙ мҲҳлҠ” м—Ҷм—ҲлҚҳ кІғмқём§Җ лӢӨмқҢлӮ лҸҢм•„мҳЁ м•„лІ„м§ҖмҷҖ к·ёнӣ„лЎң лЁёлҰ¬м—җ мқҙк°Җ мғқкёё л§ҢнҒј мӢ л¬ём§ҖмҷҖ л°•мҠӨлҘј лҚ®кі мһҗл©° л…ёмҲҷмһҗмІҳлҹј кұ°лҰ¬лҘј л– лҸҢкІҢ лҗҳм—Ҳкі к·ёлҹ¬лҚҳВ м–ҙлҠҗ лӮ В кі лӘЁм§‘м—җ к°”лҚ”лӢҲ кі лӘЁк°Җ м°ёл№—мңјлЎң мқҙлҘј мһЎм•„мЈјм…ЁлҚҳ кё°м–өмқҙ лӮҳл„Өмҡ”. кі лӘЁл“ӨлҸ„ м–ҙл өкІҢ мӮҙм•ҳлӢӨкі лҠ” н•ҳм§Җл§Ң к·ёлҹ° мЎ°м№ҙлҘј л¬ҙмұ…мһ„н•ң м•„лІ„м§Җм—җкІҢ л°©м№ҳн• л§ҢнҒј мЎ°м№ҙм—җ лҢҖн•ң м• м •мқҙлһ„ кІҢ мһҲм—ҲлҚҳ кІғмқём§Җ к·ёлҰ¬кі н• лЁёлӢҲлқјлҠ” 분мқҙ л”°л“Ҝн•ҳкІҢ м Җмқҳ мҶҗмқ„ мһЎм•„мӨҖлӢӨкұ°лӮҳ н• лЁёлӢҲн’Ҳм—җ м•ҲкІЁліё м Ғмқҙ мһҲлҠ”м§ҖВ м ң кё°м–өм—җлҠ” к·ёлҹ° 추м–өмқҙВ лӮЁм•„мһҲм§Җ м•ҠмҠөлӢҲлӢӨ. л¶ҖлӘЁмқҳ мӮ¬лһ‘мқ„ л°ӣкі мһҗлһҗлӢӨл©ҙ к·ёкІғмқҙ л¶ҖлӘЁлӢҳм—җ мқҳн•ң кІғмқҙл“ м•„лӢҲл“ м ңк°Җ м§ҖкёҲмІҳлҹј м Җм—җкІҢ л§ҺмқҖ л§ҲмқҢмқҳ мғҒмІҳк°Җ мғқкё°м§ҖлҠ” м•Ҡм•ҳмқ„н…җлҚ°, к·ёлҰ¬кі мқҙл Үл“ҜВ мҳӨлһң мӢңк°„мқ„ л°©нҷ©н•ҳлӢӨк°Җ м•„м§ҒлҸ„ к·ёл°©нҷ© мҶҚм—җм„ң мқҙлҹ° мӣҗл§қ м„һмқё кёҖмқ„ м Ғм§ҖлҠ” м•Ҡм•ҳмқ„н…җлҚ° м Җмқҳ мӮ¶мқҖ 비참н–Ҳкі м°ёлӢҙн–Ҳмңјл©° к·ём Җ, к·ёлҹ° мӢңк°„л“Өмқ„ кІ¬л”ң мҲҳ л°–м—җ м—Ҷм—Ҳкі л§Ҳм№ҳ кІЁмҡём—җ к°ңкө¬лҰ¬к°Җ м°Ёк°Җмҡҙ л•… мҶҚм—җм„ң л”°л“Ҝн•ң лҙ„мқ„ кё°лӢӨлҰ¬л“ҜВ м§ҖкёҲлҸ„, м•һмңјлЎңлҸ„ кі„мҶҚ кІ¬лҺҢлӮҙм•ј н• м§Җ лӘЁлҰ…лӢҲлӢӨ, мўӢмқҖ м„ёмғҒмқҙ мҳ¬ л•Ңк№Ңм§Җ. м ҖлҠ” мқҙмһ¬лӘ…лҢҖнҶөл №мқҙ лҢҖн•ңлҜјкөӯм—җ к·ёлҹ° лҙ„мқ„ к°Җм ёлӢӨмӨ„ кІғмқҙл©° мҡ°лҰ¬лӮҳлқјлҘј м§ҖкёҲліҙлӢӨ лҚ” мӮҙкё° мўӢмқҖ кіімңјлЎң л§Ңл“Өм–ҙмӨ„ кІғмқҙлқј лҜҝмҠөлӢҲлӢӨ.
EXP
528,387
(67%)
/ 540,0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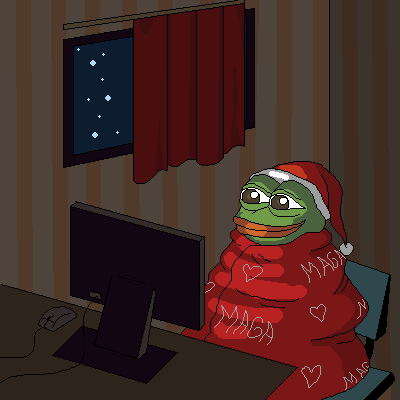
 мқҙмһ¬лӘ…лҢҖнҶөл №
мқҙмһ¬лӘ…лҢҖнҶө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