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11-23 14:18
조회: 1,314
추천: 0
운수 좋은 날(일항 ver.)(중략)
뇌격기는 대공사격중에도 기체를 몰고 항모에 다다랐다. 항모라 해도 물론일항모요 또 풀업 항모도 아니라 앵벌이로 겨우 마련한 스톡 항모인데 한판 하구 격침되면 순양 앵벌이로 겨우 수리비나 내는 터이다. 만일 뇌격기가 주기를 띠지 않았던들 함재기를 상공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靜寂) ― 마치 헬캣 지나간 뒤의 바다와 같은 정적에 날개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연돌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보일러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 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타다닥 하는 그윽한 소리, 먼저 간 전투기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聽覺)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타다닥소리는 선회하는 소리요, 꿀떡꿀떡 하고 연기 올라가는 소리가 없으니 착륙을 못한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뇌격기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함대 상공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맞을 년, 뇌격기가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라고 무전을 친 게 수상하다. 이 무전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뇌격기는 후미에 다달았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추기 ― 떨어진 부포곽 밑에서 나온 기름기 덕지덕지 뭍은 탄약에서 나는 탄내와 화약내 가지각색 함재기가 켜켜이 앉은 폭탄내 승조원의 피 썩은 내가 섞인 추기가 무딘 뇌격기의 공랭식 냉각장치를 찔렀다. 상공에 들어서며 10만 크레딧을 한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죽창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무전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뇌격기가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목울대로 누운 이의 함교에다 대고를 무전기에다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무전기에 돌아오는건 통신병의 답신이 아니고 치익 거리는 불량 신호음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에 타다닥 소리가 쌔애액 소리로 변하였다. 전투기가 잡고있던 조종간을 빼어 놓고 추락한다. 추락한대도 떠오르려고 발악도 않하고 붙여서 떨구어진다는 모양새를 할 뿐이다. 쌔액 소리도 날개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물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플랩도 떨어지고 또 떨어질 기운조차 쇠진한 것 같다. 무전을 해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뇌격기는 항모의 흘수선 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항모의 함교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답신을 해, 답신을! 불이라도 붙었어, 이 오라질 년!” “……” “으응, 이것 봐, 아무 답신이 없네.” “……” “이년아, 굉침했단 말이냐, 왜 답신이 없어.” “……” “으응, 또 답신이 없네. 정말 굉침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탐조등을 알아보자마자, “이 탐조등! 이 탐조등!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였다. 그러자 산 뇌격기의 연료통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항공유가 죽은 항공모함의 뻣뻣한 캐터펄트를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뇌격기는 미친 듯이 제 바퀴를 굉침한 이의 물차오르는 갑판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35노트 어뢰를 쏘아다 맞추어 놓았는데 왜 착함을 못하니, 왜 착함을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뇌격하다 빡쳐서 적어봤습니다. 착함시간 너프는 보너스
EXP
4,390
(97%)
/ 4,401
=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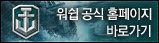
 마약감시단
마약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