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7-30 04:28
мЎ°нҡҢ: 763
추мІң: 0
мҠӨмҪ”м–ҙ м„ұл¶Ҳн•ҳлҠ” мҶҢм„Ө"KT лЎӨмҠӨн„°к°Җ! м—ӯкІҪмқ„ л”ӣкі ! л“ңл””м–ҙ мҡ°мҠ№мқ„~ м°Ём№ҳн•©лӢҲлӢӨ~~~!"
нҸӯмЈҪмқ„ н„°нҠёлҰ¬лҠ” мҠӨнғңн”„лҸ„ нҷ”л“Өм§қ лҶҖлһ„ л§ҢнҒј мҡ°л Ғм°¬ лӘ©мҶҢлҰ¬к°Җ мҡ°мҠ№мқ„ мҷём№ңлӢӨ. л’Өмқҙм–ҙ м№Ём°©н•ң, к·ёлҹ¬лӮҳ м•Ҫк°„мқҖ лІ…м°¬ лӘ©мҶҢлҰ¬к°Җ мһҘлӮҙм—җ нқҳл ҖлӢӨ. "мҳҲ. м •л§җ мӮ¬м—°мқҙ л§ҺмқҖ нҢҖмқҙмЈ . к·ёмӨ‘м—җм„ңлҸ„ мҠӨмҪ”м–ҙ м„ мҲҳлҠ”..." к·ёлҹ¬лӮҳ м•„л¬ҙлһҳлҸ„ л“ӨлҰ¬м§Җк°Җ м•ҠлҠ”лӢӨ. н•ҳлЈЁк°Җ л©ҖлӢӨ кІ©л Өн•ҙмЈјлҚҳ н•ҙм„Ө진과, мһҗмӢ мқҙ мҡ°мҠ№н•ң л“Ҝ н•Ёк»ҳ кё°л»җн•ҙмЈјлҠ” нҢ¬мқҳ лӘ©мҶҢлҰ¬к°Җ мқҙл ҮкІҢлӮҳ л“ӨлҰ¬м§Җ м•ҠлҠ” кІғмқҖ мІҳмқҢ мһҲлҠ” мқјмқҙм—ҲлӢӨ. мҡ°мҠ№ лӢЁмғҒмқҙлқјлҠ” кІғмқҖ мқҙл ҮкІҢлӮҳ л°қкө¬лӮҳ. лӮҳлҠ” к·ём Җ л©Қн•ҳлӢҲ к·ё мғқк°Ғл§Ңмқ„ н–ҲлӢӨ. "лҸҷл№Ҳм•„." лҲ„кө°к°Җ л¶ҖлҘҙлҠ” лӘ©мҶҢлҰ¬к°Җ л“Өл ёлӢӨ. лҸҢм•„ліҙлӢҲ мҠӨл©Ҙмқҙм—ҲлӢӨ. "л№ҡмқҖ к°ҡм•ҳлӢӨ." лҜёмҶҢлҘј м§Җм—ҲлӢӨ. к·ёлҹ¬кі ліҙл©ҙ мқҙ л…Җм„қкіјлҸ„ м°ё л§ҺмқҖ мқјмқҙ мһҲм—ҲлӢӨ. н—ҲлӮҳ м•…мҲҳлҘј л№ҷмһҗн•ҙ мҶҗк°ҖлқҪмқ„ 분м§Ҳлҹ¬лІ„лҰ¬л ӨлҚҳ м°°лӮҳ, лҲ„кө°к°Җк°Җ лӮҙ м–ҙк№ЁлҘј м§ҡм—ҲлӢӨ. "лҸҷл№Ҳ." м•„м•„. л¬ҙмӢ¬мҪ” лҲҲмқ„ к°Җл ёлӢӨ. мҲұн•ң м—ӯкІҪмқ„ м§ҖлӮҳм„ңлҸ„ к·ёмқҳ лҜёмҶҢлҠ” л№ӣмқ„ мһғм§Җ м•Ҡм•ҳлӢӨ. мҡ°мҠ№лӢЁмғҒмқҳ мҠӨнҸ¬нҠёлқјмқҙнҠёлҠ” лҲҲл¶ҖмӢңкІҢ л№ӣлӮ¬лӢӨ. н—ҲлӮҳ к·ё лҜёмҶҢм—җ л№„н• мҲҳлҠ” м—Ҷм—ҲлӢӨ. "кі нҶөм—җм„ң н•ҙл°©лҗҳм—Ҳкө°мҡ”." "мӣҗм„қм•„..." "н•Ёк»ҳ мҠ№лҰ¬мқҳ кё°мҒЁмқ„ лӮҳлҲ„кі мӢ¶м§Җл§Ң, м•„м§ҒлҸ„ мҡ©м„ңн• мӨ‘мғқмқҙ л§Һм•„ лЁјм Җ к°ҖліҙкІ мҠөлӢҲлӢӨ. к·ёлҰ¬кі ..." "к·ёлһҳ. м•Ңкі мһҲм–ҙ." лӮҳлҠ” кі к°ңлҘј лҒ„лҚ•мҳҖлӢӨ. мӣҗм„қмқҙлҠ” мІңмІңнһҲ лҜёмҶҢлҘј м§“кі н•ҳлҠҳлЎң мҠ№мІңн–ҲлӢӨ. "к·ёлҹ°лҚ° к°җлҸ…лӢҳмқҖ м–ҙл”” кі„мӢңм§Җ?" л§ҲнғҖк°Җ л‘җлҰ¬лІҲкұ°л ёлӢӨ. к·ёкІғм—җ м•ҢнҢҢм№ҙк°Җ лҢҖлӢөн•ҳл ӨлҚҳ м°°лӮҳ, н•ңлҸҷм•Ҳ мһҠкі мһҲм—ҲлҚҳ мҡ°л Ғм°¬ лӘ©мҶҢлҰ¬к°Җ мҡ°лҰ¬лҘј к°ҖлҰ¬мј°лӢӨ. "KT м„ мҲҳл“Өм—җкІҢ! лӢӨмӢң н•ң лІҲ нҒ° л°•мҲҳлҘј л¶ҖнғҒл“ңлҰҪлӢҲлӢӨ!" мқҙкІҢ м–ём ң лӮҙ мҶҗм—җ л“Өл ӨмһҲм—Ҳм§Җ? лӮҳлҠ” мҶҗм—җ л“ӨлҰ° м»ӨлӢӨлһҖ мғҒкёҲ н‘ңм§ҖлҘј ліҙкі м“ҙмӣғмқҢмқ„ м§Җм—ҲлӢӨ. мІҳмқҢм—җлҠ” мқҙкІҢ лӘ©м Ғмқҙм—ҲлҚҳ л•ҢлҸ„ мһҲм—ҲлҚҳ кІғ к°ҷмқҖлҚ°. к·ё кё°м–өмқҖ м–ҙлҠҗмғҲ лӮҙ мҶҗмқҳ к°җмҙүкіј н•Ёк»ҳ мһҠнҳҖм ёмһҲм—ҲлӢӨ. "к·ёлҹј мҠӨмҪ”м–ҙ м„ мҲҳ мқён„°л·°лҘј... м–ҙлқј?" "кі лҸҲл№Ҳ?" мЈјліҖм—җм„ң мӣ…м„ұкұ°лҰ¬лҠ” мҶҢлҰ¬к°Җ л“Өл ёлӢӨ. лӮҙ ліҖнҷ”лҘј к°ҖмһҘ лЁјм Җ лҲҲм№ҳмұҲ кІғмқҖ нҳҒк·ңмҳҖлӢӨ. "л¬ҙм“ҙ мқјмһ„мқҙк№Ң? лҸҲл№Ҳмқҳ лӘЁлҜё нһҲлҜён•ҳкІҢ..." "кұұм • л§Ҳ, нҳҒк·ңм•ј." "......." нҳҒк·ңлҠ” лӢӨкёүнһҲ мЈјліҖмқ„ л‘ҳлҹ¬ліҙкі , к·ём ңм„ңм•ј мӣҗм„қмқҙк°Җ м—Ҷм–ҙмЎҢлӢӨлҠ” кІғмқ„ лҲҲм№ҳмұҲ л“Ҝ мҷёміӨлӢӨ. "мқҙ м”№мғҲлҒјм•ј! к°Җм§Җл§Ҳ! мҡ°лҰҙ л– лӮҳм§Җ м•ҠлҠ”лӢӨкі н–Ҳмһ–м•„!" "...нҳҒк·ңм•ј." л§ҲнғҖк°Җ нҳҒк·ңмқҳ м–ҙк№ЁлҘј мһЎм•ҳлӢӨ. к·ё л°”лһҢм—җ нҳҒк·ңлҠ” н—ӣл””лҺҢ л„ҳм–ҙм ёлІ„л ёлӢӨ. н—ҲлӮҳ к·ёлҹ¬л©ҙм„ңлҸ„ лӮҙ л°ңлӘ©мқ„ мһЎмқҖ мҶҗмқҖ лҶ“м§Җ м•Ҡм•ҳлӢӨ. лӢЁм§Җ к·ё мҶҗмқҖ, мқҙлҜё лӮҙ лӘём—җ лӢҝм§Җ м•Ҡм•ҳлӢӨ. нҳҒк·ңлҠ” н—Ҳкіөмқ„ кҪү мҘ” мҶҗмқ„ л¶Җл“Өл¶Җл“Ө л–Ём—ҲлӢӨ. к·ёл ҮкІҢ н•ңм°ёмқ„ мқјм–ҙлӮҳм§Җ м•ҠлӢӨк°Җ, кІ°көӯмқҖ кҙҖмӨ‘ м•һм—җм„ң нқҗлҠҗлҒјлҠ” мҶҢлҰ¬лҘј лӮҙкі м•ј л§җм•ҳлӢӨ. "лӯҗм•ј?" "л¬ҙмҠЁ мқјмқҙм§Җ?" "м—°м¶ңмқёк°Җ?" мӣ…м„ұкұ°лҰ¬лҠ” мҶҢлҰ¬к°Җ л“ӨлҰ°лӢӨ. н•ҳм§Җл§Ң мқҙлҹ° мҷҖмӨ‘м—җлҸ„. "к·ёлҹј, мҠӨмҪ”м–ҙ м„ мҲҳмқҳ, мқён„°л·°к°Җ... мһҲкІ мҠөлӢҲлӢӨ...!" н•ң мӮ¬лһҢл§ҢмқҖ мҡ°л Ғм°¬ лӘ©мҶҢлҰ¬лҘј мһҠм§Җ м•Ҡм•ҳлӢӨ. мқҙлҜё лӢӨ м•Ңкі кі„мӢӨ н…җлҚ°. м°ё лҢҖлӢЁн•ҳмӢ 분мқҙлӢӨ. н•ҳм§Җл§Ң 그분л§Ҳм ҖлҸ„ мў…лһҳлҠ” м•ҲкІҪмқ„ лІ—кі лҲҲл¬јмқ„ н•ң лІҲ нӣ”міҗм•јл§Ң н–ҲлӢӨ. м–ҙлҠҗмғҲ лӮҙк°Җ к·ёл§ҢнҒјмқҳ мЎҙмһ¬к°Җ лҗҳм—ҲлҠ”м§Җ. лҸҢмқҙмјңліҙл©ҙ м°ё м•„л“қн•ң м—¬м •мқёлҚ°, к·ёлҹ¬кі ліҙл©ҙ мқҙкІғмқҙ к·ё мЈјл§Ҳл“ұмқҙлқјлҠ” кІғмқёк°Җ. мқҙмҷҖмӨ‘м—җ нғ‘мқҖ ліҙмқҙм§Җ м•ҠлҠ”лӢӨ. лҢҖлІҢл ҲмғҲлҒј. "к·ёлҸҷм•Ҳ... к°җмӮ¬н–ҲмҠөлӢҲлӢӨ." л¬ҙмҠЁ л§җл¶Җн„° н•ҙм•јн• м§Җ лӘ°лқј мқјлӢЁ к·ёл ҮкІҢ л§җн–ҲлӢӨ. м–ҙм°Ён”ј лӢӨмқҢ н•ҙм—җлҸ„, к·ё лӢӨмқҢ н•ҙм—җлҸ„ мқҙ лӢЁмғҒм—җлҠ” лҲ„кө°к°Җк°Җ мҳ¬лқјмҳ¬ кІғмқҙлӢӨ. EмҠӨнҸ¬мё лҠ” мҳҒмӣҗн•ҳлӢҲк№Ң. лӢЁм§Җ, кұ°кё°м„ң мөңкі мқҳ мһҗлҰ¬м—җ мҳӨлҘё м •кёҖлҹ¬к°Җ мһҲлӢӨлҠ” кІғмқ„. м•һм„ңк°„ мқҙк°Җ мһҲлӢӨлҠ” кІғмқ„. к·ёкІғл§Ң кё°м–өн•ҙмӨҖлӢӨл©ҙ, лӮң м•„л¬ҙлҹ° лҜёл Ё м—Ҷмқҙ мӮ¬лқјм§Ҳ мҲҳ мһҲм—ҲлӢӨ. к·ёлһ¬мқ„ н…җлҚ°... "м •л§җ... к°җмӮ¬н–ҲмҠөлӢҲлӢӨ...! нҢ¬ м—¬лҹ¬л¶„...!" лҲҲл¬јмһҗкөӯмқ„ лӮЁкё°кі мӢ¶м§Җ м•Ҡм•ҳлҠ”лҚ°, кІ°көӯ лӮҳлҠ” мӣҗм„қмқҙмІҳлҹј лҗҳм§ҖлҠ” лӘ»н–ҲлӢӨ. нҳҒк·ңмқҳ мҡёл¶Җм§–лҠ” лӘ©мҶҢлҰ¬лҸ„ мқҙм л„Ҳл¬ҙлӮҳ л©ҖлҰ¬ л“ӨлҰ°лӢӨ. KT. к·ё мқҙлҰ„ м•„лһҳ л•ҖнқҳлҰ° кІғлҸ„ м–ҙм–ё 5л…„. Score. лӮҳлҠ” м—¬кё°. мҠ№лҰ¬мқҳ мһҗлҰ¬м—җ мһҲм—ҲлӢӨ. "кІ°көӯ... лӮҳлЎңм„ л§үмқ„ мҲҳ м—Ҷм—ҲлӢӨ." кёҲм—°кө¬м—ӯмқј н„°мқё лӢЁмғҒ л’ӨнҺё, м“ём“ён•ң лӢҙл°°м—°кё°к°Җ н”јм–ҙмҳӨлҘёлӢӨ. лӘ…мһҘмқҙлқјкі л¶ҲлҰ¬лҠ” к·ёлҠ”, л№ӣлӮҳлҠ” мҳҒкҙ‘мқҳ мһҗлҰ¬м—җ н•Ёк»ҳн•ҳм§Җ м•Ҡм•ҳлӢӨ. "к·ёлҝҗмқё мқҙм•јкё°лӢӨ." мҠӨмҠӨлЎңлҘј нғҖмқҙлҘҙлҠ” л“Ҝн•ң к·ё лӘ©мҶҢлҰ¬лҠ” л„Ҳл¬ҙлӮҳлҸ„ мһ‘м•ҳлӢӨ. лӢҙлұғмһ¬лҘј н„ёкі , к·ёлҠ” мІңмІңнһҲ кІҪкё°мһҘмқ„ л’ӨлЎңн–ҲлӢӨ.
EXP
7,029
(53%)
/ 7,4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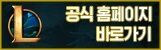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м”ЁмҜ”
м”Ём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