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2-11 18:33
ž°įŪöĆ: 1,513
ž∂Ēž≤ú: 31
žė§ŽäėžĚė žĚīžēľÍłį ž∂Ēžöī Í≤®žöłŽā† žĖīŽäź Ūēú ŪĆźžěźžīĆ žāľŪėēž†úÍįÄ žĻľŽįĒŽěƞ̥ ŽßěžúľŽ©į žė§Žď§žė§Žď§ ŽĖ®Í≥†žěąžóąŽč§. "Ūėē žóĄŽßąŽäĒ žė§ŽäėŽŹĄ žēąžė§ŽäĒÍĪįžēľ?" ŽĎėžßłŽäĒ ŽĖ†ŽāėÍįĄ žóĄŽßąŽ•ľ Í∑łŽ¶¨žõĆŪēėŽ©į ŪėēžóźÍ≤Ć Ž¨ľžóąŽč§. ŽßČŽāīŽ•ľ ŽďĪžóź žóÖžĚÄžĪĄ žāīŽ¶ľžĚĄ Í峎†§ŽāėÍįÄŽ†§ Ž∂ÄžóÖžúľŽ°ú ž†ĄÍłįžĄ†žĚĄ ŽßĆžßÄŽćė ž≤ęžßłŽäĒ ŽĎėžßłžóźÍ≤Ć ŽčĶŪēīž£ľÍłł "žė§ŽäėžĚÄ žĚīŽĮł Žä¶žóąžúľŽčą žė§žčúÍłį ŪěėŽď§Í≤†žßÄŽßĆ ŽāīžĚľžĚÄ Íľ≠ žė§žč§ÍĪįžēľ" "ÍĪįžßďŽßź! žĖīž†úŽŹĄ ŽėĎÍįôžĚī ŽßźŪēīŽÜďÍ≥†! ŪėēžĚÄ ÍĪįžßďŽßźžüĀžĚīžēľ!!" žöłŽ®ĻžĚīŽäĒ Ž™©žÜĆŽ¶¨Ž°ú žÜĆŽ¶¨žĻėŽ©į ŽĎėžßłÍįÄ Ž∂ąŪėĄŽďĮ žßĎŽįĖžúľŽ°ú Žõįž≥źŽāėÍįĒŽč§. "ŽĎź..ŽĎėžßłžēľ!" Žč§ÍłČŪěą ŽĎėžßłŽ•ľ Ž∂ąŽü¨Žī§žßÄŽßĆ ŽĎėžßłŽäĒ žĚīŽĮł žßĎŽįĖžúľŽ°ú Žõįž≥źŽāėÍįĄŽí§žėÄŽč§. žēĄŽ≤ĄžßÄŽäĒ žö©žó≠žĚľžĚĄ ŪēėžčúŽč§ žā¨Í≥†Ž•ľŽčĻŪēėžÖĒ Ž≥Ďžõźžóź žěÖžõźŪēú ŪõĄŽ°ú žóĄŽßąŽäĒ žāľŪėēž†úŽ•ľ Ž≤ĄŽ¶¨Í≥† ÍįÄž∂úŪēúžßÄ žė§ŽěėžėÄŽč§. Í∑łŽüįÍĪł ŽĎėžßłžóźÍ≤ź žě†žčú ŽāėÍįĄÍĪįŽĚľ ŽßźŪĖąžóąžßÄŽßĆ, žčúÍįĄžĚī žßÄŽā†žąėŽ°Ě ŽĎėžßłŽŹĄ žóĄŽßąÍįÄ žěźÍłįŽď§žĚĄ Ž≤ĄŽ¶įÍĪįŽěÄÍĪł ŽąąžĻėžĪĄÍłį žčúžěĎŪēú Ž™®žĖĎžĚīžėÄŽč§. ž≤ęžßłŽäĒ žěźÍłį ŽďĪžóźžóÖŪěĆžĪĄ žěźÍ≥†žěąŽäĒ ŽßČŽāīÍįÄ ÍĻ®žßĄžēäžēėŽāė ž°įžč¨žä§Žěė žāīŪĒľÍ≥†, ŽĎėžßłŽ•ľ žęďžúľŽü¨ ŽįĖžúľŽ°ú ŽāėÍįĄŽč§. "ŪõĆž©ćŪõĆž©ć...žóĄŽßą... ž†ēŽßźŽ°ú žöįŽ¶¨Žď§ Ž≤ĄŽ¶įÍĪįžēľ? ŪĚĎŪĚĎ..." ŽŹôŽĄ§ ÍĶīŽč§Ž¶¨žēĄŽěėžóźžĄú žöłŽ©į ŪõĆž©ćžĚīŽäĒ ŽĎėžßł žóĄŽßąÍįÄ ŽĮłžõ†Žč§, ÍįÄŽāúžĚī ŽĮłžõ†Žč§, žĄłžÉĀžĚī ŽĮłžõ†Žč§ žĄúŽüĹÍ≥† žä¨ŪĒą ŽßąžĚĆžĚÄ ž∂Ēžöī Í≤®žöłŽįĒŽěĆŽ≥īŽč§ŽŹĄ žčúŽ¶ĹÍ≤Ć ŽäźÍĽīž°ĆŽč§. "...žßłžēľ!!" Ž∂ąŪėĄŽďĮ ŽąĄÍĶįÍįÄžĚė Ž™©žÜĆŽ¶¨ÍįÄ Žď§Ž†§žė§ŽäĒŽďĮŪēī ŽĖ®Í∂úŽćė Í≥†ÍįúŽ•ľ Žď§žóąŽč§. "ŽĎėžßłžēľ!!!! žĖīŽĒ®Žčą!" ÍįĎžěźÍłį Žõįž≥źŽāėžė® žěźžč†žĚĄ žęďžēĄžė® ŪėēžĚė Ž™©žÜĆŽ¶¨Žč§. Ž™©žÜĆŽ¶¨žóźžĄ† Žč§ÍłČŪē®žĚī ŽäźÍĽīž°ĆžßÄŽßĆ, Í∑łŽěėŽŹĄ ŽāėÍįÄÍłį žčęžóąŽćė ŽĎėžßłžėÄŽč§. ŪõĆž©ćžĚīŽ©į ŽąąŽ¨ľŽ≤ĒŽ≤ÖžĚė žĖľÍĶīžĚĄ Ž≥īžĚīÍłįŽŹĄ žčęžóąžúľŽ©į Í∑łŽüįžßĎžóź ŽŹĆžēĄÍįÄÍ≥† žč∂žĚÄ ÍłįŽ∂ĄŽŹĄ žēĄŽčąžėÄŽč§. žĖľŽßą žßÄŽāėžßÄžēäžēĄ ŪėēžĚė Ž™©žÜĆŽ¶¨ŽŹĄ ž†źž†ź žěĎžēĄž†ł Í≤įÍĶ≠ Í≤®žöłŽį§žÜćžóź Ž¨ĽŪėĎ吏ĖīÍįĒŽč§. ŽĎėžßłŽäĒ Žď§žóąŽćė Í≥†ÍįúŽ•ľ Žč§žčú ŽĀĆžĖīžēąžĚÄ Ž¨īŽ¶éžóź Ž¨ĽÍ≥† ŽąąžĚĄÍįźžēėŽč§. ŽĎźžčúÍįĄžĮ§ žßÄŽā¨žĚĄÍĻĆ žě†žĚīŽď† ŽĎėžßłŽ•ľ ŽąĄÍĶįÍįÄ ŪĚĒŽď§žĖī ÍĻ®žöįÍłį žčúžěĎŪĖąŽč§. žĚīŽüįÍ≥≥žóź žěąžĚĄ žěźžč†žĚĄ ŽąĄÍįÄ ÍĻ®žöīÍĪīÍįÄ žč∂žĖī ŪČĀŪČĀŽ∂ÄžĚÄ ŽąąžĚĄ Žú®Ž©į ŽĎėžßłŽäĒ žě†ÍłįžöīžĚĄ ŽāīžęďžēėŽč§. "ŽĎėžßłžēľ žôú žó¨ÍłįžĄú žěźÍ≥†žěąžĖī..." ŽďĪžóź žóÖÍ≥†žěąŽćė ŽßČŽāīŽäĒ žßĎžóź ŽĎźÍ≥† Žāėžė®ÍĪīžßÄ ŪŹ¨ŽĆÄÍłįžóÜžĚī Žā°žēĄŽĻ†žßĄ žě†ŽįĒŽ•ľ ÍĪłžĻú ŪėēžĚī ŽĎėžßłŽ•ľ Ž≥īÍ≥†žěąžóąŽč§. ŪėēžĚė ŽąąžčúžöłžóĒ Žį©žöłŽį©žöł ŽąąŽ¨ľžĚī ŽßļŪėÄž†łžěąžóąÍ≥†, Í∑ł Ž™©žÜĆŽ¶¨ŽäĒ Žāī ŪčįžĖīž≤ėŽüľ ŪĎĻ žě†Í≤®ž†łžěąžóąŽč§. "ŪėēžĚī...ŽĮłžēąŪēėŽč§... ŪėēžĚī Ž∂Äž°ĪŪēīžĄú ŽĄąŽßĆŪěėŽď§Í≥†... žēĄŽĻ†ŽŹĄ ŽąĄžõĆÍ≥ĄžčúÍ≥† žóĄŽßąŽŹĄ žēąÍ≥Ąžč†Žćį ŪėēžĚī žóīžč¨ŪěąŪĖąžĖīžēľŪēėŽäĒŽćį" "ž†ēŽßź ŽĮłžēąŪēī ŽĎėžßłžēľ.." žěźžč†žĚĄ ŽĀĆžĖīžēąžĚÄžĪĄ žöłŽ©į Í∑łŽ¶¨ ŽßźŪēėŽäĒ ŪėēžĚĄ Ž≥īŽčą ŽĎėžßłžĚė ŽąąžóźžĄúŽŹĄ ŽąąŽ¨ľžĚī ŽĖ®žĖīžßĄŽč§. "ŪĚĎ...ŪėēžēĄ..." Í∑łŽ†áÍ≤Ć Ūėēž†ú ŽĎėžĚīžĄú žĖľŽßąŽāė žöłžóąžĚĄÍĻĆ ŪõĆž©ćžĚīŽ©į ÍĶīŽč§Ž¶¨žóźžĄú Žāėžė§Ž©į žßĎžúľŽ°ú ÍĪłžĖīÍįĄŽč§. "ŽĎėžßłžēľ ŽįįÍ≥†ŪĒĄžßĄžēäžēĄ? Ž∂ēžĖīŽĻĶžĚīŽĚľŽŹĄ žā¨ž§ĄÍĻĆ?" "ŽŹąžĚī žĖīŽĒ®žĖīžĄú Ž≠ė žā¨ž§ÄŽćį ŽźźžĖī Í∑łŽÉ• žßĎžóź ÍįÄžěź" "žēĄŽÉź ŪėēžĚī žßÄŽāúŽč¨žóź žĚľŪĖąŽč§ÍįÄ Žā®žĚÄ žö©ŽŹąžĚī 500žõźž†ēŽŹĄ Žā®žēėžĖī" ŽßąžĻ® Ž∂ēžĖīŽĻĶŪĆĆŽäĒ žēĄž†ÄžĒ®ÍįÄ žěąÍłįžóź ž≤ęžßłŽäĒ ŽĎėžßłžĚė žÜźžĚĄ Ž∂ôžě°Í≥† Ž∂ēžĖīŽĻĶÍįÄÍ≤ĆŽ°ú ŪĖ•ŪĖąŽč§. "žēĄž†ÄžĒ® Ž∂ēžĖīŽĻĶ žĖľŽßąžóź ŪĆĆžĄłžöĒ?" "ž≤úžõźžóź 4ÍįúŪĆźŽč§." "žĖī...Í∑łŽüľ ŪėĻžčú 500žõźŽďúŽ¶īŪÖĆŽčą ŽĎźÍįúŽßĆ ž£ľžčúŽ©ī žēąŽź†ÍĻĆžöĒ?" "Ū̆... Í∑łŽěė Í∑łŽěė Í∑łŽüľ 500žõźŽßĆ ž£ľÍĪįŽĚľ" ŽßąžĻ® Žį§ŽŹĄ ÍĻäžĖīž†ł ÍįÄÍ≤ĆŽ•ľ ŽčęÍ≥† ŽŹĆžēĄÍįą žÉĚÍįĀžĚīžėÄŽäĒžßÄ ŪĚĒžĺĆŪěą ž≤ęžßłžĚė Ž∂ÄŪÉĀžĚĄ Žď§žĖīž§Ä žēĄž†ÄžĒ®žėÄŽč§. "Í≥†ŽßôžäĶŽčąŽč§. ŽŹąžĚÄ žó¨Íłįžóź..." Í∑łŽü¨Žāė ž≤ęžßłžĚė Žā°žĚÄ žě†ŽįĒ ž£ľŽ®łŽčąžóź žěąŽćėÍ≤ÉžĚÄ 500žõźžßúŽ¶¨ ŽŹôž†ĄžĚī žēĄŽčĆ ž∂Ēžöī Í≤®žöłŽį§Í≥ľŽŹĄ ÍįôžĚī Í≥ĶŪóąŪēú ÍĶ¨Ž©ćŪēėŽāė ŽŅźžĚīžėÄŽč§.
EXP
691,135
(59%)
/ 720,001
ÍįĎŽ∂Ä
žēĄžŅ†žēĄÍįÄ žĪĄÍ≥†žó¨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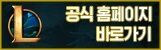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Žč§Íľ¨Ž¶¨
Žč§Íľ¨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