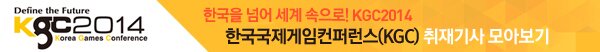대체로 강연은 특정 인물이 일정 주제에 관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반면 이번 KGC2014에서 진행된 장재곤 개발자의 강연 "US vs It 보드게임으로 게임밸런싱 체험하기"는 달랐다. 실제로 보드게임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형태였다. 게임밸런싱을 수정 작업을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보드게임을 통한 교육이었다. 6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참여형 교육 방식이었다. 직접 해보니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 보드게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일 수 있다. 그만큼 게임밸런싱에 관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강연이었다.
그가 강연에 사용했던 보드게임의 컨셉은 탱크와 로봇의 전투다. 도시를 쳐들어 오는 로봇을 유저가 조종하는 탱크로 막는 게임이었다. 로봇과 탱크는 정반대에 위치한다. 로봇은 자동으로 움직이며 10가지 액션을 한고, 탱크가 로봇에게 공격을 받으면 다음 회에는 움직일 수 없다.
게임의 룰 설명이 끝나고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팀이 플레이해봤지만 로봇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다.
"로봇이 너무 강했죠? 만약 로봇이 약했다면 재밌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게임이 더 재밌을까요? Hp가 1이 되었을 때 극적으로 클리어하는 쾌감. 그 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직접 괴물 로봇의 인공지능을 튜닝하여 게임의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핵심은 최대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때 로봇의 AI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의 액션이나 데미지를 수정해 극적으로 클리어하는 쾌감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극적이 상황 연출을 위해 로봇의 액션은 직접 만들 수도 있다. 가령 점프를 한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스킬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개발비의 반을 썼어요. 벌써 20분이나 지나갔습니다. 힐을 하거나 점프를 하는 스킬도 액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릴게요."
수많은 토의를 거친 뒤 나온 결과는 다른 팀을 통해 검증한다. CBT와 같은 방식이다. 자신이 만든 로봇이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지 다른 팀의 피드백을 통해 검증하는 것. 다른 팀이 개발한 로봇을 막기 위해 다시 또 팀원들끼리 머리를 싸맨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건네준다. 그 결과를 참고해 밸런스를 수정한다.

"수정된 로봇을 가지고 로봇 대전을 해봅시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결정하고 대결을 펼치는 거죠."
게임으로 플레이할 때에는 약했던 로봇이 의외로 강하기도 했다. 직접 탱크로 플레이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냈다.
"드라마틱하다란 각본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은 '감상'이 아니라 '플레이'로 완성됩니다. 극적인 상황은 게임 역학을 통해 나타나죠. 불가피성(inevitab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기(building to a climax)로 만들어지는 거죠."
강연에서 진행했던 보드게임을 분석해보면 이 3가지가 모두 들어있다. 괴물 로봇은 도시를 향해 진군하고, 체력이 존재한다는 건 불가피성이다. 탱크, 즉 유저가 움직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간다. 3가지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불확실성과 불가피성의 줄다리기에서 역동성이 나옵니다. 엔딩은 어떤 방법으로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억되지는 않죠. 플레이어가 게임을 기억하는 순간은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지는 극적인 상황입니다. 게임 디자인에는 '신의 한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인 테스트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재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모든 강연 콘텐츠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회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좋았다', '이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점이 재밌었다'를 되돌아보면서 서로의 느낀 점을 공유했다. 대부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남겼다. 이번 강연은 직접 체험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