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8-09 20:13
조회: 340
추천: 0
[단편] 진, 겨울밤"음흠흠~흐으음~"
아이오니아 북부지방, 깊은 숲 어딘가의 집.
밖은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삼일연속으로 이리 많은 눈이 내리다니,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없어 조금은 슬프다. 내 기분을 이해해주는것인지 지난번 고용해왔던 벨이라는 이름의 메이드가 내게 따듯한 홍차를 건네며 조심스레 묻는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 얼굴입니다. 주인님."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자 나는 대답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어주고서 홍차를 들이킨다. 입 안에 장미향이 그윽하게 퍼져나갈때쯤이면 내가 입을 열어 대답한다.
"벨은 이런 생활이 지겹지 않은가요?"
"바깥세상보단 은둔형 외톨이 주인님과 함께 생활하는게 백 배는 편하네요."
"농담도...지나치시군요."
남은 홍차를 전부 들이마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벨은 내가 다 마신 찻잔을 유리쟁반에 옮겨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준비하는듯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침실 입구까지 들려온다. 안으로 들어오자 벽에 걸려있는 총들이 눈에 띄게 들어온다. 마지막 작품을 끝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침대에 털썩 앉아 책상서랍을 열자 늘 공연을 할 때마다 썼던 가면이 나를 쳐다본다. 가면의 콧등 부분을 슥 만질 때 바깥에서 노크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키실 일은 더 없으십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열정을 차갑게 식혀주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급은 식탁 위에다 올려놨으니 찾아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나는 작게 불타오르는 등잔의 불을 훅 입김을 불어 끄자 곧 어둠이 밀려오고 창문 바깥으로 여전히 폭설이 내리는 것이 보인다. 내일 눈이 그치면 벨과 함께 마을로 나가 작품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채 잠에 빠진다.
. . .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진다. 반사적으로 허리뒤춤에서 네 자루의 단검 중 제일 예리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지닌 단검을 손에 쥔다.
"...누구지? 예술가의 잠을 방해하면 곱게 넘어갈 수는 없..."
"저입니다, 주인님."
벨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온다.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못한 눈을 슬쩍 돌려서 보자 그녀의 윤곽이 보인다. 붉은 안광, 금발과 함께 어우러진 단발머리. 가까이서보니 진한 핏빛을 띄우는 그녀의 눈동자가 탐스럽다. 그녀라는 것을 눈치챈 나는 다시 단검을 집어넣는다.
"분명 중요한 일이니...제 방에 들어왔겠죠?"
드디어 어둠이 내 눈에 익자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묻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입고있던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는다. 툭툭 끊기는 소리가 내 귀를 자극시킨다. 애써 흥분을 감추자 단추를 다 풀어버린 그녀가 셔츠를 침대 아래로 내던진다. 하얀 살결이 눈에 띄게 보인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내 볼과 콧등에 닿자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볼을 꼭 잡고서 진한 키스를 한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다.
"황홀하군."
. . .
[단편] 진, 겨울밤 -끝-
EXP
190
(90%)
/ 201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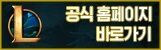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페장
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