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9-28 03:47 | мЎ°нҡҢ: 838 |
추мІң:0
мў…м–ёмқҳ л•Ң: нҢҢн‘ёлӢҲм№ҙмқҳ лӘ°лқҪ - м„ңл§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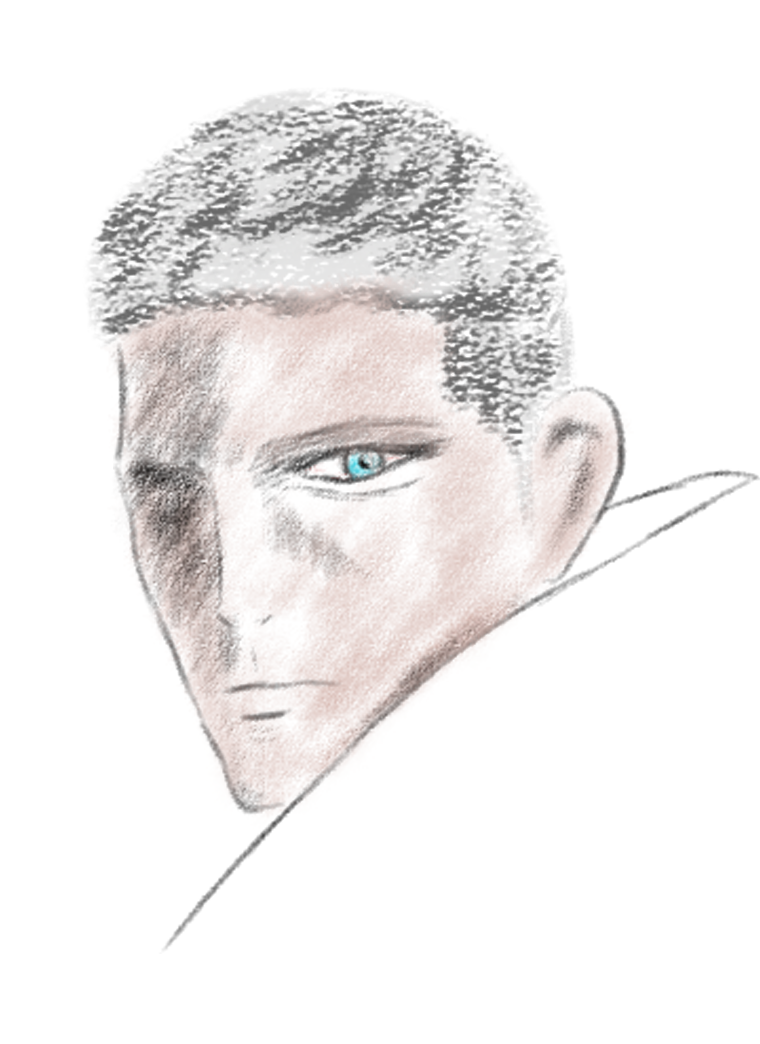
н•ң мӮ¬лӮҙк°Җ мһҗмӢ мқҙ м“°кі мһҲлҠ” мұ…мқ„ л°”лқјліҙм•ҳлӢӨ. л„Ҳл¬ҙ нҷ”л Өн•ҳм§ҖлҸ„, к·ёл ҮлӢӨкі л„Ҳл¬ҙ л”ұл”ұн•ҳм§Җ м•Ҡм•„м„ң мҳӨнһҲл Ө кі кёүмҠӨлҹ¬мҡҙ н•„мІҙк°Җ мұ… мң„м—җ к·ёл ӨмЎҢкі к·ё кёҖмһҗл“ӨмқҖ кёҖм“ҙмқҙмқҳ кІ©мӢқм—җ м•Ңл§һкІҢ мһҗлҰ¬лҘј мһЎкі лҠ” мӣ…мһҘн•ң л¬ёмһҘмқ„ мқҙлЈЁм—ҲлӢӨ.
В м„ёмғҒмқҳ лІҲмҳҒ, лӘ°лқҪ, мЈҪмқҢ, нқ¬л§қ, н–үліө, мӮ¬лһ‘ л“ұмқ„ лӘЁл‘җ лӢҙмқҖ мқҙ мұ…мқҳ л¬ёлӢЁмқҖ мқҙм ң л§Ҳм§Җл§ү л¬ёмһҘмқҙ мҳӨкёё кё°лӢӨлҰ¬кі мһҲм—ҲлӢӨ. н•ҳм§Җл§Ң кёҖм“ҙмқҙлҠ” м°Ёл§Ҳ м“ё мҲҳ м—Ҷм—ҲлӢӨ.В л§Ҳм№ҳ лң»лҢҖлЎң м•Ҳ мқҙлЈЁм–ҙм ём„ң лӘЁл“ кІғмқҙ нӢҖм–ҙм§ҖлҠ” кІғмқ„ ліҙкё° мқјліҙ м§Ғм „мқҳ н‘ңм •мңјлЎң к·ёлҠ” мһҗмӢ мқҳ мұ…мқ„ міҗлӢӨліҙм•ҳлӢӨ.В
м°Ҫл°–мқ„ л°”лқјліҙм•ҳлӢӨ. кёҲл№ӣ кёҲмҶҚмңјлЎң мқҙлЈЁм–ҙ진 м•„лҰ„лӢӨмҡҙ кө¬мЎ°л¬ј л„ҲлЁёлЎң лҒҠмһ„ м—ҶлҠ” мӢ¬м—°мқҙ ліҙмҳҖлӢӨ. лі„л“Өмқҙ мһҗмӢ мқҳ мһҗлҰ¬лҘј мһЎм•„ л№ӣмқ„ лӮҙкі м„ёмғҒмқ„ л°қкІҢ 비추лҠ” мқҙВ нҷ©нҷҖн•ң кҙ‘кІҪмқҖ к·ём—җкІҗ л„Ҳл¬ҙ мқөмҲҷн•ң, м•„лӢҲ л„Ҳл¬ҙ лӮҳлҸ„ лӢ№м—°н•ң л°°кІҪмқҙм—ҲлӢӨ.
к·ёлҠ” кі мҡҙ мҶҗмңјлЎң мқҙл§ҲлҘј лҗҳм§ҡмңјл©° мһ мӢң мғқк°Ғм—җ л№ мЎҢкі мқҙлӮҙ нҳјмһҗм„ң л¬ҙм–ёк°ҖлҘј к№ЁлӢ¬мқҖ л“Ҝ м Җ мҳӨлҘҙнҺҳмҡ°мҠӨ лі„л“Өмқ„ л„ҲлЁё лӮҳм§Җл§үмқҙ мӨ‘м–јкұ°л ёлӢӨ.
"л№ӣмқҙ мһҲмңјлқј."
к·ёлҠ” лӢӨмӢң кёҖмқ„ м“°кё° мң„н•ҙ мһүнҒ¬лҘј м Ғм…ЁлӢӨ.
----------------------------------------------------------------------------------------------------------------------
нҷ©нҳјмқҳ л°”лӢӨ, нҢҢн‘ёлӢҲм№ҙ к·јн•ҙ
мҡ°л§ҲлҘҙмқҳ м„ л°•мқҖ л§Ҳм№ҳ мЎ°к°Ғ лҗң лІҪлҸҢкіјлҸ„ к°ҷм•ҳлӢӨ.В нҢҢлҸ„лҘј к°ҖлҘҙлҠ” лӢӨлҘё мў…мЎұмқҳ л°°л“ӨкіјлҠ” лӢӨлҘҙкІҢ л§Ҳм№ҳ кұ°лҢҖн•ң кұҙ축물мқҳ мқјл¶Җ분мқҙ л°”лӢӨм—җ л– лӢӨлӢҲлҠ” кІғкіјлҸ„ к°ҷм•ҳлӢӨ. нҒјм§Ғн•ҳкі мӣ…мһҘн•ң мЎ°к°ҒмғҒм—җ лҸӣмқ„ лӢ¬кі к·ё м–‘мҳҶм—җ лӢ¬лҰ° м»ӨлӢӨлһҖ мӣҗкё°л‘Ҙ нҳ•нғңмқҳ 엔진мқ„ мғҒмғҒн•ҙліҙлқј, мҡҳ м—җм„ң кұҙмЎ° лҗң л°°л“ӨмқҖ м „л¶Җ к·ёлҹ° мӢқмқҙм—ҲлӢӨ.
В лӮЁл“Өмқҙ ліҙл©ҙ м ҖкІҢ м–ҙл–»кІҢ л– лӢӨлӢҲлҠ”м§Җ мӢ кё°н•ҙ н•ҳм§Җл§Ң н•ң нҺёмңјлЎңлҠ” мҡ°л§ҲлҘҙ ліёмқёл“Өмқҳ кұёмһ‘н’Ҳмқҙмһҗ к·ёл“Өмқҳ лӢЁлӢЁн•ҳкі мӣ…мһҘн•ң л©Ӣмқ„ ліҙм—¬мЈјлҠ” мғҒ징 к·ё мһҗмІҙмқҙкё°лҸ„ н–ҲлӢӨ.
В м„ё мІҷмқҳ л°°к°Җ нҢҢлҸ„мқҳ 비лӘ…мҶҢлҰ¬лҘј н—Өміҗк°Җл©° мҡ°л§ҲлҘҙлҘј к°Җл“қ мӢӨмқҖ мұ„ н•ӯн•ҙ мӨ‘мқҙм—Ҳкі нҺҳлҚ°лҰ¬мҪ”лҠ” к·ё мӨ‘ кё°н•Ёмқё л¬ҙмҮ м„ м—җ нғ‘мҠ№ н•ң мғҒнғңмҳҖлӢӨ.В к°‘нҢҗмқҖ лӢӨлҘҙкІҢ н•„мҲҳ мқёмӣҗмқ„ м ңмҷён•ҳкіӨ лӘЁл‘җ н•ЁмһҘмӢӨм—җ лӘЁм—¬ м»ӨлӢӨлһҖ кёҲмҶҚ н…Ңмқҙлё”м—җ л‘ҳлҹ¬м„ң мһҲм—ҲлӢӨ. к·ёл“Ө лӘЁл‘җ мһҗмӢ мқҳ л§қм№ҳ мҶҗмһЎмқҙлҘј кҫ№ мҘҗкұ°лӮҳ м“°лӢӨ듬мңјл©° мҸҹм•„м§ҖлҠ” кёҙмһҘк°җмқ„ кІЁмҡ° лІ„н…ЁлӮҙкі мһҲм—Ҳмңјл©° нҺҳлҚ°лҰ¬мҪ”лҠ” к·ё к°„мқҳ кІҪн—ҳмқ„ л°”нғ•мңјлЎң м•ҢкІҢ лҗң н•ң к°Җм§Җ мӮ¬мӢӨмқ„ лӢӨмӢң мғҒкё°н–ҲлӢӨ.
'мқёк°„мқҙ л‘җл ӨмӣҢн•ҳкі мһҲмңјл©ҙ лі„кұ° м•„лӢҢ мқјмқҙкі мјҖлғҗмқёмқҙ л‘җл ӨмӣҢн•ҳл©ҙ мқҙн•ҙ лӘ» н• мқјмқҙ мқјм–ҙлӮңлӢӨ.
мҡ”мҰҲмЎұмқҙ л‘җл ӨмӣҢн•ҳкі мһҲмңјл©ҙ нҷ©лӢ№н•ң мқјмқҙ мқјм–ҙлӮҳкі мӢӨлҰ°л“Өмқҙ л‘җл ӨмӣҢ н•ҳл©ҙ кіЁм№ҳ м•„н”Ҳ мқјмқҙ мқјм–ҙлӮңлӢӨ.'
к·ёлҰ¬кі л§Ҳм§Җл§ү мӮ¬мӢӨмқ„ лЁёлҰҝмҶҚм—җм„ң лӢӨмӢң мғҒкё°н–ҲлӢӨ.
мҡ”мҰҲмЎұмқҙ л‘җл ӨмӣҢн•ҳкі мһҲмңјл©ҙ нҷ©лӢ№н•ң мқјмқҙ мқјм–ҙлӮҳкі мӢӨлҰ°л“Өмқҙ л‘җл ӨмӣҢ н•ҳл©ҙ кіЁм№ҳ м•„н”Ҳ мқјмқҙ мқјм–ҙлӮңлӢӨ.'
к·ёлҰ¬кі л§Ҳм§Җл§ү мӮ¬мӢӨмқ„ лЁёлҰҝмҶҚм—җм„ң лӢӨмӢң мғҒкё°н–ҲлӢӨ.
'мҡ°л§ҲлҘҙк°Җ л‘җл ӨмӣҢн•ҳкі мһҲмңјл©ҙ лӘЁл‘җк°Җ л‘җл ӨмӣҢн•ҙм•ј н•ңлӢӨ. к·ёл“ӨмқҖ м„ёмғҒм—җм„ң к°ҖмһҘ лҢҖлӢҙн•ң мў…мЎұл“ӨмқҙлӢӨ.'
"м•„мЈј м§Җлһ„л§һмқ„ мғҒнҷ©мқҙм•ј."
лӘ©м—җм„ң лҸҢлҚ©мқҙлҘј көҙлҰ¬лҠ” л“Ҝн•ң лӘ©мҶҢлҰ¬к°Җ м„ мӢӨлӮҙм—җ нҚјмЎҢлӢӨ. н•ЁмһҘмқҙмһҗ к°ҖмһҘ кұ°лҢҖн•ң мҲҳм—јмқ„ м§ҖлӢҢ мһҗ, нҸҙнҒ¬нҲ¬лҘҙмҳҖлӢӨ. к·ёк°Җ м •м„ұмҠӨлҹҪкІҢ л•ӢмқҖ мҲҳм—јмқ„ кҝҲнӢҖкұ°лҰ¬л©° л§җмқ„ мқҙм–ҙлӮҳк°”лӢӨ.
"м•…л§Ҳл“Өмқҙ 섬 л¶Ғл¶Җ м „мІҙлҘј мһҘм•…н–Ҳкі лӮЁмқҖ кұҙ м—¬кё°, м–•мқҖ л°”лӢ·кёёмқҙм•ј. к·ёлҰ¬кі мҡ°лҰ¬к°Җ к°Җ진кұҙ л§қм№ҳм§Ҳ мўҖ н•ҳлҠ”лҚ° мқҙ мһ„л¬ҙм—җ мһҗмӣҗн•ң м •мӢ лӮҳк°„ лҶҲл“Өмқҙм§Җ."
лӢӨлҘё мҡ°л§ҲлҘҙ м§ҖнңҳкҙҖмқҙ л¬јм—ҲлӢӨ.
"мқҙлҙҗ н•ЁмһҘ, мқҙ лі‘л ҘмңјлЎң л§үмқ„ мҲң мһҲлҠ”кұ° л§һм•„? к·ё мӘҪ мһҗкІҪлӢЁмһҘлҸ„ лӘ©мқҙ мһҳл ёлӢӨл©ҙм„ң? к·ё 섬мқҖ лҒқлӮңкұ°лӮҳ лӢӨлҰ„ м—Ҷм–ҙ, м—¬кё° мқёк°„ л§җ л“Јм§Җ л§җкі к·ёлғҘ лҸҢм•„к°Җм„ң нӣ„мқјмқ„..."
к·ё мҡ°л§ҲлҘҙмқҳ л§җм—җ нҸҙнҒ¬нҲ¬лҘҙмқҳ мҲҳм—јмқҙ к·ёлҘј н–Ҙн–ҲлӢӨ. лҲҲк°ҖлҘј лӘЁл‘җ лҚ®мқҖ лҲҲмҚ№ л°‘мңјлЎң ліҙмқҙлҠ” к·ёмқҳ 분노 м–ҙлҰ° лҲҲл№ӣмқҖ лҚ”мқҙмғҒ л§җн•ҳм§Җ л§җкі лӢҘм№ҳлқјкі м•”л¬өм ҒмңјлЎң м§ҖмӢң мӨ‘мқҙм—ҲлӢӨ. к·ёлҰ¬кі к·ё мӢңм„ мқҖ мҡ°л§ҲлҘҙ м§ҖнңҳкҙҖмқҳ л©Ӣм©ҚмқҖ н—ӣкё°м№Ёмқ„ мқҙлҒҢм–ҙлғҲлӢӨ.
"нҺҳлҚ°лҰ¬мҪ”лқјкі н–ҲлӮҳ? мғҒнҷ©мқҙ м–јл§ҲлӮҳ мӢ¬к°Ғн•ңкұ°м•ј?"
нҺҳлҚ°лҰ¬мҪ”к°Җ лӢөн–ҲлӢӨ.
"мҶ”м§ҒнһҲ л§җн•ҳмһҗл©ҙ, мһҗмӮҙ мһ„л¬ҙлӢӨ. мқҙ мӘҪ л§җмқҙ л§һм•„. м •мғҒм Ғмқё м§Җнңҳлқјл©ҙ л°°лҘј лҸҢл ёкІ м§Җл§Ң...лӮң кІ°мӮ¬ л°ҳлҢҖм•ј. н”јлӮңлҜјл“Өмқҙ мҸҹм•„м§Җкі мһҲм–ҙ. нҳ„мһҘмқ„ кІӘмқҖ мқҙл“Өмқҳ лҸ„мӣҖмқҙ н•„мҡ”н•ҳлӢӨ. нҢҢн‘ёлӢҲм№ҙ лӢӨмқҢмқҖ лІ лҘёмқҙ лҗ м§Җ мҡҳмқҙ лҗ м§Җ лЎңмӣ¬мқҙ лҗ м§Җ м•„л¬ҙлҸ„ лӘ°лқј. лҚ”кө°лӢӨлӮҳ к·ё кіі м§ҖлҸ„мһҗлҠ” м•„м§Ғ мӮҙм•„ мһҲлӢӨл©ҙ..."
лҳҗ лӢӨлҘё мҡ°л§ҲлҘҙк°Җ лҒјм–ҙл“Өм—ҲлӢӨ.
"м„ёмқҙнҒ¬лҰ¬м•„ к·ё мқёк°„л“ӨмқҖ мҷң м•Ҳ мҳӨлҠ” кұҙлҚ°?"
нҺҳлҚ°лҰ¬мҪ”лҠ” м°ёлӢҙн•ң мӢ¬м •мқ„ кІЁмҡ° м–өлҲ„лҘҙл©° лӢөн• мҲҳ л°–м—җ м—Ҷм—ҲлӢӨ. лӘЁл‘җк°Җ к°ҷмқҖ мғқк°Ғ, к°ҷмқҖ 분노лҘј лҠҗлҒјкі мһҲм—ҲлӢӨ.
"лӮҳлҸ„ ліёкөӯмқҳ мӮ¬м •м—җ 진мӢ¬мңјлЎң мң к°җмқ„ н‘ңн•ҳлҠ” л°”лӢӨ. лҢҖмІҙ л¬ҙмҠЁ мқј л•Ңл¬ёмқём§ҖлҠ” лӘ°лқј, лӮҳлҸ„ ліёкөӯм—җм„ң лӘҮ л…„мқ„ л–Ём–ҙм ё мһҲм—ҲмңјлӢҲк№җ, кі§ м •ліҙмӣҗмқҙ лӢөмқ„ к°Җм ё мҳ¬ кәјлӢӨ."
"мӮҙм•„лӮЁкё°лӮҳ н•ҳлқјкі нқ°л‘Ҙмқҙ"
"к·ёлҹ¬м§Җ, лІҪлҸҢ"
"к·ёл§Ң!"
н•ЁмһҘмқҳ мҶҢлҰ¬м№Ём—җ лӘЁл‘җк°Җ л©Ӣм©ҚмқҖ кёҙмһҘк°җмқ„ ліҙм—¬м•ј н–ҲлӢӨ. к·ёлҠ” кі„мҶҚ мқҙл§ҲлҘј м“°лӢӨ듬м—ҲлӢӨ. лЁёлҰҝмҶҚм—җм„ң лӘЁл“ мҠ№лҰ¬ мӢңлӮҳлҰ¬мҳӨмҷҖ нҢЁл°° мӢңлӮҳлҰ¬мҳӨм—җ кҙҖн•ҙ мЈјмӮ¬мң„лҘј көҙлҰ¬л©° мӢң뮬л Ҳмқҙм…ҳмқ„ к·ёл Өліҙм•ҳлӢӨ.
"м •мғҒм Ғмқё м§Җнңҳ..."
нҺҳлҚ°лҰ¬мҪ”к°Җ лӢөн–ҲлӢӨ.
"лӢ№мӢ мқҳ лң»лҢҖлЎң, н•ЁмһҘ"
В
мһ к№җмқҳ м№Ёл¬ө, м•„мЈј мһ к№җмқҙм§Җл§Ң к·ёл“ӨмқҖ л¬ҙм—Үмқ„ н•ҙм•ј н•ҳлҠ”м§Җ лӢӨмӢң мғқк°Ғн•ҙліј мҲҳ мһҲлҚҳ к·ё м№Ёл¬өмқҙ к·ёмқҳ мғқк°Ғмқ„ л°”лЎңмһЎм•ҳлӢӨ. н•ЁмһҘмқҖ мҲҳмӢ кё°м—җ мһ…мқ„ к°–лӢӨ лҢ„ мұ„ лӮҳлЁём§Җ л‘җ н•Ём„ м—җ мһҗмӢ мқҳ лң»мқ„ м•Ңл ёлӢӨ.
"м—¬кёҙ н•ЁмһҘ нҸҙнҒ¬нҲ¬лҘҙлӢӨ."
к·ёлҠ” лӘ©мқ„ к°ҖлӢӨл“¬кі лҠ” лӢӨмӢң л§җмқ„ мқҙм—ҲлӢӨ.
"мһ‘м „мқ„ ліҖкІҪн•ңлӢӨ. мҲҳліө мһ‘м „мқҖ м·ЁмҶҢлӢӨ. л°ҳліөн•ңлӢӨ. мҲҳліө мһ‘м „мқҖ м·ЁмҶҢлӢӨ."
нҺҳлҚ°лҰ¬мҪ”лҠ” мқҙн•ҙлҠ” н•ҳм§Җл§Ң м°ёлӢҙн•ң н‘ңм •мңјлЎң к·ёлҘј л°”лқјліҙм•ҳлӢӨ. н•ЁмһҘмқҖ к·ёлҘј н•ң лІҲ м“ұ міҗлӢӨліҙкі лҠ” л§җмқ„ мқҙм–ҙлӮҳк°”лӢӨ.
"мқҙ мһ‘м „мқҖ мқҙм ң кө¬м¶ң мһ‘м „мқҙлӢӨ. лЁјм Җ лӮҙлҰ° лҶҲл“Өмқҙ лӘёлҡұмқҙлЎң лІҪмқ„ м№ҳкі лӮҳлЁём§ҖлҠ” н”јлӮңлҜјмқ„ мҡ°лҰ¬ л°°лЎң лҢҖн”јмӢңмјң! мөңлҢҖн•ң л§ҺмқҖ н”јлӮңлҜјл“Өмқ„ кө¬м¶ңн•ҙлқј!, мқҙмқҳ мһҲмңјл©ҙ мһ… лӢҘм№ҳкі мһҲм–ҙ!"
л§җмқ„ л§Ҳм№ң н•ЁмһҘмқҳ мҲҳм—јмқҙ лӢӨмӢң нҺҳлҚ°лҰ¬мҪ”лҘј н–Ҙн–ҲлӢӨ.В
"л„Ң к°Җм„ң к·ёмӘҪ мЎұмһҘмқ„ нҷ•ліҙн•ҙ, лӢҲ л§җм—җ мҡ°лҰ° лӘЁл“ кұё кұҙлӢӨ. мЈҪм–ҙлҸ„ мғҒкҙҖ м•Ҳн•ҳлҠ”лҚ° к·ё 꼬맹мқҙ к°ҷмқҖ м—¬мһҗм• лҠ” л¬ҙмЎ°кұҙ лҚ°лҰ¬кі мҷҖ!"
к·ёмқҳ л§җм—җ нҺҳлҚ°лҰ¬мҪ”мқҳ м–јкөҙм—” м–•мқҖ лҜёмҶҢк°Җ м§Җм–ҙмЎҢлӢӨ. кі л§ҲмӣҖ, лҜём•Ҳн•Ё, к°җлҸҷ, л‘җл ӨмӣҖ лӘЁл“ кІҢ к·ёл Өм ёмһҲлҠ” к·ёлҰј мІҳлҹј к·ёлҘј л°”лқјліҙм•ҳлӢӨ.
"лӘ…л №лҢҖлЎң."
нҸҙнҒ¬нҲ¬лҘҙмқҳ мҲҳм—ј лҳҗн•ң м •мӨ‘мқҙ кі к°ңлҘј мҲҷмқҙкі лӢӨлҘё мқҙл“Өмқ„ л°”лқјліҙм•ҳкі мқҙлӮҙ лӢЁлӢЁн•ң лҸҢмқҙ көҙлҹ¬к°ҖлҠ” л“Ҝн•ң лӘ©мҶҢлҰ¬лЎң нһҳк»Ҹ мҷёміӨлӢӨ.В
"лӘЁл“ м„ мӣҗл“ӨмқҖ л¬ҙкё°лһ‘ к°‘мҳ· мұҷкІЁ! мқјл“Өн•ҙм•јм§Җ!"
нҢҢлҸ„лҠ” м җм җ кұ°м„ём ёл§Ң к°”лӢӨ.
-----------------------------------------------------------------------------------------------------------
В
мӣҢн•ҙлЁёмқҳ м—”л“ңнғҖмһ„(н•ң кІҢмһ„мқҳ м„ёкі„кҙҖмқҳ мў…л§җмқ„ лӢӨлЈ¬ мҠӨнҶ лҰ¬)мқ„ лЎңм•„мӢқмңјлЎң н’Җм–ҙліҙл©ҙ м–ҙл–Ёк№Ң н•ҙм„ң мӢңмһ‘н•ҳкІҢ лҗҳм—ҲмҠөлӢҲлӢӨ. л””мҠӨнҶ н”јм•„м Ғмқё м„ёкі„кҙҖмқ„ лӘ©н‘ңлЎң кө¬мғҒмӨ‘мқҙл©° мҠӨнҶ лҰ¬лҠ” нҢҢн‘ёлӢҲм№ҙлҘј мӢңмһ‘мңјлЎң н•ҙліјк№Ңн•©лӢҲлӢӨ.
-
-

-
лӘЁмҪ”мҪ” нҢЁлҠ” мҠӨнҠёлҰ¬лЁё мҶ”лҰ¬
м„ң비여мҡ”мЎ°нҡҢ 2460 추мІң 6
-
-
-

-
лқјм ңлӢҲмҠӨ мӢңм—”
лё”лҰ¬мһҗл“ңкөімЎ°нҡҢ 4842 추мІң 35
-
-
-

-
мў…м–ёмқҳ л•Ң: нҢҢн‘ёлӢҲм№ҙмқҳ лӘ°лқҪ - м„ңл§ү -
нҢқмҪҳмһҘмӮ¬кҫјмЎ°нҡҢ 839 추мІң 0
-
-
-

-
м•„лёҢл§Ғ
мғӨмқҙмҪ”мЎ°нҡҢ 818 추мІң 2
-
-
-

-
м•„м№Ёмқҳ н”„лЎң н…ҢлҸҲл°”л“ң
нҢҢмҡ°н•„мЎ°нҡҢ 5978 추мІң 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