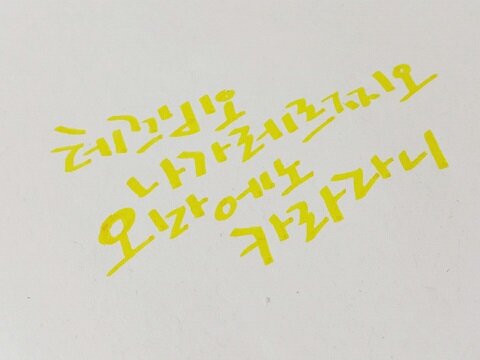|
2016-09-08 18:22
조회: 1,593
추천: 21
시사인 사태에 대한 전우용씨의 글 입니다.한 달 전쯤, 모 언론사 아카데미에서 '저널리즘의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몇 번이나 고사했지만, 3년이나 기고한 마음의 빚이 있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저는 "저널리즘의 글쓰기란 자기 무식과 싸우고, 대중의 통념과 싸우며, 사회규범과 싸우다가 일시 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알아야 쓸 수 있다', '내 앎으로 대중의 통념을 통째로 바꾸려 들지 마라', '비판과 비난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제 경험상, 저널리즘의 글쓰기는 아카데미즘의 글쓰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카데미즘의 글쓰기는 자기 무식만 상대하면 되지만, 저널리즘의 글쓰기는 여러 방면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저널리즘이 아카데미즘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담론의 구조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선봉 역할을 한 건 언제나 아카데미즘이었지 저널리즘이 아니었습니다.... 아카데미즘이 대중의 통념이나 사회 규범따위 무시하고 전진하여 새 영역에 깃발을 꽂는 특공대라면, 저널리즘은 그를 뒤따르며 참호를 파고 보급선을 확보하는 공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념과 규범이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번 '시사인 사태'가 한국의 아카데미즘과 '진보적 저널리즘'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메갈워마드의 정당성 문제는 먼저 아카데미즘 영역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카데미즘 영역이란 '여성학'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정신분석학, 역사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해야 할 문제죠. 이건 '여성문제'일 뿐 아니라 가치관과 규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의 경우, 타학문과의 경계가 허물어진지 오래이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성학'은 아직 '외부'에서 발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접근을 망설이는 '외부'도 문제지만, "여성이 아니면 알 수 없다"와 "모르는 주제에 끼어들지 말라"는 '내부'의 배타성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메갈워마드 문제가 '오직 여성문제'로만 취급되면, 이 문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를 다른 관점에서 살피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시사인은 다른 학문 분야가 토론에 끼어들기 전에, 특공대가 깃발을 꼽기도 전에, 스스로 특공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편집장이었다면, 기자에게는 현상만 기술하게 하고, 해석과 평가는 아카데미스트들의 좌담이나 토론에 떠넘겼을 겁니다. 게다가 기자는 이 문제를 '오직 여성문제'로만 보아, 여성학적 발언이 아카데미즘 영역을 과잉대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사인의 해당 기사가 다양한 지적 층위와 학문적 관심으로 이루어진 '대중의 통념'과 정면충돌한 이유일 겁니다. 이 사태 전후에 나온 시사인 기자들의 발언도 적절치 못했습니다. "공부는 셀프다"는 수십년을 공부한 전업 학자라도 대중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널리즘이 대중에 영합하는 건 잘못이지만, 대중을 무시하는 건 더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삼성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도 참 심각한 발언입니다. 광고주의 압력과 구독자의 항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금전관계로만 얽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시사인 기사들을 좋아했던 독자들이 이 기사 하나에 강력 반발했다면, 먼저 이 기사의 결이 다른 기사들의 결과 어떻게 달랐는지 스스로 살펴야 했습니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판/비난하는 사람들을 '기득권 침해에 분노하는 초라한 남자들'로 단일화한 것은 시사인답지 않았습니다. 시사인 구성원들이 '무식한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보다는, 스스로 저널리즘의 정도에서 벗어난 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시사인을 '사랑'하는 독자가.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오솔히
오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