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6-10 14:22
мЎ°нҡҢ: 950
추мІң: 0
л№Ңм§ҖмӣҢн„° - н”јнҠё нҺҳмқёлЁ№кө¬лҰ„мқ„ мһ”лң© н’ҲмқҖ н•ҳлҠҳм—җм„ң м„ұк°ҖмӢ мҡ°л ӣмҶҢлҰ¬к°Җ к·ём№ мӨ„мқ„ лӘЁлҘҙкі лӮҙл Өм•үм•ҳлӢӨ. лӮҳлҠ” н•ҙмҙҲлЎң н’Җмқ„ лЁ№мқё кІҖмқҖмғү мҡ°мқҳ мһҗлқҪмқ„ мғҲмӮј м—¬лҜёл©ҙм„ң м„ңл‘ҳлҹ¬ лӘ©мұ… мӮ¬мқҙлЎң лӮң лҶ’лӢӨлһҖ кі„лӢЁмқ„ лӣ°м–ҙ мҳ¬лқјк°”лӢӨ. к№ңк№ңн•ң нҢҗмһҗ кұ°лҰ¬м—җм„ңлҠ” м•„лһҳлЎң к№Ңл§Ҳл“қнһҲ нҺјміҗ진 л§ҢмңјлЎңл¶Җн„° л“Өл ӨмҳӨлҠ” нҢҢлҸ„ мҶҢлҰ¬мҷҖ м „л“ұ л¶Ҳл№ӣл“Ө мӮ¬мқҙлЎң мғҲм–ҙ лӮҳмҳӨлҠ” л– л“ӨмҚ©н•ң лұғмӮ¬лһҢл“Өмқҳ кі н•Ёмқҙ л’Өм„һм—¬ мқ„м”Ёл…„мҠӨлҹ¬мӣ лӢӨ. к·ҖнүҒмқҙлҘј л°”лӢӨлұҖ 비лҠҳлЎң мһҘмӢқн•ң нҳ„мғҒкёҲ кІҢмӢңнҢҗмқ„ л°ңкІ¬н•ҳкі лҠ” л°ңкұёмқҢмқ„ лҠҰм·„лӢӨ. м Җ л©ҖлҰ¬м„ң 비바лһҢм—җ мҡ”лҸҷм№ҳлҠ” м„ мҲ 집 нҳ„нҢҗмқҙ лҲҲм—җ л“Өм–ҙмҷ”лӢӨ.В В к°Ҳкі лҰ¬мҷҖ лӘЁлЈЁлҠ” нҢҗмһҗ кұ°лҰ¬м—җ мҰҗ비н•ң м—¬лҠҗ м„ мҲ 집과лҠ” лӢӨлҘҙкІҢ, лұғмӮ¬лһҢкіј лҢҖмһҘмһҘмқҙл§Ң л“ңлӮҳл“Ө мҲҳ мһҲлҠ” кіімқҙм—ҲлӢӨ. л¬јлЎ , мҲ кіј лҸ„л°• л”°мң„лЎң к°ҖмӮ°мқ„ нғ•м§„н•ҳкі л№„лЈЁн•ң м—¬мғқмқ„ к·ёлҰјмһҗ кө°лҸ„м—җм„ң л§Ҳк°җн• мҡ”лҹүмқҙлқјлҸ„ н’ҲмқҖ л“Ҝн•ҙ лөҲлҠ” мҙҲм·Ңн•ң н–үмғүмқҳ лңЁлӮҙкё°л“Өмқҙ лЈ¬н…Ңлқј мқҙкіім Җкіім—җм„ң л№Ңм§ҖмӣҢн„°лЎң нқҳлҹ¬л“Өм–ҙмҳӨлҠ” кұҙ к·ёлҰ¬ л“ңл¬ё мқјмқҙ м•„лӢҲм—ҲлӢӨ. к°ңмӨ‘м—җлҠ” мӮ¬лғҘмқ„ л§Ҳм№ҳкі лҸҢм•„мҳЁ м„ л°•мқҙлӮҳ л¶Җл‘Јк°Җ ліҖл‘җлҰ¬м—җм„ң н—Ҳл“ңл ӣмқјлЎң мӮ¬лӮҳнқҳмқҖ лЁ№кі л§ҲмӢӨ лҸҲн‘јк№ЁлӮҳ мҶҗм—җ мҘ” мқҙл“ӨлҸ„ мһҲм—ҲлҠ”лҚ°, лҚ°ліёмқҖ к·ёлҹ° мһҗл“Өмқ„ мһҗмҳӨнӢҖлҰ¬лқјлҠ” мқҙлҰ„мңјлЎң мӢёмһЎм•„ л¶ҖлҘҙл©° л¶ҲмҫҢн•Ёмқ„ л“ңлҹ¬лӮҙкё° мқјм‘ӨмҳҖлӢӨ.В лҒҢ лӘЁм–‘мқҳ кёёмӯүн•ң мІӯлҸҷ л¬ёкі лҰ¬лҘј мһЎм•„лӢ№кё°мһҗ мҢүмӢёлҰ„н•ҳл©ҙм„ңлҸ„ л§Өмәҗн•ң лғ„мғҲк°Җ н’ҚкІЁмҷ”лӢӨ. лӮҙл¶ҖлҠ” м§ҖлӮңлІҲм—җ л“Өл Җмқ„ л•ҢліҙлӢӨ нӣЁм”¬ н•ңмӮ°н–ҲлӢӨ. мҶҗлӢҳмқҖ м•„л¬ҙлҸ„ м—Ҷм—Ҳм§Җл§Ң, лҚ°ліёмқҙ кұ°мқҳ нғҒмһҗ нҒ¬кё°л§Ң н•ң мҲ нҶөмқ„ м•ҲмқҖ мұ„лЎң кұём–ҙ лӢӨлӢҲлҠ” лӘЁмҠөмқ„ м§Җмјңліҙкі мһҲл…ёлқјл©ҙ нҷңкё°м°¬ лҠҗлӮҢл§Ҳм Җ л“Ө м§ҖкІҪмқҙм—ҲлӢӨ. л¬ёмқ„ м—ҙкі л“Өм–ҙм„ңл©ҙ л°”лЎң ліҙмқҙлҠ” лІҪк°җм—җлҠ” мҰқлҘҳмЈј лі‘мқҙ мһ”лң© 진м—ҙлҸј мһҲм—ҲлӢӨ. мЎұнһҲ мү° к°ңлҠ” л„ҳм–ҙ ліҙмқҙлҠ” мқҳмһҗл“ӨмқҖ мҷјнҺё кө¬м„қм—җ мң„м•„лһҳк°Җ л§һл¬јлҰ¬кІҢ мҢ“м•„лҶЁкі , л°ҳлҢҖнҺё кө¬м„қм—җлҠ” нғҒмһҗл“Өмқ„ мЈ„лӢӨ лӘ°м•„лҶЁлӢӨ. м Җ кұ°кө¬м—җм„ң лӮҳмҳӨлҠ” нһҳл§Ң ліҙмһҗл©ҙ, м•„л§Ҳ мһҗмҡём№ҳмҷҖ л§ЁмҶҗмңјлЎң мӢёмҡҙлҢҖлҸ„ мқҙкёё кІҢ нӢҖлҰјм—ҶлӢӨ.В В "мҷ”мңјл©ҙ мқёмӮ¬лқјлҸ„ н•ҳлҚҳк°Җ, л©ҖлҡұнһҲ м„ңм„ң мҳӣлӮ мғқк°ҒмқҙлқјлҸ„ н•ҳлҠ” кұ°м•ј?" лҚ°ліёмқҖ м№ҙмҡҙн„° м•„лһҳм—җ 비лӘ…лӘ© мҲ нҶөмқ„ мҝө лӮҙл ӨлҶ“кі л§ҢмЎұмҠӨлҹ¬мҡҙ лҲҲкёёлЎң л°”лқјліҙлӢӨ, л¬ёк°„м—җ кё°лҢҖм–ҙ м„ лӮҳлҘј л°ңкІ¬н•ҳкі лҠ” мҶҗмқ„ нҲӯнҲӯ н„ёл©ҙм„ң лҠҘмІӯмқ„ л–Ём—ҲлӢӨ. л§Ўкёё мқјмқҙ мғқкІјлӢӨлҠ” мҶҢлҰ¬лӢӨ.В "лҳҗ мҳ¬к°ҖлҜё л•Ңл¬ём—җ н—Ҳнғ• міӨлӢөлӢҲк№Ң? к·ёлһҳм„ң лӮҙк°Җ к·ё м–‘л°ҳл“ӨмқҖ м•Ҳ лҗңлӢӨкі н–Ҳмһ–м•„мҡ”. кі к°Җ н’ҖлҰ¬лҠ” кІғ м•„лӢҲл©ҙ м“°лҠ” мҶҗмқҙ л¬ём ңлқјлӢҲк№Ң..." лҚ°ліёмқҳ мһ…кј¬лҰ¬к°Җ мӢӨлЈ©кұ°л ёлӢӨ. м•„мү¬мҡҙ мӘҪмқҙ мҳҲмқҳлҘј м°ЁлҰ¬кё° л§Ҳл ЁмқҙлӢҲ, нҸүмҶҢмҳҖлӢӨл©ҙ л°°к°Җ л’Ө집м–ҙм§ҖлҸ„лЎқ мӣғм–ҙлҢ”мқ„ кІҢ л»”н•ҳлӢӨ. "м•„мқҙкө¬ мқҙ м№ңкө¬, лӮҳл§ҢнҒј мһҗл„Ө мҶңм”Ё мўӢмқҖ кұ° мһҳ м•„лҠ” мӮ¬лһҢмқҙ лҳҗ м–ҙл”ЁлӮҳ? м§ҖлӮңлІҲ к·ёкұҙ к·ёлғҘ мӮ¬мҶҢн•ң мӢӨмҲҳмҳҖм§Җ. м•”, к·ёл Үкі л§җкі . мқҙлІҲм—” мҳ¬к°ҖлҜё л§җкі нҺҳмқёмқҙ н•„мҡ”н•ҳлӢӨлҠ”лҚ°, кҙҖмӢ¬ мһҲлӮҳ?" "м Җ л§җн•ҳлҠ” кІҒлӢҲк№Ң? н—Өм—„лҸ„ лӘ» м№ҳлҠ” мӮ¬лһҢмқ„ мӮ¬лғҘм„ м—җ нғңмҡҙлӢӨкі мҡ”?" "н—Өм—„мқ„ лӘ» м№ҳлӢҲк№Ң л°°м—җ нғңмӣҢм„ң лҚ°л Өк°„лӢӨлҠ” кұ° м•„лӢҲкІ лӮҳ." лҚ°ліёмқҖ мӢұкёӢ мӣғмңјл©° м–‘мҶҗмқ„ л“Өм–ҙ мқјкіұ н‘ңмӢңлҘј н•ҳлҚ”лӢҲ мқҙм–ҙм„ң мғҲлҒјмҶҗк°ҖлқҪмқ„ л“Өм–ҙ ліҙмҳҖлӢӨ. л°”лӢӨ кҙҙл¬ј мӮ¬лғҘм—җ л¬јкёёмқ„ мһҳ м•„лҠ” мқҙлӮҳ лӮҳ к°ҷмқҖ м•јкіө, мӢ¬м§Җм–ҙлҠ” м җмҹҒмқҙл“Өк№Ңм§Җ нғңмҡ°лҠ” кІҪмҡ°к°Җ м•„мҳҲ м—ҶлҠ” кұҙ м•„лӢҲлӢӨ. н•ҳм§Җл§Ң ліҙнҶө мһ‘мӮҙмһЎмқҙл“Өмқҙ н•ң лІҲ м¶ңн•ӯн•ҙ м§Җкёүл°ӣлҠ” ліҙмҲҳліҙлӢӨ л§ҺмқҖ м•ЎмҲҳлҘј к·ёлҹ° кіҒлӢӨлҰ¬л“Өм—җкІҢ м§Җкёүн•ңлӢӨлҠ” кұҙ, мқҙлІҲ кұҙмқҙ лӯҗк°Җ лҗҗл“ м•„мЈј л¶Ҳкёён•ҳкұ°лӮҳ м•„мЈј кі лҗ кұ°лқјлҠ” м–ҳкё°лӢӨ.В В "мЈјмұ…м—ҶлҠ” мҶҢлҰ¬кёҙ н•ңлҚ°, л©”лҰҙ мғқк°ҒлҸ„ н•ҙм•јм§Җ м•ҠкІ лӮҳ. м—¬кё° мһҲлҠ” 꼬맹мқҙлҠ” кі мӮ¬н•ҳкі м§‘м—җ мһҲлҠ” л‘җ л…Җм„қ нӮӨмҡ°лҠ” кІғл§Ң н•ҙлҸ„ м•„л§Ҳ л“ұкіЁмқҙ нң н…ҢлӢҲк№Ң, м•„н•ҳн•ҳ!" "к·ёкІғлҸ„ л¶ҖнқҗлЈЁмӢқ лҶҚлӢҙмһ…лӢҲк№Ң? к·ёлһҳм„ң, м–ҙл””лЎң к°„лҢҖмҡ”?" мӣғмқҢкё°лҘј мӢ№ кұ°л‘” лҚ°ліёмқҖ л‘җ мҶҗк°ҖлқҪмңјлЎң лҜёк°„мқ„ мҠҘ л¬ём§ҖлҘҙлҚ”лӢҲ кіјн•ҳкІҢ лӮҙлҰ¬к№җ лӘ©мҶҢлҰ¬лЎң мӨ‘м–јкұ°л ёлӢӨ. "л””м–ҙл©”мқё." н‘ёлҘё л¶ҲкҪғ м ңлҸ„ лӮЁм„ңмӘҪм—җ мһҗлҰ¬мһЎмқҖ мҗҗкё°кј¬лҰ¬ кі¶м—җлҠ” л°ңлЎңлһҖкіј мҲҳнҳёмһҗмқҳ л°”лӢӨ к·ёлҰ¬кі л№Ңм§ҖмӣҢн„°лҘј мҳӨк°ҖлҠ” мҲҳл§ҺмқҖ мғҒм„ кіј мӮ¬лғҘм„ л“Өмқҙ м •л°•н•ҳкіӨ н•ңлӢӨ. к·ёлҰ¬кі л°”лӢӨлұҖмқҖм»Өл…• кұ°м№ң нҢҢлҸ„ н•ң лІҲ кІӘм–ҙліё м Ғ м—ҶлҠ” лӮҙлҘҷмқёл“Өмқҙкұҙ к°Ҳкі лҰ¬мҷҖ мҳ¬к°ҖлҜёлҘј нңҳл‘җлҘҙлҠ” лҚ° мқҙкіЁмқҙ лӮң лІ н…Ңлһ‘ мһ‘мӮҙмһЎмқҙкұҙ, лҲ„кө¬л“ м Җ л©ҖлҰ¬м„ң кё°кҙҙн•ҳкІҢ мҶҹмқҖ л°”лӢӨлұҖ лҝ”мқҳ мңӨкіҪмқ„ м–ҙл ҙн’Ӣн•ҳкІҢлӮҳл§Ҳ нҸ¬м°©н•ҳкІҢ лҗҳл©ҙ л№Ңм§ҖмӣҢн„°мқҳ л¶Ҳл№ӣмқҙ к°Җк№ҢмӣҢмЎҢлӢӨлҠ” кІғмқ„ м§Ғк°җн•ҳл©° н•ңмӢңлҰ„ лҶ“лҠ” кІғмқҙлӢӨ. л¬јлЎ мқҙкІғмқҖ к°җнһҲ м •н•ҙ진 н•ӯлЎң л°”к№ҘмңјлЎң нӮӨлҘј лҸҢлҰҙ мҡ©кё°к°Җ м—ҶлҠ” кІҒмҹҒмқҙл“Өм—җкІҢл§Ң н•ҙлӢ№н•ҳлҠ” мқҙм•јкё°лӢӨ.В н•ҳл җ н•ӯл§Ң мң„мӘҪм—җ мң„м№ҳн•ң л°”лӢӨлұҖ мӮјк°ҒмЈјлҠ” мһ”лјҲк°Җ көөмқҖ л№Ңм§ҖмӣҢн„° нҶ л°•мқҙ лұғмӮ¬лһҢл“ӨмЎ°м°Ё к·ё м•…лӘ…лҶ’мқҖ к·ёлҰјмһҗ кө°лҸ„к°Җ лҠҳм–ҙм„ лӮЁлҸҷл¶Җл§ҢнҒјмқҙлӮҳ м ‘к·јн•ҳкёё кәјлҰ¬лҠ” кіімқҙлӢӨ. мҶҢл¬ё, кҙҙлӢҙ, м „м„Ө, лӯҗлқјкі л¶ҖлҘјм§ҖлҠ” м•Ңм•„м„ң кі лҘҙмӢңкё°лҘј. к·ёкұё м§Ғм ‘ нҷ•мқён• мҲҳ мһҲмқ„ м •лҸ„лЎң к°Җк№Ңмқҙ к°„лӢӨл©ҙ м•„л§Ҳ мЈҪмқҢмқҙ лӢ№мӢ мқ„ кі лҘј н…ҢлӢҲк№Ң. нҮҙм Ғ м§Җнҳ•мқҳ мҳҒн–ҘмңјлЎң л°ңмғқн•ҳлҠ” мқҙмғҒ н•ҙлҘҳк°Җ мӣҗмқёмқҙлқјлҠ” л§җлҸ„ мһҲм§Җл§Ң, м• м„қн•ҳкІҢлҸ„ лӮҳлҠ” н•ҙм–‘н•ҷмһҗк°Җ м•„лӢҲлӢӨ. мӮ¬мӢӨ лӘҮ л…„ м „, м„ңлӮЁмӘҪ н•ӯлЎңлҘј лӢЁм¶• к°ңм„ н•ңлӢӨлҠ” лӘ…лӘ©н•ҳм—җ мҡ©л§№н•ң м„ кө¬мһҗл“Ө м—¬м„Ҝмқҙ м¶ңн•ӯн•ң м Ғмқҙ мһҲкёҙ н–ҲлӢӨ. л°°мқҳ мқҙлҰ„мқҙ лӯҗмҳҖлғҗкі ? м§ҖкёҲмҜӨ л°ұкіЁмқҙ лҗҳм–ҙ м Җ к№ҠмқҖ кіі м–ҙл”ҳк°Җ лҲ„мӣҢмһҲмқ„ лЁёнҠј л””м–ҙл©”мқём—җкІҢ л¬јм–ҙліҙлқј.В В "лҚ°ліё, лӮҙк°Җ мҷң лӢ№мӢ мқҙлһ‘мқҖ м Җ м•„лһҳм—җ мһҲлҠ” л©ҚмІӯмқҙл“Өкіј лӢ¬лҰ¬ н—Ҳл¬јм—Ҷмқҙ м§ҖлӮҙлҠ”м§Җ м•Ңм•„мҡ”?"В лҠҗлӢ·м—Ҷмқҙ кҫёлҘҙлҘөкұ°лҰ¬лҠ” мІңл‘Ҙ мҶҢлҰ¬к°Җ л“ӨмқҙлӢҘміӨлӢӨ. лҚ°ліёмқҖ л§Ҳм№ҳ к·ёкІҢ к·№м Ғмқё мһҘм№ҳлқјлҸ„ лҗҳкі лҳҗ кұ°кё°м—җ л¶Җмқ‘мқҙлқјлҸ„ н•ҳл ӨлҠ” м–‘, лӮҙк°Җ м§ҖкёҲк»Ҹ лҙҗмҷ”лҚҳ кІғ мӨ‘м—җм„ң к°ҖмһҘ мҡ°мҠӨкҪқмҠӨлҹ¬мҡҙ н‘ңм •мңјлЎң лҢҖлӢөн–ҲлӢӨ. мң мҫҢн•ң м–‘л°ҳмқҙм•ј, м •л§җлЎң н•ң лҢҖл§Ң кұ·м–ҙм°Ё лҙӨмңјл©ҙ. "нҸүмғқмқ„ к°ҖлҸ„ лӘ» л§ҢлӮҳліј н„°н”„н•ң лҶҲл“Өмқҙлһ‘ м—®м–ҙ мЈјкі , лҒқлӮҙмЈјлҠ” мҡ”лҰ¬ мҶңм”ЁлҘј к°Җ진 лҚ°лӢӨк°Җ, л°”лӢӨлұҖ мқҖнҷ” м№ л°ұ лӢўмқҙ кұёлҰ° кұҙмқ„ мҘҗм—¬мЈјл©ҙм„ңлҸ„ мқјнқ” лӢўл°–м—җ м•Ҳ л–ј к°Җм„ң?" "л©ҚмІӯн•ң мҶҢлҰ¬лҘј н•ҳлҠ” лІ•мқҙ м—Ҷм—Ҳкұ°л“ мҡ”. лҒқлӮҙмЈјл„Өмҡ”, мҳӨлҠҳ мІҳмқҢмңјлЎң лІҢмҚЁ л‘җ лІҲмқҙлӮҳ н•ҳм…Ём–ҙмҡ”." "мһҗл„Ё лҸ„нҶө л№Ңм§ҖмӣҢн„° мӮ¬лӮҙ к°ҷм§Җк°Җ м•Ҡм•„. м Җкё° н•Ҹл№ӣ н•ӯкө¬ л¶Җл‘җ мҘҗл“Өмқҙ мһҗл„ӨліҙлӢЁ лҚ” мҡ©к°җн• кұё." "мҡ©кё°мҷҖ л§Ңмҡ©мқ„ кө¬л¶„н•ҳ..." "лӮҳ мӣҗ, м•Ңм•ҳмңјлӢҲк№Ң лҢҖлӢөн•ҳкё° м „м—җ мқҙкұ°лӮҳ мһЎмҲҙ лҙҗ." л№Ңм§ҖмӣҢн„°мқҳ лҢҖмһҘмһҘмқҙл“ӨмқҖ н”ј лғ„мғҲлҘј л§Ўмқ„ мқјмқҙ м—ҶлӢӨкіӨ н•ҳм§Җл§Ң, мҗҗкё°кј¬лҰ¬ мҡ”лҰ¬лҘј л§ӣліҙл©ҙ к·ёкІҢ м–јл§ҲлӮҳ кө¬мӢңлҢҖм Ғмқё л§җмһҘлӮңмқём§Җ лӢӨмӢңкёҲ мғқк°Ғн•ҳкІҢ лҗңлӢӨ. мқҙ лҶҲл“ӨмқҖ кІүлӘЁмҠөмқҙ л¶Җл‘җ мҘҗлҘј лӢ®м•ҳм§Җл§Ң, к°Ҳкё°н„ёкіј лӢӨлҰ¬к°Җ м—Ҷкі кј¬лҰ¬м—җ мң лҸ… м§Җл°©мқҙ к°Җл“қн•ҳлӢӨлҠ” м җм—җм„ң мӮ¬лһ‘л°ӣлҠ”лӢӨлҠ” н‘ңнҳ„мқҙ м–ҙмҡёлҰ°лӢӨкі н• мҲҳ мһҲлҠ” мғқл¬јмқҙлӢӨ. лҚ°ліёмқҖ мҗҗкё°кј¬лҰ¬ лҚ©м–ҙлҰ¬к°Җ м•„лӢҲлқј мҡ”лҰ¬лҘј л§Ңл“Өм–ҙлӮј мҲҳ мһҲлҠ” мң мқјн•ң мӮ¬лһҢмқҙлӢӨ. м Ғм–ҙлҸ„ л№Ңм§ҖмӣҢн„°м—җм„ңлҠ”. лҚ°ліёмқҖ м№ҙмҡҙн„° л’ӨлЎң л„ҳм–ҙк°ҖлҚ”лӢҲ м–‘ мҶҗм—җ мҗҗкё°кј¬лҰ¬ н•ң л§ҲлҰ¬лҘј нҶөм§ёлЎң л“Өкі лҸҢм•„мҷ”лӢӨ.В "мқҙкІҢ л°”лЎң л””м–ҙл©”мқё к·јмІҳм—җм„ң мһЎмқҖ мҗҗкё°кј¬лҰ¬м•ј." "к·јн•ҙм—җм„ңл§Ң мһЎнһҲлҠ” лҶҲл“Ө м•„лӢҲм—ҲмҠөлӢҲк№Ң? лҶҚлӢҙн•ҳлҠ” кұ°мЈ ?" "л°”лӢӨлұҖ мӮјк°ҒмЈјлҠ” л¬ҙмҠЁ нҺҳнҠёлҰ¬мӮ¬мқҙнҠёлқјлҸ„ мҢ“м—¬м„ң л§Ңл“Өм–ҙ진 мӨ„ м•„лҠ”к°Җ? к·ёкұҙ к·ёл Үкі лҳҗ мҳӨкё°лЎң н•ң м№ҳк°Җ мһҲлҠ”лҚ°, лҸ„нҶө м–ём ң лҸ„м°©н• лҠ”м§Җ." "лӮҳ л§җкі лҲ„көҙ лҳҗ л¶Ҳл Җм–ҙмҡ”? м–ҙмЁҢл“ , мҗҗкё°кј¬лҰ¬ мўҖ лЁ№м–ҙліҙкІ лӢӨкі мқёк°„ лӢ» лҗ мғқк°ҒмқҖ м—ҶмҠөлӢҲлӢӨ. к·ёлҹ° мӨ„ м•„м„ёмҡ”." "мңјг…Ўнқ ." лҚ°ліё л§җл§Ҳл”°лӮҳ лӮҳк°Җм№ҙліҙлЎңмҠӨлӢҳк»ҳ 맹세컨лҢҖ, лҲ„кө°к°Җ мһҘлӮңм§Ҳмқ„ н•ҳлҠ” кІҢ нӢҖлҰјм—ҶлӢӨ. мІҳмқҢмқҖ лҚ°ліё, л‘җ лІҲм§ёлҠ” мӣ¬ л…ёнҒ¬н• мӨ„лҸ„ лӘЁлҘҙлҠ” мһ‘мӮҙмһЎмқҙ м—¬мһҗлқј. м„ё лІҲм§ё мІңл‘Ҙмқҙ м№ҳл©ҙ лӮҙ мһ…м—җм„ң л””м–ҙл©”мқё нғҗмӮ¬нҳё лӯҗмӢңкё°м—җ лҸҷн–үн•ҳкІ лӢӨлҠ” мҶҢлҰ¬к°Җ лӮҳмҳӨкёё л°”лқјкё°лқјлҸ„ н•ҳлҠ” кұҙк°Җ? м•„лӢҲ, к·ёкұҙ м•„лӢҲм§Җ. лҲ„кө°м§„ лӘ°лқјлҸ„ лӮ л„Ҳл¬ҙ м–•лҙӨлӢӨ. лӮ л„Ҳл¬ҙ кіјмҶҢнҸүк°Җн•ң кұ°лӢӨ.В
EXP
5,228
(7%)
/ 5,6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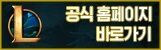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wheresmyown
wheresmy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