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5-10 20:27
мЎ°нҡҢ: 884
추мІң: 0
[м•јмҠӨмҳӨxмҶҢлӮҳ] м„ мңЁмқҖ л°”лһҢмқ„ нғҖкі # н”„лЎӨлЎңк·ёвҖҳлӮң лҚ” мқҙмғҒ л„җ лӮҙ мЈјмқёмңјлЎң мқём •н•ҳм§Җ м•Ҡм•„.вҖҷ вҖҳк·ёлҸҷм•Ҳ мўӢм•ҳмһ–м•„, к·ёл Үм§Җ?вҖҷ вҖҳк·ёлҹ¬лӢҲ мқҙм ңлҠ”, лӮҙк°Җ л„Ө мЈјмқёмқҙ лҗ м°ЁлЎҖм•ј.вҖҷ В мҶҢлӮҳлҠ” мҳЁлӘёмқҙ л•ҖмңјлЎң м –мқҖ мұ„ н—ҲлҰ¬лҘј мқјмңјмј°лӢӨ. мқҙл¶ҲмһҗлқҪмқ„ кјӯ л¶ҷмһЎкі мһҲлҠ” мҶҗмқҖ мЎ°кёҲлҸ„ л©Ҳ추м§Җ м•Ҡкі л¶Җл“Өл¶Җл“Ө л–ЁлҰ¬кі мһҲм—ҲлӢӨ. л§қм№ҳлЎң л‘җл“ӨкІЁ л§һкё°лқјлҸ„ н•ң л“Ҝ лЁёлҰ¬лҠ” кі„мҶҚн•ҙм„ң мҡұмӢ кұ°л ёкі , кёҙмһҘмңјлЎң мһ”лң© мң„축лҗң мӢ¬мһҘмқҖ л§Ҳм№ҳ н„°м§Ҳ кІғмІҳлҹј мҝөмҫ…лҢ”лӢӨ. В л‘җнҶөмқҖ мЎ°кёҲлҸ„ к°Җлқјм•үмқ„ мғқк°Ғмқ„ н•ҳм§Җ м•Ҡм•ҳлӢӨ. м•Ҳк°ң мҶҚм—җ л‘ҳлҹ¬мҢ“мқё кІғмІҳлҹј мӢңм•јк°Җ лҝҢм–¬лӢӨ. лҲҲмқ„ к°җмқҖ кІғл§Ң лӘ»н•ң мғҒнҷ©м—җм„ң мҶҢлӮҳлҠ” мҶҗмңјлЎң мЈјліҖмқ„ лҚ”듬м—ҲлӢӨ. к°Җк№ҢмҠӨлЎң лһЁн”„мқҳ мӨ„мқ„ м°ҫм•„лӮё мҶҢлӮҳлҠ” м–јл§Ҳ м—ҶлҠ” кё°л ҘмңјлЎң мӨ„мқ„ мһЎм•„лӢ№кІјлӢӨ. к·ём ңм„ңм•ј л°© м•Ҳмқҙ м„ңм„ңнһҲ л°қм•„м§Җкё° мӢңмһ‘н–ҲлӢӨ. В мЈјліҖмқҖ м•„л¬ҙкІғлҸ„ лӢ¬лқјм§„ кІғмқҙ м—Ҷм—ҲлӢӨ. м–ём ңлӮҳ лҳ‘к°ҷмқҖ мң„м№ҳм—җ лҶ“м—¬мһҲлҠ” к°Җкө¬л“Ө, к·ёлҰ¬кі мұ…л“Ө. мҶҢлӮҳлҠ” мІңмІңнһҲ мҶҗмңјлЎң к°ҖмҠҙнҢҚмқ„ кҫ№ лҲҢл ҖлӢӨ. л¬ҙм–ёк°Җк°Җ м–№нһҢ л“Ҝ к·ём Җ лӢөлӢөн–ҲлӢӨ. н•ңм°ёмқҙ м§ҖлӮҳкі лӮҳм„ңм•ј кІЁмҡ° м§„м •н• мҲҳ мһҲм—ҲлҚҳ мҶҢлӮҳлҠ” кі°кі°нһҲ к·ёл…Җк°Җ кҫј кҝҲм—җ лҢҖн•ҙ мғқк°Ғм—җ мһ кІјлӢӨ. В лҲ„кө°к°Җмқҳ лӘ©мҶҢлҰ¬мҳҖлӢӨ. м„ұлі„мқҙ лӯҗмҳҖлҠ”м§Җ, л¬ҙмҠЁ л§җмқ„ н–ҲлҠ”м§ҖлҠ” кё°м–өлӮҳм§Җ м•Ҡм•ҳлӢӨ. лӢЁ н•ң к°Җм§Җ кё°м–өлӮҳлҠ” кІғмқҖ мһҲм—ҲлӢӨ. л¶Ҳм•Ҳм—җ л– лҠ” к·ё м–ҙл–Ө мЎҙмһ¬лқјлҸ„ нҺём•Ҳн•ҳкІҢ л§Ңл“Ө кІғ к°ҷмқҖ мҳЁнҷ”н•Ёкіј, к°•мІ л§Ҳм ҖлҸ„ лІ м–ҙлІ„лҰҙ кІғ к°ҷмқҖ лӮ м№ҙлЎңмӣҖмқҙ, кіөнҸ¬к°Җ к·ё лӘ©мҶҢлҰ¬ м•Ҳм—җм„ң кіөмЎҙн•ҳкі мһҲм—ҲлӢӨ. В л¬ҙмҠЁ л§җмқ„ н•ҳл Өкі н–ҲлҚҳ кІғмқјк№Ң. л¬ҙм–ёк°ҖлҘј кІҪкі н•ҳл Өкі н•ң кІғмқјк№Ң, м•„лӢҲл©ҙ лӢЁмҲңн•ң м•…лӘҪмқҙм—ҲлҚҳ кІғмқјк№Ң. к·ёлҸ„ м•„лӢҲлқјл©ҙ к·ём Җ, мҠӨміҗ м§ҖлӮҳк°ҖлҠ” н•ҳлӮҳмқҳ кҝҲмқҙм—ҲлҚҳ кІғмқјк№Ң. В мҶҢлӮҳлҠ” м–•мқҖ н•ңмҲЁмқ„ лӮҙмү¬м—ҲлӢӨ. кі мһ‘ кҝҲ н•ҳлӮҳм—җ мқҙл ҮкІҢ нңҳл‘ҳлҰ¬лӢӨлӢҲ, к·ём Җ кё°мҡ°мқј лҝҗмқјн…җлҚ°. к·ёл ҮкІҢ мғқк°Ғн•ҳл©ҙм„ңлҸ„ мҶҢлӮҳлҠ” м–‘нҢ”лЎң к·ёл…Җмқҳ лӘёмқ„ к°җмӢём•Ҳм•ҳлӢӨ. м—¬м „нһҲ кәјлҰјм№ҷн•Ёмқҙ к°ҖмӢңм§ҖлҘј м•Ҡм•ҳлӢӨ.В В В нһҗкёӢ м°Ҫл°–мқ„ л°”лқјлҙӨмңјлӮҳ л°–мқҖ мқҙм ң л§ү лҸҷмқҙ нҠёл Ө н•ҳкі мһҲм—ҲлӢӨ. нҸүмҶҢліҙлӢӨ мқҙлҘё мӢңк°Ғм—җ мқјм–ҙлӮҳкІҢ лҗң кІғлҸ„ кҝҲ л•Ңл¬ёмқҙлқј мғқк°Ғн•ҳлӢҲ кәјлҰјм№ҷн•Ёмқҙ л°°к°Җ лҗҳм—ҲлӢӨ.В В к·ёлҹ¬лӮҳ мҶҢлӮҳлҠ” лҸ„лҰ¬лҸ„лҰ¬ кі к°ңлҘј лӮҙм Җм—ҲлӢӨ. мқҙ мқҙмғҒ мғқк°Ғн•ҙлҙӨмһҗ м“ёлҚ°м—ҶлҠ” 짓мқј кІғмқҙлӢӨ. н•ҳлӮҳмқҳ кё°мҡ°лқј м—¬кё°кі л„ҳкё°л©ҙ лҗҳлҠ” мқјмқҙм—ҲлӢӨ. к·ёл ҮкІҢ мғқк°Ғн•ҳл©° м№ЁлҢҖ л°‘мңјлЎң л§ү л°ңмқ„ лӮҙл”ӣлҠ” мҲңк°„мқҙм—ҲлӢӨ. В мҫ… В к°‘мһ‘мҠӨл Ҳ л“Өл ӨмҳӨлҠ” мҶҢлһҖм—җ мҶҢлӮҳлҠ” нқ 칫 лҶҖлқј м•һмқ„ л°”лқјлҙӨлӢӨ. мӢңл…Җ н•ң лӘ…мқҙ н—ҲлҰ¬лҘј мҲҷмқё мұ„ м—°мӢ мҲЁмқ„ лӘ°м•„мү¬кі мһҲм—ҲлӢӨ. көүмһҘнһҲ кёүн•ҳкІҢ мқҙ кіімқ„ м°ҫм•„мҳЁ кІғ к°ҷм•ҳлӢӨ. вҖңм•„, м•„к°Җм”Ё. нҒ°мқјмһ…лӢҲлӢӨ.вҖқ В мҶҢлӮҳлҠ” нғҒмһҗ мң„м—җ лҶ“м—¬мһҲлҠ” л¬јлі‘мқ„ мЎ°мӢ¬мҠӨл Ҳ 집м–ҙм„ мӢңл…Җм—җкІҢ кұҙл„ёлӢӨ. мӢңл…ҖлҠ” к°җкІ©мҠӨлҹ¬мҡҙ н‘ңм •мңјлЎң л¬јлі‘мқ„ л°ӣм•„л“Өкі лҠ” н•ҳлЈЁмў…мқј л¬ј н•ң л°©мҡё л§ҲмӢңм§Җ лӘ»н•ң мӮ¬лһҢмІҳлҹј л¬јмқ„ л§Ҳм…ЁлӢӨ. В м§„м •мқҙ мўҖ лҗ¬лҠ”м§Җ мӢңл…ҖлҠ” м•„к№ҢліҙлӢӨ нӣЁм”¬ мқјм •н•ҙ진 нҳёнқЎмңјлЎң мҶҢлӮҳмқҳ м•һм—җм„ң кі к°ңлҘј мҲҷмҳҖлӢӨ. мҶҢлӮҳлҠ” л¬ҙмҠЁ мқјмқҙлғҗлҠ” л“Ҝмқҙ кі к°ңлҘј к°ёмӣғкұ°л ёлӢӨ.В вҖңм—җнҠёмҷҲмқҙ мӮ¬лқјмЎҢмҠөлӢҲлӢӨ!вҖқ В к·ёлҰ¬кі мӢңл…Җмқҳ мһ…м—җм„ң лӮҳмҳЁ л§җм—җ, мҶҢлӮҳмқҳ м–јкөҙмқҖ лҚ”м—Ҷмқҙ м°Ҫл°ұн•ҙм§Җкі л§җм•ҳлӢӨ. * * * * * вҖңмҜ§.вҖқ В м•јмҠӨмҳӨлҠ” мҲ лі‘мқ„ кұ°кҫёлЎң л“Өм–ҙ нғҲнғҲ нқ”л“Өм—ҲлӢӨ. кІЁмҡ° лӮҳмҳЁ н•ң л°©мҡёмқҙ к·ёмқҳ мһ…м•ҲмңјлЎң мӮ¬лқјм§Җмһҗ, м•јмҠӨмҳӨлҠ” л“Өкі мһҲлҚҳ лі‘мқ„ н—ҲлҰ¬м¶©м—җ лӢӨмӢң нңҳк°җм•ҳлӢӨ.В вҖңм—¬кёҙ м–ҙл””м•ј.вҖқ В мӮ¬л°©мқҙ м „л¶Җ лӮҳл¬ҙм—җ л‘ҳлҹ¬мҢ“м—¬ мһҲлӢӨліҙлӢҲ лҸ„м ҖнһҲ м–ҙл””лЎң к°Җм•јн• м§Җ м•Ңм§Җ лӘ»н–ҲлӢӨ. м•јмҠӨмҳӨлҠ” н•ңлҸҷм•Ҳ к·ё мһҗлҰ¬м—җ м„ңм„ң м •л©ҙмқ„ мқ‘мӢңн•ҳлӢӨ к·ёлҢҖлЎң л°ңкұёмқҢмқ„ мҳ®кІјлӢӨ. м–ҙл””лЎң к°Җл“ кёёмқҖ лӮҳмҳ¬ кІғмқҙкі , к·ё кёёмқ„ к°ҖлӢӨліҙл©ҙ лӢӨлҘё л¬ҙм–ёк°Җк°Җ лҳҗ лӮҳмҳ¬н…ҢлӢҲк№Ң. к·ёлҹ¬лӢӨліҙл©ҙ м–ём к°Җ м–‘мЎ°мһҘлҸ„ лӮҳмҳӨм§Җ м•Ҡмқ„к№Ң. В мҡём°Ҫн•ң мҲІмқ„ кұ°лӢҲлҠ” 기분мқҖ мғҒлӢ№нһҲ мғҒмҫҢн–ҲлӢӨ. лӮҳлӯҮмһҺл“Ө мӮ¬мқҙлЎң л¶Җм„ңм ё л“Өм–ҙмҳӨлҠ” н–Үл№ӣлҸ„, к°„к°„нһҲ л“Өл ӨмҳӨлҠ” мғҲл“Өмқҳ мҡёмқҢмҶҢлҰ¬лҸ„ мҲ мқҙ лӢӨ л–Ём–ҙм ё к°Җлқјм•үм•„лІ„лҰ° к·ёмқҳ 기분мқҙ лҚ” мқҙмғҒ к°Җлқјм•үм§Җ м•ҠлҸ„лЎқ н•ҙмЈјм—ҲлӢӨ. вҖңмқҙлҙҗ! кұ°кё° мһ к№җ!вҖқ В м•јмҠӨмҳӨлҠ” м–ҙл””м—җм„ к°Җ л“Өл ӨмҳӨлҠ” лӘ©мҶҢлҰ¬м—җ л°ңкұёмқҢмқ„ л©Ҳм·„лӢӨ. л“Өл ӨмҳӨлҠ” л°©н–Ҙмқҙ м–ҙл””мқём§ҖлҠ” 진мһ‘м—җ м•Ңкі мһҲм—ҲлӢӨ. кё°мІҷмқ„ мҲЁкёё мӨ„лҸ„ лӘЁлҘҙлҠ” н—Ҳм ‘н•ң лҸ„м Ғл–јмқҙм§Җл§Ң, к·ёмқҳ мҶҗмқҖ мқҙлҜё кІҖмқҳ мҶҗмһЎмқҙм—җ н–Ҙн•ҙмһҲм—ҲлӢӨ. вҖңлӢ№мӢ , м–ҙл””м—җм„ң мҳӨлҠ” кёёмқҙм§Җ?вҖқ В кұҙл“Өкұ°лҰ¬лҠ” кұёмқҢкұёмқҙм—җ лҢҖлҶ“кі м–ҙк№Ём—җ л‘ҳлҹ¬л©”кі мһҲлҠ” м»ӨлӢӨлһҖ м№ј. лӢЁмҲңнһҲ м Җк°Җ мң„нҳ‘м Ғмқё мЎҙмһ¬лқјлҠ” кІғмқ„ м•Ңл ӨмЈјкё° мң„н•ң н—Ҳм„ёмҳҖлӢӨ. м•јмҠӨмҳӨлҠ” мғҒлҢҖн•ҙмӨҳм•јн• к°Җм№ҳмЎ°м°Ё лҠҗлҒјм§Җ лӘ»н–Ҳм§Җл§Ң, к°„л§Ңм—җ л§ҢлӮҳкІҢ лҗң мӮ¬лһҢл“Өмқҙм—Ҳкё°м—җ мөңлҢҖн•ң м№ңм Ҳн•ҳкІҢ лҢҖн•ҙмЈјлҰ¬лқј мғқк°Ғн–ҲлӢӨ. вҖңм•Ңм•„м„ң лӯҗн•ҳл Өкі .вҖқ В мөңлҢҖн•ң м№ңм Ҳн•ҳкІҢ лҢҖн•ҙмӨ¬лӢӨкі мғқк°Ғн–ҲлҠ”лҚ°, мғҒлҢҖлҠ” м•„лӢҢ лӘЁм–‘мқҙм—ҲлӢӨ. м ңк°Ғкё° лӢӨлҘё мҡ•м„Өмқ„ лӮҙлұүмңјл©° м Җл“Өмқҙ к°Җ진 л¬ҙкё°лҘј л“Өкі нҒ¬кІҢ нңҳл‘җлҘҙкё° мӢңмһ‘н–ҲлӢӨ.В вҖңмһ„л§Ҳ. м–ҙл””м„ң көҙлҹ¬л“Өм–ҙмҳЁ лјҲлӢӨк·Җмқём§ҖлҠ” лӘЁлҘҙкІ лҠ”лҚ°. мҡ°лҰ¬к°Җ мӢңн‘ё лҸ„м ҒлӢЁмқҙлқјлҠ”кұё лӘЁлҘҙм§ҖлҠ” м•ҠкІ м§Җ?вҖқ вҖңк·ёкұҙ лҳҗ лӯҗм§Җ.вҖқ В н•ңлӮұ лҸ„м Ғ мЈјм ңм—җ мӢңн‘ёлқјлҠ” кұ°м°Ҫн•ң мқҙлҰ„к№Ңм§Җ л¶ҷм—¬к°Җл©° нҷңлҸҷн•ңлҢ„лӢӨ. м•јмҠӨмҳӨлҠ” кё°к°Җ л§үнҳҖ н—ӣмӣғмқҢл§Ҳм ҖлҸ„ лӮҳмҳӨм§Җ м•Ҡм•ҳлӢӨ. к·ёлҹ¬лӮҳ к·ё кұ°м°Ҫн•ң вҖҳмӢңн‘ё лҸ„м ҒлӢЁвҖҷмқҖ м •л§җлЎң л§ҲмқҢм—җ мғҒмІҳлҘј мһ…мқҖ лӘЁм–‘мқҙм—ҲлӢӨ. вҖңмӣҗлһҳлқјл©ҙ к°Җ진 кІғл§Ң ләҸкі ліҙлӮҙл Өкі н–ҲлҠ”лҚ°, мҳӨлҠҳмқҙ л„ӨлҶҲ м ңмӮҝлӮ мқёмӨ„ м•Ңм•„лқј.вҖқ В м Җл“Өмқҳ л’ӨмӘҪм—җм„ң к¶ҒмҲҳл“Өмқҙ нҷңмқ„ мӨҖ비н•ҳлҠ” кІғмқҙ ліҙмҳҖлӢӨ. к·ёлһҳлҸ„ лҸ„м ҒлӢЁ мЈјм ңм—җ м ңлІ• к·ңлӘЁк°Җ к°–м¶°мЎҢлӮҳліҙкө°. В м•јмҠӨмҳӨлҠ” мІңмІңнһҲ лӘёмқ„ н’Җл©° н—ҲлҰ¬м¶Өмқҳ кІҖ집мқ„ кәјлӮҙл“Өм—ҲлӢӨ. м–ҙм°Ён”ј мЈҪмқј мғқк°ҒмқҖ м—Ҷм—Ҳкё°м—җ м•јмҠӨмҳӨлҠ” кІҖ집 мұ„лЎң лҸ„м Ғл“Өмқ„ кІЁлҲҙлӢӨ. мһ к№җ мһҘлӢЁм—җ л§һм¶°мЈјлҠ” кІғлҸ„, м Җл“Өм—җкІҢ мһҲм–ҙм„ң нӣ—лӮ нҒ¬лӮҳнҒ° көҗнӣҲмқҙ лҗҳкІ м§Җ. В мғҒлҢҖлҘј лҙҗк°Җл©ҙм„ң к°ңкё°лқјлҠ”, лӯҗ к·ёлҹ° көҗнӣҲ. В
EXP
121
(21%)
/ 2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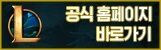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Rinum
Rin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