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6-19 21:00
мЎ°нҡҢ: 974
추мІң: 0
[л“ңлҰјл¬ј] м•”мӮҙмһҗмҷҖ нқЎнҳҲк·Җ - н”„лЎӨлЎңк·ёнҳ№мӢң лӘЁлҘҙмӢңлҠ” 분л“Ө кі„мӢӨк№Ң лҙҗ м Ғм–ҙмҡ”. л“ңлҰјл¬јмқҖ мӣҗмһ‘м—җ мһҗмӢ мқҙ л§Ңл“Өм–ҙлӮё мәҗлҰӯн„°, мҰү мһҗмәҗк°Җ л“Өм–ҙк°„ нҢ¬н”Ҫмқҙм—җмҡ”. мқҙлҹ° кұ° мӢ«м–ҙн•ҳмӢңлҠ” 분л“ӨмқҖ л’ӨлЎңк°Җкё° лҲҢлҹ¬мЈјм„ёмҡ”.
л¶ҖмЎұн•ҳм§Җл§Ң мһҳ лҙҗмЈјм„ёмҡ”. (л“ңлҰј NL мЈјмқҳ) --- *н”„лЎӨлЎңк·ё* "мҳӨлҠҳмқҖ лҶ’мңјмӢ 분л“Өкіј нҡҢмқҳк°Җ мһҲм–ҙмҡ”." лӮҳлҠ” мқҢмӢқмқҙ лӢҙкёҙ к·ёлҰҮмқ„ мӢқнғҒм—җ лҶ“кі м•үмңјл©° л§җн–ҲлӢӨ. "к·ёлһҳ? м°ём„қн•ҳм§Җ л§Ҳ." нғҲлЎ мқҖ лӮҙк°Җ м°Ёл Ө лҶ“мқҖ м•„м№Ёмқ„ лЁ№кё° мӢңмһ‘н•ҳл©° лҢҖкҫён–ҲлӢӨ. лӘ…л №мқҙ м•„лӢҢ м ңм•Ҳмқҙм—ҲлӢӨ. м „м—җлҸ„ нғҲлЎ л•Ңл¬ём—җ лӮҙк°Җ мқҙлҹ°м Җлҹ° н•‘кі„лҘј лҢҖл©° м°ём„қн•ҳм§Җ м•Ҡм•ҳм—Ҳкі , нғҲлЎ мқҖ лҢҖлҶ“кі л¬ҙмӢңн•ҙ лӘЁмһ„ мһҘмҶҢм—җ лӮҳнғҖлӮҳм§Җ м•Ҡм•ҳм—ҲлӢӨ. к·ёкІҢ лҜём•Ҳн–ҲлҠ”м§Җ м ңм•Ҳн•ҳлҠ” нҲ¬лЎң л§җн•ң кІғ к°ҷм•ҳлӢӨ. "лӘҮ лІҲмқҙлӮҳ м°ём„қмқ„ кұ°л¶Җн•ҳлҠ” кұҙлҚ°вҖҰ н•ң лІҲмқҙлқјлҸ„ лӮҳк°Җ лҙҗм•јмЈ . кІҢлӢӨк°Җ л“ң мҝ нҶ мһҘкө°лӢҳлҸ„ лӮҳмҳӨмӢӯлӢҲлӢӨ." лӮҳлҠ” м• мҚЁ нҡҢмң н•ҳл Ө л§җн•ҙліҙм•ҳлӢӨ. "м•Ңкі мһҲм–ҙ." лӯҗ, нғҲлЎ мқҖ к·ёмқҳ м§ҒмҶҚмқҙлӢҲ лӢ№м—°нһҲ м•Ңкі мһҲм—ҲкІ м§Җ. "к·ёлһҳлҸ„вҖҰ" "мӨ‘мҡ”н•ң мқјмқҖ лӮҙк°Җ к°Җм„ң ліҙкі л°ӣмңјлӢҲ кіөм Ғмқё мһҗлҰ¬м—җ лӮҳк°Ҳ н•„мҡ” м—ҶлӢЁ л§җмқҙм•ј." "лӢӨлҘё 분л“ӨмқҖ м•ҲлөҲл Өкі мҡ”?" "мӢ«лӢӨлӢҲк№Ң. л…№м„ңмҠӨлҠ” л…№м„ңмҠӨкі мһҘкө°лӢҳмқҖ мһҘкө°лӢҳмқҙм•ј." мҷ„м „нһҲ мқҙн•ҙн•ҳм§Җ лӘ»н•ҳлҠ” кІғмқҖ м•„лӢҲм—ҲлӢӨ. мһҗмӢ мқ„ лІ„лҰ° л…№м„ңмҠӨм—җкІҢ м ҒлҢҖмӢ¬мқ„ к°–лҠ” кІғмқҖ лӢ№м—°н•ң мқјмқём§ҖлҸ„ лӘЁлҘёлӢӨ. кІҢлӢӨк°Җ к¶Ңл Ҙмқ„ мһЎмқҖ мӮ¬лһҢл“ӨмқҖ нқ”нһҲ к·ёкІғмқ„ лӮЁмҡ©н•ҳкі , мӢӨл Ҙ м—ҶлҠ” мһҗл“Өм—җкІҢ м„ёмҠөн•ҙ к¶Ңл Ҙмқ„ м•Ҫнҷ”мӢңнӮӨлӢҲ к·ёл“Өкіј кҙҖкі„лҘј л§әлҠ” кІғмқҙ мӢ«мқ„ кІғмқҙлӢҲ л§җмқҙлӢӨ. "кёёл“ңмһҘмқҙлӮҳ к·ёлҹ° мӮ¬лһҢл“Өл§Ң лӮҳмҳӨлҠ” кІҢ м•„лӢҲм—җмҡ”. л“ң мҝ нҶ мһҘкө°лӢҳмІҳлҹј м •лӢ№н•ң мӢӨл ҘмңјлЎң мһҗлҰ¬м—җ мҳӨлҘё мӮ¬лһҢл“ӨлҸ„ лӮҳмҳЁлӢӨлӢҲк№Ңмҡ”." "л§җл§Ң к·ёл Үм§Җ." "нғҲлЎ вҖҰ" лӮҳлҸ„ лӘЁлҘҙкІҢ к·ёмқҳ мқҙлҰ„мқҙ мһ…м—җм„ң лӮҳмҷҖлІ„л ёлӢӨ. мҷң к·ёлһ¬лҠ”м§Җ лӘ°лһҗлӢӨ. л§җн•ңлӢӨкі лӢ¬лқјм§ҖлҠ” кІғмқҖ м—ҶлӢӨкі мғқк°Ғн–ҲлӢӨ. лӮҳлҠ” мҳҲмқҳ м°Ёмӣҗм• м„ң к·ёлҘј м„Өл“қмӢңнӮӨл Ө н•ҳлҠ” кІғмқҙм§Җ, лӮҳм—җкІҢ нҒ° мқҙмқөмқҙ лҗҳкұ°лӮҳ мўӢмқҖ мқјмқ„ л°”лқјм„ң н•ҳлҠ” кІғмқҙ м•„лӢҲм—ҲлӢӨ. кІҢлӢӨк°Җ мҡ°лҰ¬лҠ” м„ңлЎңлҘј мқҙлҰ„мңјлЎң л¶ҖлҘҙлҠ” мқјмқҖ л“ңл¬јм—ҲлӢӨ. л¶Ҳлҹ¬лҸ„ лӮҳлҠ” к·ёмқҳ мһ…м—җм„ң лӮҙ ліёлӘ…мқ„ м»Өл…• к°ҖлӘ…мқ„ мӮ¬мҡ©н•ң мқјлҸ„ л§Өмҡ° л“ңл¬јм—ҲлҚҳ кІғмңјлЎң кё°м–өн–ҲлӢӨ. лӮҙк°Җ к·ёлҘј л¶ҖлҘј л•ҢлҠ” 'м—җмқҙлҚҳ м”Ё' м•„лӢҲл©ҙ 'нғҲлЎ м”Ё'мІҳлҹј кјӯ нҳём№ӯм–ҙлҘј л¶ҷм—¬м„ң л¶Ҳл ҖлӢӨ. лӮҳмҷҖ лӮҳмқҙк°Җ к°ҷкі лӘҮл…„ лҸҷм•Ҳ к°ҷмқҙ м§ҖлғҲлҠ”лҚ°лҸ„ л¶Ҳкө¬н•ҳкі к·ёл ҮкІҢ мӮ¬мҡ©н–ҲлӢӨ. мҠөкҙҖмқё л“Ҝн–ҲлӢӨ. н•ҳм§Җл§Ң м§ҖкёҲмқҖ лӯҗмҳҖмқ„к№Ң. к·ёлҠ” мӣҖм§Ғмһ„мқ„ л©Ҳм·„лӢӨ. лӮҳлҠ” мҠӨмҠӨлЎңм—җкІҢ, к·ёлҰ¬кі к·ёмқҳ лҸҷкІ°м—җ лӢ№нҷ©н•ҙ к·ёлҘј міҗлӢӨліҙм•ҳлӢӨ. к·ёмҷҖ лҲҲмқҙ л§ҲмЈјміӨлӢӨ. к·ё мҲңк°„мқҙ м§ҖлӮҳк°ҖлІ„л ёлӢӨ. кҝҲмқҙм—ҲлҚҳ кІғмІҳлҹј, нғҲлЎ мқҖ мӢңм„ мқ„ мҳ®кё°кі м•„л¬ҙ мқј м—Ҷм—ҲлӢӨлҠ” л“Ҝмқҙ мҲҹк°ҖлқҪмқ„ мһ…м—җ к°Җм ёк°”лӢӨ. мҡ°лҰ¬лҠ” л¬өл¬өнһҲ мӢқмӮ¬лҘј л§Ҳм Җ лҒқлғҲлӢӨ. *** "лӢӨл…ҖмҳӨкІ мҠөлӢҲлӢӨ." мұ„비лҘј н•ң нӣ„м—җ лӮҳлҠ” л¬ё к°ҷм§Җ м•ҠмқҖ м •л¬ёмқ„ м—ҙкі мўҒмқҖ нҶөлЎң м•ҲмңјлЎң лӣ°м–ҙл“Өм—ҲлӢӨ. мҡ•мӢ¬ л§ҺмқҖ кёёл“ңмһҘл“Өм—җкІҢ л“ӨнӮӨм§Җ м•Ҡмңјл Өл©ҙ мһҳ мҲЁкІЁм§„ кіім—җ мӮҙм•„м•ј н–ҲлӢӨ. к·ёлһҳм„ң мқҙлҹ° м¶ңмһ…мқҳ л¶ҲнҺёмқ„ к°җмҲҳн•ҙм•ј н–ҲлӢӨ. "м–ҙмқҙ." лӮҳм§Җл§үнһҲ л“Өл ёлӢӨ. мһ‘м•ҳм§Җл§Ң 분лӘ… нғҲлЎ мқҳ лӘ©мҶҢлҰ¬мҳҖлӢӨ. лӮҳлҠ” кі к°ңлҘј лҸҢл Өм„ң лӢӨмӢң л°©мқ„ міҗлӢӨліҙм•ҳлӢӨ. нғҲлЎ мқҳ мҳҶлӘЁмҠөмқҙ ліҙмҳҖлӢӨ. л¶Ҳмқҙ м–ҙл‘җмӣҢ м–јкөҙ н‘ңм •мқҙ мһҳ ліҙмқҙм§Җ м•Ҡм•ҳлӢӨ. "вҖҰвҖҰ" "вҖҰвҖҰ?" л§җмқ„ н•ҳм§Җ м•Ҡмһҗ лӮҳлҠ” лӢӨмӢң лҸҢм•„м„ң к°Җл Ө н–ҲлӢӨ. мІ м»Ҙ мҶҢлҰ¬мҷҖ н•Ёк»ҳ лӢ«нһҲлҠ” л¬ё. к·ё м§Ғм „м—җ к·ёмқҳ лӘ©мҶҢлҰ¬к°Җ л“Өл Өмҷ”лӢӨ. "мЎ°мӢ¬н•ҙлқј."
EXP
313
(13%)
/ 4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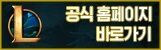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м№ҳмҪ”м°Ў
м№ҳмҪ”м°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