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0-16 20:31
조회: 1,240
추천: 9
잭스X소나 팬픽-가로등과 별 36화(수정)*** 그 시각, 소나는 잠들지도 깨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꿈과 현실의 옅은 경계에서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소나는 달리고 있었다. 공포, 오직 공포라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터질 것처럼 메우고 있었다. 정신없이 뛰는 그녀의 뒤로는 불길한 어둠이 독사처럼 뒤를 쫓고 있었다. [어머, 소나야!] [라, 라라, 라라…….] [아가씨, 이 목걸이는 어떠세요?] [오, 정말 아름다운 연주로군. 훌륭해.] [네가 말만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수많은 소리의 파편들이 그녀의 곁을 스쳐 사라졌다. 모두 다 소나의 안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었다. 좋은 소리로 이뤄진 기억도, 나쁜 소리로 이뤄진 기억도 있었다. 그것들은 전부 그녀를 이루고 있는 소리 그 자체였다. 그런 소리들이 그녀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훌륭한 연주자 여러 명이 한자리에서 각자 다른 곡을 힘차게 연주하는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그녀를 뒤를 쫓는 저 어둠에 비하면 그딴 건 아무래도 좋은 문제였다. 굶주린 사냥개처럼 그녀의 뒤를 쫓고 있는 어둠은 금방이라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챌 것처럼 지척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소리들이 어둠에 먹혀 스러져갔다. 도대체 이 어둠이 어디서 온 건지, 소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악몽 속에서의 그녀도 현실 속에서의 그녀도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저 어둠에 삼켜지고 싶지 않았다. 소리야말로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는 얼마 안 되는 옅은 실이었다. 그것이 끊어진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빌었다. 빌고 또 빌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나, 누구라도…….’ 소나의 간절한 바람이 닿은 것일까, 저 멀리서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소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불꽃이었다. 새파랗게 타오르는, 불길한 색의 푸른 불꽃. 하지만 소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뒤를 쫓는 어둠보다 더 무서운 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오를 정도로 한계까지 달린 소나는 그 불꽃 앞에서 무너지듯 쓰러졌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뒤를 쫓던 어둠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덮치려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불꽃은 그녀의 편인 모양이었다. 화악! 불꽃은 마치 소나를 감싸듯 타오르더니 어둠을 내쫓아버렸다. 어둠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 사라졌다. 소나는 안도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불꽃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날름거리는 불꽃 속에 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마저 들 지경이었다. 좀 거칠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려 깊은 누군가처럼……. 누군가? 소나는 고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누구라니? 왜 이 불꽃을 보고 누구라는 느낌을 떠올린 걸까? 뭔가 익숙한데, 정말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감정이 들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향한 감정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기억이 날듯 말듯 그녀의 애를 태웠다. 소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자신을 감싼 불꽃의 벽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세계가 변했다. ‘어……?’ 문자 그대로 눈 한 번 깜빡일 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바뀌었다. 그녀를 뒤쫓던 어둠도, 그녀를 둘러싸던 불꽃도 없었다. 보이는 거라곤 끝없이 펼쳐진 황야와 그 황야의 색을 닮은 죽어버린 하늘뿐이었다. 발밑으로는 거칠고 단단한 땅의 감촉이 느껴졌고, 뺨을 때리는 바람 사이에는 무언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나의 표정이 대번에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이 냄새를 알고 있었다. 피냄새였다. 전쟁터의 악취였다. …멀리서, 아련하게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묘비처럼 꽂힌 병장기와 타고 눌어붙은 갑옷이 을씨년스럽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타다 남은 재처럼 그것들에게 생기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것뿐이었다. 이 드넓은 황야에 있는 것이라곤 그것 뿐, 살아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조그마한 벌레나 풀 한 포기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다. 소나는 자신을 끌어안았다. 지독한 공허감이 그녀의 가슴에 커다랗게 구멍을 내고 있었다. ‘추워…….’ 소나는 자신을 꽉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온도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추웠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다.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세계를 소나는 견딜 수 없었다. 아니, 이런 세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만약 이런 메마르고 황량한 마음을 지닌 자가 있다면, 그자는 대체 어느 정도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멀리서 쇠가 부딪히던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 그것은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이자, 비명이었다. 그 소리는 어느 한 곳에서 들려오지 않고 이 세계 전체에서 들려왔다. 소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황야는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황야는 어느새 전쟁의 한복판처럼 수많은 병사들로 가득 차있었다. 소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가 떨어져나가고 헤진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체에 가까웠다. 그렇게 사자(死者)의 군세는 누군가를 향해 끊어지는 듯한 절규를 내뿜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더러운 놈! 목숨을 돈으로 사고 파는 천박한 용병 같으니!] [왜 나를 죽인 거야? 대체 왜?] 그들의 외침에는 온갖 감정이 서려 있었다. 분노, 고통, 좌절.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절하게 들려오는 감정은 슬픔이었다. 소나는 그 감정의 파도로 휩쓸려버렸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소나의 두 눈에 금방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감정에 젖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그 외침을 시작으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슬픔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살의와 분노가 불길한 북소리처럼 둥둥거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느새 외치기만 하던 병사들의 손에는 그들의 모습만큼이나 처참한 상태의 병장기가 들려 있었다. 소나는 깜짝 놀라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림자를 손으로 움켜쥐려고 한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들이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건지, 누구를 죽이려 하는 건지 소나는 몰랐다. 다만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콰과과과광! 끔찍한 폭발음이 천지를 가득 메웠다. 소나는 귀를 막고 한참이나 몸을 떨어야만 했다. 청각이 예민한 그녀에게 갑자기 나는 큰 소리는 거의 고문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것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망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에 황야는 불타고 있었다. 새파랗게. 푸른 불꽃으로 타오르는 황야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그 불꽃은 전혀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차가웠다. 분명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어둠으로부터 구해줬던 불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렇기에 소나는 불꽃 속에 있으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몸을 끌어안아야만 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다. 타오르는 건 비단 황야뿐만이 아니었다. 이 세계 전체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전부 푸른 불꽃에 휩쓸려 잿더미로 변해있었다. 아니 이미 세계는 황야가 아니었다. 시체 같은 병사들도, 드문드문 묘비처럼 꽂혀 있던 병장기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이라곤 새파랗게 타오르는 불과 잿더미가 된 세계뿐이었다. 그 속에 누군가가 석상처럼 서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슬픔과 연민으로 차올랐다. 이번엔 타인의 감정 따위가 아닌 그녀의 감정이었다. 두근. 소나는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사방에 가득찬 불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근, 두근. 그는 뒤돌아있었다. 소나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설렘 따위의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감정 때문이었다. 불안감과 공포. 그것이 소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었다. 왠지 그가 뒤돌아보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낡아빠진 보라색 여행용 망토에 감싸인 커다란 등이 보였다.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그는 몸을 돌렸다. 깊게 눌러 쓴 두건 아래로 강판 같은 가면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가면 사이로 희미하게 푸른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 쪽을 보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꺼져가는 잿불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가면과 불꽃에 가려 그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는 너무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소나는 그의 가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얼굴이 보일 리 없었다. 그러나 가면 사이로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때 가면 사이로 보일 리 없는 그의 눈동자가 보였다. 시선을 허공에서 얽혀, 소나는 가면과 불꽃 뒤에 가려진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봤다. 다음 순간, 소나는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다. 아니,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 황야보다도, 타다 남은 잿더미보다도, 훨씬, 훨씬 더 마모되어 새까맣게 죽어있었으니까. ------------------------------------------------------------- 잡담 0. 다른 사이트에는 공지했지만, 쨌든 37 38까지 쓴 전개가 들지 않아 밀었습니다. 1. 근데 36화가 그 연결고리 역할이라...이러저러해서 36화를 둘로 나눠서 이것도 밀었습니다. 2. 아마...40화 이전까진 마무리 될겁니다. 지금 뿌려놓은 떡밥들. 3. 이번엔 소나의 턴입니다. 4.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EXP
224,156
(56%)
/ 235,001
롤 팬픽 게시판에서 잭스X소나 팬픽 가로등과 별 연재중에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사랑입니다. 레드 빨고 천국갑시다.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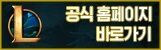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강철안개
강철안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