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07 03:49
조회: 680
추천: 0
바루스올빼미 문신이 욱신거린다. 이 문신을 새기던 그날, 나는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위해 사냥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고된 몸을 이끌고 귀가한 나를 반겼던건 굳은 표정의 아내와 마을의 연로한 장로님이셨다. 녹차냄새가 집 안 가득했고, 나는 그 모습이 내가 보는 마지막 가족의 모습이라는걸 직감했다. "아, 왔군." 먼저 입을 뗀건 장로님이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마도 뱃속에 있을 아이를 보는것이리라. 나는, 사냥감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이 싸늘한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쩐일이시죠?" "길게 말하지 않겠네. 오늘 아침, 탈라스 구덩이의 수호자가 임무에서 이탈했네. 우리에게 적임자가 필요해. " 탈라스 구덩이. 그곳엔 저주받은 무엇인가가 잠들어있다는 얘기를, 이 마을 사람이라면 어릴때부터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란다. 한가지 분명한건 이 마을 최고의 전사가 그곳의 수호자가 되어, 평생을 그곳에서 임무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탈이라니요, 수호자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닐세." 장로님의 얼굴이 내 사냥감처럼 굳어버렸다. "말 그대로, 이탈했네. 지금 아이오니아의 추적자들이 그를 찾는중이야." "찾게되면 돌아오십니까?저는 잠시 자리를 지켜놓을 뿐이지요?" 장로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아내와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금방이라도 쓰러질듯한 그 몸을 일으켜 세워 나의 손을 붙잡고는 귓속말을 속삭였다. "그 구덩이의 비밀이 녹서스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되네. 예기치못한 상황이니 가족들과 함께 신전 근처에 터전을 잡도록 허가해주지." "...왜 하필 접니까?마을엔 더 훌륭한 전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수호자의 임무는 신전을 수호하는것이 아니야. 접근도 못하게 하는걸세. 자네의 사냥감이 자네를 발견하고 죽은적이 있었나?"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을 위해 나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성한 임무도 달게 받아들여야 했다. 젖도 떼지 못 한 갓난 아이와, 아버지를 대신하기엔 아직 어린 아들, 그리고 내 심장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싶은 아내를 저 언덕 아래 아름다운 마을에 두고 왔다. 아니, 아름다웠던 마을이었다. 지금 그 자리엔 모든걸 태울듯한 거대한 화염과, 가족을 이루겠다 맹세하던 달빛을 가려벼린 연기만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차마 신전을 떠날 수 없었다. 이곳에 자리한 간험한 기운을 등으로 느낄 수 있기에, 더 넓은 뜻을 위해 끝까지 지켜야 했다. 허나 그 대가로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그들의 학살을 지켜봐야했다. 멀리 언덕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화약과 금속의 마찰음들. 녹서스의 깃발...그들이 마을을 파괴했다. 내 가족까지도. "멍청한 수호자가 자리를 아직도 지키고있구나!" 녹서스의 언어가 아니었다. 친숙한 우리 마을의 말이었다. 나는 재빠르게 활을 들어 올린다. 소리가 들린곳...바람...분노가 손끝까지 뻗쳐서 제대로 겨눌 수가 없다. 다시, 다시 지껄여봐라 그때는... "그곳에서 나는 진실을 보았다! 그분을 해방시키고 그 힘을...힘을 손에 넣어야 한다!"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화살이 날아간다. 짧은 신음과 함께 풀숲에서 사람이 걸어나온다. 화살이 팔에 꽂힌 모양이다. 모습을 보였으니 죽음 뿐이다. "너무 늦었다...! 이 마을은 나를 평생 신전의 개로 삼았지. 더 큰 힘과 손을 잡았다! 더는 참을수 가 없..." 배신자. 배신자! 전대 수호자임이 틀림없다. 죽기 직전까지 떠들어대는 이 입버릇이 그걸 증명했고, 마을의 비밀을 밀고했음을 실토했다. 이제, 녹서스의 군대가 이쪽으로 올것이다. 준비를 해야한다. 모두...모두 죽일것이다. 화살은 부족하지 않았다. 피로 붉어진 흙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본다. 생생히 기억나는 추억들과 삶, 시간마다 불이 붙어있고, 파괴되어있다. 곧 우리 가족의 집이 나타난다. 내가 미친것이 아니라면 이 무너져내린 벽돌더미가 우리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흉측하게 변한 폐허 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못난 남편과 아버지를 두어 원망스러웠을까, 지켜주지 못한것이 너무나 통탄스럽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차가운 팬던트가 느껴진다. "내 아들들아...여보....!"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매캐한 연기 뿐이다. 주변을 둘러봐도 인적 하나 없이 녹서스의 깃발만이 펄럭이고 있었다. 녹서스. 그들이 우리의 땅을 짓밟았다. 내 모든것을 앗아갔다. 그들을 파멸시킬것이다...배신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그곳에 힘이 있다고...신전으로 가서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리라. 횃불을 챙겨야겠다. 신전의 안으로는 처음 들어와본다. 흙먼지 쌓인 대리석 위로 피묻은 장화발자국이 남는다. 횃불이 비추는곳마다 전혀 본적없는 문자가 새겨져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소용돌이치는 보라색 기운이 구덩이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그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분노...네 안에서 분노가 느껴진다...얼마만에 느껴보는 살아 숨쉬는 감정인가..." 뚜렷이 누군가가 말을 하기 보다, 머릿속으로 직접 속삭이는 느낌이었다. 그때 구덩이 속에서 꿈틀대는 보라색 물체들이 솟아올랐다. 내 손을 향해 빠르게 다가온다. 재빠르게 손을 빼보지만, 너무 늦었다. 물체들은 금새 기괴하게 빛을 내는 활처럼 내 손에 자리를 잡았다. "아, 모든것을 잃었구나. 나에게 너의 기억과, 감정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 좋구나...내가 너의 복수를 완성해줄테니, 남아있는 모든것을 버려라. 너의 존재까지도..." 벌레가 내 머릿속을 기어다니는 느낌이다. 저항해야하지만, 더 강력한 힘이 나를 짓누른다. 문신이 욱신거린다. 복수, 녹서스를 파멸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한다. 잠에 든다... "이제는 바루스로 살아가라. 내가 너의 복수를 이루어 주겠다." 나는 누구였는가...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바루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이따금씩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차가운 팬던트가 그것을 덮을만큼 낯선 느낌을 준다. "죄 지은 자, 고통받을지어다. "
EXP
91,762
(95%)
/ 92,001
|
인벤 공식 앱
댓글 알람 기능 장착! 최신 게임뉴스를 한 눈에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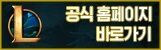
 김티읕
김티읕